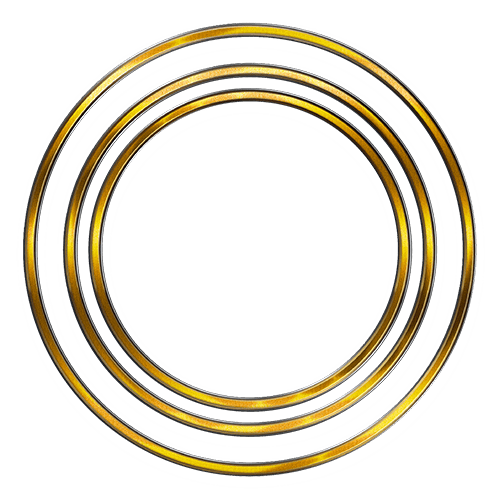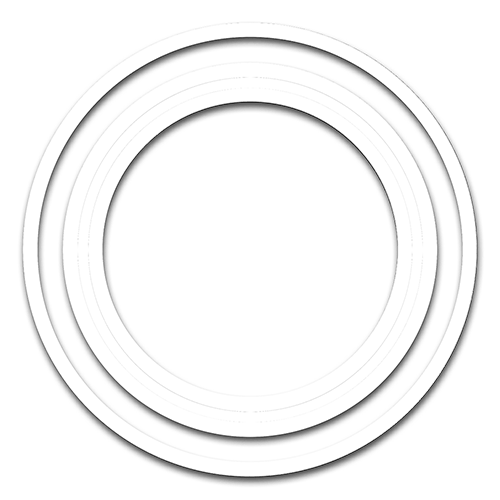팔레 드 도쿄Palais de Tokyo
2002년 팔레 드 도쿄가 개관했을 당시 방문객들은 이 전시장이 그즈음 유럽에서 새로 개장한 동시대 미술 전시장과 너무 달라 충격을 받았다. 총 475만 유로의 예산이 1937년 세계 박람회 당시 일본관이었던 이 건물을 “동시대 미술 창작을 위한 장소”로 전환시키기 위해 투여되었지만, 이 돈의 대부분은 기존 구조를 개조하기보다는 보강하는 데 쓰였다.[note title=”1″back] 팔레 드 도쿄의 홍보 웹사이트, “site de création contemporaine,” 〈http://www.palaisdetokyo.com〉[/note] 내부 인테리어는 깨끗한 흰색 벽이나 신중하게 설치된 조명, 바닥으로 장식되는 대신 손대지 않은 채 그대로 남겨졌다. 이것은 그 전시장의 큐레이팅 기조가 담긴 중요한 결정이었는데, 전시장 총괄은 큐레이터이자 미술비평가인 제롬 상스Jerome Sans와 보르도 현대미술관(CAPC)의 전임 큐레이터였으며 잡지 《도퀴망 쉬르 라르Documents sur l’art》의 편집자인 니콜라 부리요Nicolas Bourriaud가 공동으로 맡았다. 팔레 드 도쿄에서 선보인 이 같은 주변 환경과의 즉흥적 관계방식은 이후 유럽의 미술 전시장들에서 눈에 쉽게 띄게 된 경향, 곧 동시대 미술 디스플레이를 ‘화이트 큐브’ 모델이 아닌 작업실이나 ‘실험실’ 모델에 맞춰 재개념화하려는 경향의 패러다임이 되었다.[note title=”2″back] 사례를 들어 설명해 보기로 하자. 니콜라 부리요는 팔레 드 도쿄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는 일종의 학제 간 미술협회(kunstverein) 같은 것이 되었으면 했다. 미술관보다는 실험실 말이다” (“Public Relations: Bennett Simpson Talks with Nicolas Bourriaud,” Artforum [April 2001], 48에서 재인용). 한스 울리히 오브리스트(Hans Ulrich Obrist)는 “진정으로 동시대적인 전시는 연결 가능성을 표현해야 하며, 명제를 제시해야 한다. 그리고 놀랍겠지만 그런 전시는 20세기 전시 실천에 있었던 실험실 시대와 다시 연결되어야 한다. (…) 종결 없음 그리고 불완전함이라는 놀라운 특질을 지닌 진정한 동시대 전시는 전체를 대표하는 부분으로서의 참여를 목표로 삼을 것이다”라고 했다 (Obrist, “Battery, Kraftwerk and Laboratory,” in Words of Wisdom: A Curator’s Vade Mecum on Contemporary Art, ed. Carin Kuoni [New York: Independent Curators International, 2001], 129).; 바바라 반 데어 린덴(Barbara van der Linden)과 한스 울리히 오브리스트의 〈레보라토리움 Laboratorium〉(Antwerp, 2000) 프로젝트에 대해 논의하는 TV 심포지엄에서, 큐레이터는 이들이 ‘실험실’이라는 용어를 채택하는 이유에 대해 그 용어가 ‘중립적’이고 “과학의 손길이 닿지 않았거나 아직 닿지 않은”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Laboratorium is the answer, what is the question?,” TRANS 8 [2000], 114). 실험실 비유는 또한 미술가들 자신의 전시 구상들로부터 생겨났다. 예를 들면 리암 길릭(Liam Gillick)은 브리스톨의 아르놀피니에서 열린 자신의 개인전에 대해 이야기 하면서, 그것은 “실험실이나 워크숍 상황과 같다. 거기에는 몇몇 아이디어의 결합을 시험해 보거나 관계적이며 비교를 통한 비판 과정을 시행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언급한다.(Liam Gillick: Renovation Filter: Recent Past and Near Future [Bristol: Arnolfini, 2000], 16에서 인용됨) 리크리트 티라바니자의 작업은 자주 유사한 용어들로 묘사된다. 그것은 “인간들 사이의 접촉을 위한 실험실과 같다”(Jerry Saltz, “Resident Alien,” The Village Voice, July 7–14, 1999, n.p.) 혹은 “상황이 만남, 교환 등을 위해 설정된 사회 심리적 실험”(마리아 린드Maria Lind, “Letter and Event,” Paletten 223 [April 1995], 41). ‘실험실’은 이 맥락에서 관객에 대한 심리학적 혹은 행동과학적 실험을 의미 한다기보다는 전시관습에 대한 창의적 실험과정을 지시한다.[/note] 따라서 팔레 드 도쿄는 루이스 카추어Lewis Kachur가 역사적 아방가르드의 ‘이념적ideological 전시’라고 부른 전통 속에 놓이게 된다. 이 이념적 전시(예컨대, 1920년 “국제 다다 페어International Dada Fair”나 1938년 “국제 초현실주의 전시International Surrealist Exhibition” 같은)들에서 전시물들은 작품에 담긴 아이디어들을 집약하거나 강화할 수 있게끔 설치된다.[note title=”3″back] Lewis Kachur, Displaying the Marvelous: Marcel Duchamp, Salvador Dali and the Surrealist Exhibition (Cambridge, Mass.: MIT Press, 2001).[/note]
마리아 린드, 한스 울리히 오브리스트, 바바라 반 데어 린덴, 후 안루Hou Hanru, 니콜라 부리요같이 이 ‘실험실’ 패러다임을 옹호하는 큐레이터들은 대체로, 1990년대에 생겨난 미술 유형, 완성된 오브제보다는 ‘진행형 작업’인 것처럼 보이면서 끝이 열린open-ended, 상호작용적인, 종결을 거부하는 작업에 고무되어 그에 대한 직접 대응으로서 이러한 큐레이팅 작업방식을 채택했다. 이런 유형의 작업은 포스트구조주의에 대한 창조적인 오독을 통해 파생되어 나온 것으로 보인다. 즉 포스트구조주의의 명제를 예술작품의 해석이 지속적인 재평가에 대해 열려있다고 읽은 것이 아니라 예술작품 자체가 영구히 끊임없는 변화 속에 있다는 주장으로 잘못 읽어낸 것이다. 이런 생각은 많은 문제를 야기하는데, 특히 작품을 식별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그것이다. 작품의 정체가 고의적으로 불분명해져 버렸기 때문이다. 또 다른 문제는 ‘실험실’이 쉽사리 레저와 오락을 위한 시장 친화적 공간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점이다. 게이트헤드에 있는 발틱Baltic이나 뮌헨의 쿤스트페어라인Kunstverein 그리고 팔레 드 도쿄 같은 전시장들은 관료주의에 찌든 컬렉션-기반의 미술관들과 자신들을 구별하기 위해 ‘실험실’, ‘건설 현장construction site’ 그리고 ‘아트 팩토리’ 같은 은유를 사용해 왔다. 이런 프로젝트 전용 공간들은 창조의 소음과 동시대 생산의 전위에 있다는 아우라를 창출한다는 것이다.[note title=”4″back] 수네 노르드그렌(Sune Nordgren)이 책임을 맡고 있던 게이트헤드의 발틱은 미술가들에게 스튜디오를 제공하는 ‘에어(AIR)’ (미술가 레지던스 Artist-in-Residence) 공간을 세 개나 갖고 있었다. 하지만 이 공간들은 단지 레지던스 작가의 선택에 따라서만 대중에게 공개된다. 관객들은 ‘미술 공장’이 되겠다는 발틱의 주장을 종종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야만 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팔레 드 도쿄에는 어떤 시점에서든 열 명 정도의 미술가가 거주하고 있다. 마리아 린드가 디렉터로 있는 뮌헨의 쿤스트페어라인은 다른 유형의 시각적 성과를 추구했다. 여기서 아폴로니아 수스터직(Apolonia Sustersic)은 갤러리 입구를 개조했는데, 특징은 ‘작업 제어반’이다. 이곳에서 (린드를 포함한) 큐레이팅을 위한 스텝들은 공개적으로 자신들의 작업을 계속하면서, 교대로 돌아가며 갤러리 프런트 데스크의 일을 본다.[/note] 이런 맥락에서 프로젝트 기반의 진행형 작업과 레지던스 입주 작가는 ‘경험 경제’와 딱 들어맞는다는 주장도 가능하다. 경험 경제란 상품과 서비스를 맞춤 각본와 연출로 만들어낸 개인별 경험으로 대체하려는 마케팅 전략이다.[note title=”5″back] B. Joseph Pine II and James H. Gilmore, The Experience Economy: Work Is Theatre and Every Business a Stage (Boston: Harvard Business School Press, 1999). 발틱은 스스로를 “작업의뢰, 미술가 초청, 미술가 거주프로그램에 집중”함으로써 “동시대 미술의 생산, 재현, 경험하는 장소”라고 제시한다 (www.balticmill.com).[/note] 그러나 관람객들이 본질적으로 제도화된 스튜디오 활동인 이 같은 창조성의 ‘경험’으로부터 무엇을 얻어낼 것인지를 예측하는 일은 명확지 않은 경우가 많다.
동시대 작가들을 초빙해서 미술관 내의 편의시설을 디자인하게 하거나 개선하게 하는 추세도 프로젝트 기반의 ‘실험실’ 경향과 관계가 있다. 미술관 안에 바를 만들게 하거나(호르헤 파르도Jorge Pardo가 뒤셀도르프의 K21에서, 마이클 린Michael Lin이 팔레 드 도쿄에서, 리암 길릭이 화이트채플 갤러리에서 그랬듯이), 독서 라운지를 만들게 하거나(아폴로니아 수스터직이 뮌헨의 쿤스트페어라인에서 또는 팔레 드 도쿄에서 변화하는 ‘살롱’ 프로그램이 그랬듯이) 한 후에 이런 편의 시설을 예술작품으로 제시하는 것이 그것이다.[note title=”6″back] “6개월마다 팔레 드 도쿄는 중심 계단실 아래 위치하지만 전시공간의 핵심 장소인 조그만 공간 살롱Le Salon을 장식하거나 디자인하도록, 한 작가를 초청한다. 휴식 공간이자 예술작품 공간인 살롱은 방문객들에게 편안한 의자, 게임, 읽을거리, 피아노, 비디오, 혹은 TV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Palais de Tokyo Website [http://www.palaisdetokyo.com], 저자의 번역). 프랑크푸르트에 있는 포르티쿠스 갤러리는 특별히 작가 토비아스 레버거(Tobias Rehberger)가 디자인한 사무실, 독서방, 갤러리 공간을 포함하고 있다.[/note] 이 추세는 디자이너로서의 작가, 관조보다 기능, 미적 완결보다 끝이 열린 작업 같은 아이디어들을 지속적으로 조장하는데, 그 한 효과가 결국은 큐레이터의 지위 향상인 때가 많다. 실험실에서 진행되는 경험 전반을 연출하고 관리함으로써 인정받는 것이 큐레이터이기 때문이다. 핼 포스터Hal Foster는 이미 1990년대 중반 이 점에 대해 경고했던 바 있다. “다른 경우라면 조명을 받았을 작품에 제도가 그림자를 드리울 수 있다. 제도가 스펙터클이 되고, 제도가 문화자본을 수집하며, 큐레이터이자 디렉터가 스타가 된다.”[note title=”7″back] Hal Foster, “The Artist as Ethnographer,” in Foster, The Return of the Real (Cambridge, Mass.: MIT Press, 1996), 198.[/note] 내가 ‘끝이 열리고’ 기능을 가진 미술작업을 옹호하는 몇몇 주장들을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기 위한 출발점으로 팔레 드 도쿄에 초점을 맞춘 것은 이 같은 상황을 염두에 두기 때문이다. 게다가 팔레 드 도쿄의 공동 디렉터 중 한 사람인 니콜라 부리요가 바로 그들의 지도적인 이론가 아닌가?
관계미학
관계미학은 1997년 출간된 부리요의 에세이 모음집 제목이다. 이 책에서 그는 1990년대 미술실천의 특성을 확인하려 한다. 1990년대 미술을 개괄하려는 시도들이 거의 없었고 특히 영국의 경우 논의가 근시안적으로 YBA 현상 주변을 헤매는 데 그쳤기 때문에, 부리요의 책은 동시대 미술의 최근 경향을 확인하는 최초의 중요한 시도라고 할 수 있다. 그 책은 또한, 영국과 미국의 많은 학자들이 1980년대 미술(실제로는 많은 경우 1960년대 미술)의 정치적 의제나 지적 전투로부터 한 걸음 더 나아가기는 꺼려하면서, 설치미술에서부터 반어적인 회화까지 모든 미술을 탈정치화된 표면의 찬양 내지는 소비 스펙터클과의 결탁이라고 비난하고 있던 시점에 출간되었다. 이 책은 부리요가 큐레이터로 활동하며 몸소 얻은 통찰에 입각해 쓰인 것으로, 동시대 미술비평의 의제를 재규정할 것을 약속한다. 그의 출발점은 더 이상 이 작업들을 60년대 미술사나 그 가치들이 피난해 있는 ‘대피소’ 뒤에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부리요는 이런 작업들도 60년대의 선행 작업들보다 결코 덜 정치적이지 않다고 주장하는 한편, 종종 불분명하기 그지없는 이들 작품에 접근할 수 있는 새로운 기준을 제공하려 한다.[note title=”8″back] “동시대 미술은 관계 영역을 하나의 논점으로 바꿔 놓는 식으로 그 영역으로 이동하려 한다는 점에서 확실하게 정치적 프로젝트를 발전시키고 있다” (Bourriaud, Relational Aesthetics [Dijon: Les Presses du Réel, 2002], 17). 이후 RA로 축약하여 표시함.[/note]
예를 들어 부리요는 1990년대 미술이 “독립적이며 사적인 상징적 공간에 대한 권리 주장보다 인간의 상호작용 영역과 그 영역의 사회적 맥락”(RA, 14)을 이론적 지평으로 선택했다고 주장한다. 달리 말하면 관계미술 작업은, 의미가 사사화된 개인적인 소비 공간에서보다는 집단 속에서 구체화되는(RA, 18) 상호주관적 만남(이런 만남이 말 그대로 만남이건 아니면 잠재적 만남이건 간에)을 수립하려 한다. 이것이 내포하는 바는 90년대 미술이 그린버그식 모더니즘의 목표와 정반대 방향을 취했다는 것이다.[note title=”9″back] “’사적인 것’으로부터 ‘공공적인 것’으로의 이 같은 접근방식의 변화는 얼마 동안 모더니즘과의 결정적인 단절과 결부되었다. 다음을 보라. Rosalind Krauss, “Sense and Sensibility,” Artforum (November 1973), 43–53과 “Double Negative: A New Syntax for Sculpture,” in Passages in Modern Sculpture (London: Thames and Hudson, 1977).[/note] 관계미술은, 자신의 문맥을 초월하는 별개의 이동 가능한 자율적 예술작품이라기보다는, 전적으로 자신의 주위 환경과 관객의 우발성에 신세를 지는 것이다. 게다가 이 관객은 일종의 공동체로서 그려진다. 다시 말해 관계미술은 미술작업과 관람객 사이의 일대일 관계보다 상황을 조성하며, 이 상황 속에서 관람객은 단지 하나의 집단적인 사회적 실체로 간주되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일시적이고 유토피아적일지라도 하나의 공동체를 창출할 수 있는 수단을 실제로 갖게 된다.
그러나 부리요가 관계미학을 단순히 상호작용 미술에 대한 이론으로 간주하지 않았다는 점은 강조할 필요가 있다. 그는 관계미학을 동시대 실천을 문화 일반 안에 위치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했다. 그는 관계미술을 상품경제로부터 서비스경제로의 이행에 대한 직접 대응으로 본다.[note title=”10″back] 이는 작업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를 취하는 몇몇 작가들에서 드러난다. 예를 들면 베를린 거주 미국 작가 크리스틴 힐은 전시장 방문객들에게 등과 어깨를 마사지해 주었다. 그는 나중에 베를린과 10회 도큐멘타(1997)에 완전히 제대로 기능하는 헌옷 가게 폴크스부티크Volksboutique를 열었다.[/note] 관계미술은 또한 인터넷과 글로벌화가 촉발한 가상적 관계에 대한 대응으로 간주되기도 한다. 가상의 관계는 한편으로는 사람들 사이에서 좀 더 신체적인 면대면 상호작용을 희구하는 욕망을 촉발시켰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작가들에게 DIY 접근법을 채택해서 스스로 만들 수 있는 ‘가능한 우주’를 모델화하도록 영감을 불어넣기도 했다는 것이다(RA, 13). 이 같은 직접성에 대한 강조는 60년대 이래 우리에게 친숙하다. 그것은 퍼포먼스 미술이 우리가 예술가의 신체와 직접 대면할 때 감지하는 진짜라는 느낌을 연상케 한다. 그러나 부리요는 동시대 작업을 이전 세대 작업들로부터 떼어내려 애쓴다. 그에 따르면 가장 주된 차이는 사회 변화를 대하는 태도가 전환된 것이다. 오늘날의 미술가는 ‘유토피아적’인 의제를 제기하는 대신 단지 지금 이곳에서 필요한 임시적인 해결책을 발견하려 하며, 그들의 환경을 변화시키려고 노력하는 대신, 단순히 “이 세계에서 더 낫게 사는 법을 배우려” 한다. 즉 이 미술은 미래의 유토피아를 학수고대하기보다는, 현재 속에서 ‘소우주microtopia’가 기능할 수 있도록 조성한다(RA, 13). 부리요는 이 같은 새로운 태도를 한 문장으로 생생하게 제시한다. “더 행복한 내일에 기대를 걸기보다는 현재 이웃과 더불어 가능한 관계를 창출해내는 것이 더 긴급한 일 아닐까?”(RA, 45). 부리요가 관계미학의 핵심적인 정치적 의미라고 생각하는 것은 바로 이 같은 DIY식 소우주의 풍조다.

부리요의 책에는 많은 미술가들의 이름이 등장한다. 그들 대부분은 유럽인이다. 그리고 그들 대부분은 1993년 보르도 현대미술관에서 열려 이후 큰 영향력을 행사했던 부리요의 전시 《트래픽Traffic》에 등장했었다. 몇몇 작가들은 거의 기계적인 규칙성이 느껴질 정도로 계속 등장한다. 리암 길릭, 리크리트 티라바니자Rirkrit Tiravanija, 필리페 파레노Phillippe Parreno, 피에르 위그Pierre Huyghe, 카스텐 횔러Carsten Holler, 크리스틴 힐Christine Hill, 바네사 비크로프트Vanessa Beecroft, 마우리치오 카텔란Maurizio Cattelan, 호르헤 파르도가 그들이다. 지난 10년간 번성했던 국제 비엔날레, 트리엔날레, 마니페스타를 관람해 본 사람들은 이들 모두에 대해 매우 친숙할 것이다. 이들 작가의 작업은 이들보다 더 잘 알려진 YBA 동기생들의 작업과 여러 면에서 다르다.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대중문화에 대한 참조물들을 활용하곤 하는 자족적이며 (그리고 형식적으로 보수적인) 영국인들의 작업과는 달리, 사진과 비디오, 벽에 써붙인 텍스트, 책, 용도가 있는 오브제, 전시 오프닝 이벤트 후 남은 물건들 등으로 이루어진 이 유럽인들의 작업은 외관상 별 볼일이 없다. 이 작업들은 구성방식으로 보면 기본적으로 설치 미술이지만, 아마도 실행자들은 이러한 용어를 그리 반기지 않을 것이다. 일관된 특징을 드러내는 (연극적 미장센을 추구하는 일리야 카바코브Ilya Kabakov의 ‘총체적 설치’와 같은 방식의) 공간의 변형을 시도하기보다 관계미술 작업들은 관조 아닌 사용use을 강조한다.[note title=”11″back] 예를 들어 조르게 프라도가 뮌스터 프로젝트에서 했던 〈조각을 위한 부두 Pier for Skulptur〉(1997)가 그렇다. 부두는 맨 끝에 파빌리온이 있는 캘리포니아산 삼나무로 만든 5미터 길이의 방파제다. 이 작업은 보트를 정박시키는 방파제로 기능한다. 또한 파빌리온의 벽에는 담배판매기가 부착되어 있는데, 이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곳에 서서 경치를 바라보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note] 그리고 뚜렷하게 구별되는 브랜드화된 개성을 가진 YBA 작가들과는 달리, 관계미술에서는 누가 특정 ‘관계’ 미술 작업을 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종종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그것은 여타 미술작업을 포함한 기존의 문화형태들을 활용하는 경향을 보이거나 DJ나 프로그래머가 그러하듯 그것들을 리믹스하기 때문이다.[note title=”12″back] 이 같은 전략을 부리요는 ‘포스트프로덕션’이라고 불렀다. 그리고 이는 『관계미학』 이후의 저술에서 상세히 연구된 바 있다. “90년대 초반 이래 날로 더 많은 미술 작업들이 기존의 작업들에 기반을 두고 창출되었다. 점점 더 많은 미술가들이 다른 사람들이 제작한 작품들이나 활용 가능한 문화적 물품들을 해석, 재생산, 재전시 혹은 사용한다. (…) 자신의 작업을 다른 사람의 작업에 삽입하는 이들 미술가들은 생산과 소비, 창조와 복사, 레디메이드와 원작 사이의 전통적인 구분을 소거해 버리는 데 기여한다. 그들이 다루는 재료는 더 이상 일차적인 중요성을 갖지 않는다.” 부리요는 포스트프로덕션이 저자성과 미술제도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레디메이드와는 다르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포스트프로덕션의 강조점은 기존의 문화적 물품들을 새로운 의미로 가득 채우기 위해 그것들을 재결합하는 것에 있기 때문이다. Bourriaud, Postproduction (New York: Lukas and Sternberg, 2002)을 보라.[/note] 게다가 부리요가 논하는 많은 작가들은 서로 협업을 시도해왔는가 하면, 더 나아가 개별 작가의 저자성의 흔적을 지우려 한다. 또한 몇몇 작가들은 서로 타인의 전시를 큐레이팅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길릭이 마리아 린드가 큐레이팅한 전시 《무엇인가 만일: 건축과 디자인 가장자리에 있는 미술What If: Art on the Verge of Architecture and Design》를 ‘필터링’한 것과 티라바니자가 2003년 베니스 비엔날레에서 한스 울리히 오브리히트 및 몰리 네스빗Molly Nesbit과 공동 큐레이터 자격으로 한 전시 《유토피아 스테이션Utopia Station》이 그것이다.[note title=”13″back] 이 같이 협업모델에 꽂히는 현상을 보여주는 최상의 사례는 피에르 위그와 필리페 파레노가 진행한 프로젝트 〈귀신 아니고 껍데기 No Ghost Just a Shell〉에서 발견할 수 있다. 이들은 리암 길릭과 도미닉 곤잘레스-포에스터(Dominique Gonzales-Foerster), 엠앤엠(M/M), 프랑소아 퀴르레(Francois Curlet), 리크리트 티라바니자, 피에르 조셉(Pierre Joseph), 조 스캘런(Joe Scanlan),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을 그들과 함께 지금은 사용되지 않는 일본 망가 캐릭터 안리(AnnLee)와 관련한 작업을 협업하기 위해 초청했다.[/note] 나는 이제부터 특히 티라바니자와 길릭, 두 작가의 작업에 초점을 맞춰 논의해보려 한다. 그 이유는 부리요가 이들 두 작가를 ‘관계미학’의 패러다임을 보여주는 작가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리크리트 티라바니자는 뉴욕에 기반을 둔 작가다. 그는 1961년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태국인 부모로부터 태어났다. 그리고 태국과 에티오피아, 캐나다에서 성장했다. 그는 혼성적인 설치 퍼포먼스로 유명한데, 통상 이들 퍼포먼스에서 그는 작업을 위해 그를 초청한 갤러리나 미술관에 온 사람들에게 야채 커리나 팟타이를 요리해 제공한다. 1992년 뉴욕 303 갤러리에서의 작업 〈무제(스틸) Untitled (still)〉에서 티라바니자는 갤러리 사무실과 창고에 있던 모든 것들을 끌어내어 주 전시장으로 옮겼다. 심지어 디렉터까지 끌어내서는 그에게 음식 냄새와 식사하는 사람들로 가득 찬 곳에서 사람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자기 일을 보도록 했다. 창고에서 그는 종이판과 플라스틱 포크와 나이프. 가스버너, 조리용 기구, 하나로 접어지는 테이블, 몇 개의 접이식 의자들을 가져와, 한 비평가가 ‘임시 피난민 부엌’이라는 이름을 붙인 부엌을 만들어 냈다.[note title=”14″back] Jerry Saltz, “A Short History of Rirkrit Tiravanija,” Art in America (February 1996), 106.[/note] 갤러리에서 그는 방문객들을 위해 커리를 조리했다. 작가가 거기에 없을 때는 폐기물, 조리 기구, 음식 저장용 통 등이 미술 전시가 되었다. 여러 비평가와 티라바니자 자신은 이 같은 관객의 관여가 이 작업의 주요 초점이며, 음식은 단지 관객과 미술가 간의 우호적 관계를 전개해 나가기 위한 수단일 뿐이라고 논평했다.[note title=”15″back] 이런 유형의 미술의 역사적인 선구자를 찾으려 한다면 그야말로 방대한 작가의 이름을 나열하는 것이 가능하다. 우선 마이클 애셔(Michael Asher)가 1974년 로스엔젤리스 클레어 코플리 갤러리에서 했던 무제 설치작업. 거기서 애셔는 전시공간과 갤러리 사무실 사이의 벽을 제거했다. 또는 1970년데 초반 동료 작가와 함께 오픈했던 고든 마타-클락(Gordon Matta-Clark)의 레스토랑 푸드(Food). 푸드는 미술가들이 미술시장의 이데올로기적인 타협의 요구에 굴복하지 않고 자신들의 미술 실천에 금전적으로 도움을 받고 간소하게나마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협업 프로젝트였다. 1960년대나 70년대 초반에 음식과 음료수의 소비를 미술로 제시했던 작가들로는 알렌 루퍼스버그(Allan Ruppersberg), 탐 마리오니(Tom Marioni), 다니엘 스포에리(Daniel Spoerri), 플럭서스 그룹(the Fluxus group)이 있다.[/note]
티라바니자의 작업 대부분에서 드러나는 것은 제도 공간과 사회 공간 사이의 구분이 아닌 미술가와 관람자 사이의 구분을 잠식하려는 욕망이다. 그의 재료목록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규칙적으로 ‘많은 사람들’이라는 구문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1990년대 후반에 티라바니자는 갈수록 더 관객이 스스로 자신의 작업을 산출할 수 있는 상황을 창출하는 데 작업의 초점을 맞추었다. 303 갤러리에서 했던 설치/퍼포먼스의 좀 더 정교한 판본이 1996년 쾰른의 쿤스트페어라인에서 실행된 〈무제 1996(내일은 또 다른 날)Untitled 1996 (Tomorrow Is Another Day)〉이다. 여기서 티라바니자는 뉴욕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를 나무로 재건축하고, 하루 24시간 동안 이 공간을 대중들에게 개방했다. 사람들은 음식을 만들기 위해 부엌을 사용할 수도 있고, 욕실에서 샤워를 할 수도 있으며, 침실에서 잠을 자거나, 거실에서 쉬거나 잡담을 나눌 수도 있다. 쿤스트페어라인 프로젝트 카탈로그는 몇몇 신문 기사나 전시 평을 인용하고 있는데, 이들 모두는 “이 같은 독특한 미술과 생활의 결합이 모든 사람들에게 더불어 함께하는 인상적인 경험을 제공했다”[note title=”16″back] Udo Kittelmann, “Preface,” in Rirkrit Tiravanija: Untitled, 1996 (Tomorrow Is Another Day) (Cologne: Salon Verlag and Kölnischer Kunstverein, 1996), n.p. 자넷 크레이낙(Janet Kraynak)이 언급했듯이 티라바니자의 작업은 근자에 들어 몇몇 그야말로 기쁨에 들뜬 이상화에 전념하는 미술비평을 낳았다. 그의 작업은 통제로부터 벗어난 해방의 장소일 뿐 아니라, 상품화에 대한 비판이자 문화적 동질감의 축복이라고 축하를 받았다─그리하여 이들 당위적인 것들은 궁극적으로 티라바니자의 인격이 상품으로서 제도적으로 포용되어 무너져 내리는 지점에까지 도달한다. Janet Kraynak, “Tiravanija’s Liability,” Documents 13 (Fall 1998), 26–40을 보라. 크레이낙의 견해 전체를 인용해 보는 것이 유용할 듯싶다. “티라바니자의 미술작업이 좀 더 확장된 동시대 미술 실천영역에 적합한 다수의 관심사들을 드러내고 주목게 한 것은 사실이지만, 대중의 상상 속에서 그것이 차지한 독특한 위상은 부분적으로는 그것이 동반했었던 그리고 구성해냈던 비판적 독해를 변질시켜 버린 것에서 비롯된다. 예술이 삶과 행복하게 통합되었던 이전 아방가르드 유토피아주의의 짝맞추기와 달리, 또한 그 안에서 미술 오브제가 사회적 공간이 되고 또 사회적 공간으로 구성되었던 반제도적 비판성과도 달리, 추정컨대 티라바니자의 작업에서 오염되지 않은 사회적 실천의 생산을 보증하는 것은 미술가라는 독특한 각인이다. 이 미술가의 후의가 설치물들을 활성화하는 가하면 그것들을 양식적으로 통합시킨다. 다수의 논문들이 그가 대변하는 갤러리의 가족적 분위기와 여타 그의 삶의 일대기 속 세부사항들에 초점을 맞춰왔다. 티라바니자의 작업과 작가 자신을 은밀하게 같은 것으로 취급하면서 말이다. 이같이 이상화를 동반하는 투사는, 작가가 자신의 설치작업에서 태국의 문화를 참조함으로써 그의 민족적 배경의 세부사항들을 주제화해왔던 바에 따라, 작품 자체로부터 유래하는 듯하다. 의미의 원천이자 결정자로서 다시 자리 잡은 작가가 그/그녀의 작업이 지닌 정치적 효율성과 진정성을 보장하는 가운데 그/그녀의 성적, 문화적 혹은 민족적 정체성의 순수한 구현체로서 받아들여지는 것이다” (28–29).[/note]는 큐레이터의 주장을 재삼재사 반복한다. 티라바니자의 작업 재료들은 점점 더 다양해졌지만, 강조점은 항상 관조가 아닌 사용이었다. 1996년 암스테르담의 데 아펠De Appel에서 진행된 프로젝트 〈파타이Pad Thai〉에서, 그는 방문자들이 악기들을 사용하여 자신들의 음악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전자 기타와 드럼세트를 갖춘 방을 제공했다. 〈파타이〉는 처음에는 앤디 워홀Andy Warhol의 〈잠Sleep〉(1963) 프로젝션을 포함하고 있었다. 이후 런던 하이드 파크의 스피커즈 코너에서 할 때에는 마르셀 브로타스Marcel Broodthaers가 만든 영화를 포함시켰다(여기서 작가는 칠판에 “당신들은 모두 예술가입니다”라고 쓴다). 글래스고우에서 진행된 프로젝트 〈시네마 리베르떼Cinema Liberte〉(1999)에서 티라바니자는 지역 관객에게 그들이 가장 좋아하는 영화를 순서대로 말해보라고 주문한 후, 글래스고우의 두 거리가 만나는 교차로에서 그것들을 상영했다. 자넷 크레이낙이 지적했듯 티라바니자의 탈물질화된 프로젝트들이 1960년대와 70년대의 비판전략을 되살려내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온갖 곳을 떠돌며 순회하는 티라바니자의 작업이 오늘날 지배적인 글로벌화 경제 모델의 맥락 안에서 이 논리에 대한 질문을 자기 성찰적으로 던지지 않고 단지 그것을 재생산할 뿐이라는 주장 또한 가능하다.[note title=”17″back] 위의 책, 39–40.[/note] 그는 국제 미술계에서 확고한 자리를 잡았고 영향력이 있으며 모든 곳에 출현하는 인물 중 하나이며, 그의 작업은 관계미학이 이론으로서 출현하는 데 그리고 ‘끝이 열린’, ‘실험실적인’ 전시를 기획하려는 큐레이터의 열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우: 〈수정/22번째 바닥 벽 디자인Revision/22nd Floor Wall Design〉, 1998, 런던의 작가와 코비-모라 사진 제공.
두 번째 사례는 1964년생 영국 작가 리암 길릭이다. 길릭의 작업은 학제적이다. 그야말로 강력하게 이론화된 길릭의 관심은 조각, 설치, 그래픽 디자인, 미술비평, 소설에 산개되어 나타난다. 온갖 매체를 활용한 그의 작업 전체를 지배하는 주제는 우리의 환경을 통한 (특히 사회적) 관계의 생산이다. 그의 초기 작업은 조각과 기능적 디자인 사이의 공간을 탐구했다. 사례로는 사용법에 대한 지시사항, 보드 위에 포함될 수 있는 잠재적 아이템, 몇몇 한정된 전문가 저널에 대한 가입 추천이 포함된 〈핀보드 프로젝트Pinboard Project〉(1992)가 있다. 또한 〈에라스무스 테이블 원형 #2Prototype Erasmus Table #2〉(1994)가 있다. 이 테이블은 “거의 방 하나를 꽉 채울 정도의 크기”를 가지고 있으며, “『에라스무스는 늦는다Erasmus is late』(길릭이 1995년 출간함)는 책 작업을 끝낼 것으로 예상되는 작업 장소”로 고안된 것이다. 그러나 이 테이블은 또한 다른 사람들이 “그 위나 옆이나 주위에다 작품을 보관하거나 전시할 경우” 활용할 수도 있다.[note title=”18″back] Gillick, Liam Gillick, ed. Susanne Gaensheimer and Nicolaus Schafhausen (Cologne: Oktagon, 2000), 36에서 인용.[/note]

1990년대 중반 이래 길릭은 알루미늄과 채색 플렉시글라스를 재료로 만든 스크린 그리고 천장에서 늘여 뜨려진 단으로 구성된 3차원 디자인 작업으로 유명해졌다. 이 작업은 종종 벽에 직접 작업한 텍스트나 기하학적 디자인을 따라서 배치된다. 이들 작업에 대한 길릭의 설명은 주의 깊게 이들 작업에 어떤 특정 기능을 부여하는 것은 거부하면서도 그것들의 잠재적 사용가치를 강조한다. 즉 각 오브제의 의미가 퍽이나 중층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그것은 마치 모더니스트 디자인의 주장이나 경영컨설팅의 언어를 패러디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의 〈토론방: 투사된 씽크 탱크Discussion Island: Projected Think Tank〉(1997)는 120x120cm 크기의 지붕이 열린 큐브인데, 이 작업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이 작업은 교환, 정보이동, 전략을 고려하기 위해 만들어진 폐쇄 영역을 의미하는 오브제로 활용될 수 있다.” 반면 3x2m 크기의 채색 플렉시글라스 스크린인 〈거대 컨퍼런스 센터 입법 스크린Big Conference Centre Legislation Screen〉(1998)은 “개인 행위가 공동체 전체에 의해 강제되는 규칙들에 의해 제한되는 장소를 정의하는 데 도움을 준다.[note title=”19″back] 위의 책, 56, 81.[/note]
길릭의 디자인 구조물은 “사무실 공간이나 버스정류소, 미팅룸, 매점 같은 것들과 공간적 유사성”을 갖는 구축물이라고 묘사된다. 그러나 그것들은 동시에 미니멀리스트 조각이나 포스트-미니멀리스트 설치미술(도널드 저드Donald Judd나 댄 그래험Dan Graham이 곧장 떠오른다)의 유산을 취한 것이다.[note title=”20″back] Mike Dawson, “Liam Gillick,” Flux (August–September 2002), 63.[/note] 그러나 길릭의 작업은 자신의 미술사 선배들의 작업과 다르다. 저드의 모듈식 상자들이 관람자에게 작품 주위를 서성이는 그/그녀의 신체 움직임을 알아채도록 하면서 또한 그 상자들이 전시된 공간에도 주의를 기울이게 했다면, 길릭은 관람자들이 “그냥 작품을 등지고 서서 수다를 떠는 것”[note title=”21″back] Gillick, Renovation Filter, 16.[/note]에 만족한다. 길릭은 브루스 노만(Bruce Nauman)의 회랑이나 그래험의 1970년대 비디오에서처럼 관객이 작품을 ‘완성시키는 것’보다는, 끝이 영원히 열려 있고 자신의 예술이 활동 배경이 되는 작업을 추구한다. “그것이 꼭 숙고의 대상으로서 최상의 기능을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그는 말한다. “그것은 때때로 순수한 어떤 내용을 제공하는 것이기보다 배경이나 장식이 되곤 한다.”[note title=”22″back] Gillick, The Wood Way (London: Whitechapel, 2002), 84.[/note] 길릭의 작품 제목들은 밋밋한 경영 관련 전문용어를 반어적으로 사용한다는 점에서 70년대식의 직접적인 비판과는 거리를 두려는 이 같은 움직임을 반영한다. 토론방Discussion Island, 도착 장치Arrival Rig, 대화 플랫폼Dialogue Platform, 통제스크린Regulation Screen, 지연스크린Delay Screen, 쌍방재협상플랫폼Twinned Renegotiation Platform[note title=”23″back] 이들 작업 모두는 2002년 화이트채플 갤러리에서의 전시 《나무가 우거진 길The Wood Way》에서 보여졌다.[/note]들이 그것이다. 기업을 암시하는 이런 제목들은 길릭의 작업과 그래험의 작업 사이의 거리를 분명하게 보여준다. 그래험은 중립적인 것처럼 보이는 건축 재료(유리, 거울, 강철)가 국가와 기업에 의해 어떻게 정치적 통제의 용도로 활용되는가를 드러내는 작업을 했다. 길릭의 경우 과제는 그러한 제도에 대해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제도들을 개선할 수 있는 길을 협상하는 것이다.[note title=”24″back] 그러나 길릭의 사례에서 ‘낫게 한다는 것’이 단지 형식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변화를 함축할 뿐이라는 점은 논쟁의 여지가 있다. 1997년 그는 뮌헨 은행을 위해 작품을 만들도록 초청받았는데, 그는 그 프로젝트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나는 건물에서 문제가 많은 데드존(dead zone)─건축가의 실수─을 발견했다. 나는 이 스크린들로 그 문제를 해결할 것을 제안했다. 이들은 공간의 작동방식을 미묘하게 바꿔줄 것이다. 그러나 흥미롭게도 나의 제안이 건축가로 하여금 건물의 그 부분에 대해 재고하도록 만들었다… 건축가는 어떤 미술이 개입할 필요도 없이 그들의 디자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결론에 도달할 수 있었다” (Gillick, Renovation Filter, 21). 한 평론가는 이 같은 작업 양태를, 제안된 변화가 일차적으로 구조적인 것이라기보다 화장술적이라는 점에 주목하여, ‘기업 풍수(風水)’라고 묵살해버렸다(Max Andrews, “Liam Gillick,” Contemporary 32, 73). 길릭은 우리 환경의 외관이 우리의 행위를 조건 짓고 따라서 둘은 분리될 수 없다고 대답했을 것이다.[/note] 그는 ‘시나리오’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한다. 그리고 이런 연유로 그의 모든 작업성과는 “시나리오 사고”라는 아이디어에 의해 지배된다. 여기서 시나리오 사고란 세계 속에서 변화를 구상하는 방법이다. 하지만 그것은 기존 질서에 대해 분명한 목표를 가진 비판이 아니라 “어떤 식으로든 비판적인 접근이 얼마나 가능한지를 탐색하는 것”[note title=”25″back] Liam Gillick, “A Guide to Video Conferencing Systems and the Role of the Building Worker in Relation to the Contemporary Art Exhibition (Backstage),” in Gillick, Five or Six (New York: Lukas and Sternberg, 2000), 9. 길릭이 언급했듯이 시나리오 사고는 비록 그것이 “내적으로 자본주의와 그것과 함께하는 전략화에 연계되어 있을지라도” 변화를 제안하는 도구다. 그 까닭은 그 사고가 “이동성의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핵심 구성요소 중 하나이자 소위 말하는 자유 시장 경제가 지니는 역동적인 분위기를 제공하기 위해 요구하는 재발명이기 때문이다” (Gillick, “Prevision: Should the Future Help the Past?,” Five or Six, 27).[/note]이다. 따라서 길릭의 글은 현재의 실제보다 가능성과 지연으로 가득 차있어 황당할 정도로 종잡기 힘든데도, 그가 슈투트가르트의 포르쉐 자동차로부터 교통시스템 같은 실무적인 프로젝트의 개선을 부탁받거나 브뤼셀의 주택개발 프로젝트에서 단지 내 방송을 디자인하는 일에 초청을 받아왔다는 점은 특기할 만하다. 길릭은 이런 유형의 작업과 관습적인 ‘화이트 큐브’ 전시 사이에서 아무런 갈등도 느끼지 않는 그가 속한 세대의 전형적인 작가다. 그에게는 이 양쪽 작업 모두가 가설적인 미래 ‘시나리오들’에 대한 자신의 탐구를 지속하는 방법들일 뿐이다.[note title=”26″back] Gillick in Renovation Filter, 16. 알렉스 파쿼하슨(Alex Farquharson)이 언급했듯이, “여기에 적용할 수 있는 어구는 ‘아마도 가능할 것’이라는 문장이다. 티라바니자는 방문객이 그의 태국 국수를 먹을 것이라는 점을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반면, 리암의 관객이 그의 재평가를 종결시킬지는 분명치 않다. 실제 행위 대신에 관람객들에게는 가상적인 역할, 곤잘레스-포에스터 그리고 파레노와 공유하는 접근방식이 제공된다” (Alex Farquharson, “Curator and Artist,” Art Monthly 270 [October 2003], 14).[/note] 길릭은 특정한 결과물을 낳기보다는 타인들도 기여할 수 있는, 끝이 열린 대안들을 작동시키는 데 열정을 쏟는다. 중간지대, 타협, 이것이 그의 최우선 관심사다.
내가 길릭과 티라바니자를 선택해서 논의했던 까닭은 나로서는 이들이 부리요의 주장 곧 관계미술은 분리된 순수시각성opticality보다 상호주관적인 관계에 특권을 부여한다는 주장을 가장 명확히 표현하고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티라바니자는 관람객이 특정한 시간 특정한 상황에 물리적으로 현전한다고 주장한다. 작가가 요리한 음식을 먹으면서 다른 방문객들과 함께 공동의 상황 속에 있게 된다는 것이다. 길릭은 많은 경우 심지어 실제로는 존재할 필요도 없는 좀 더 가설적인 관계를 암시한다. 그러나 그는 계속해서 관객의 현전이 자신의 예술에서 결정적인 구성요소라고 주장한다. “나의 작업은 냉장고 안의 전등과 같다”고 그는 말한다. “그것은 단지 사람들이 냉장고 문을 열 때만 작동한다. 사람들이 없다면 그것은 예술이 아니다. 그 경우 그것은 무언가 다른 것, 방에 있는 물건일 뿐이다”라고 말한다. 이처럼 대상 자체가 아닌 ‘무엇들 사이의 관계’가 갖는 우발성에 대한 관심이 길릭의 작업과 그가 협업적인 실천 전반에 대해 갖고 있는 관심의 보증수표다.
예술작품을 잠재적인 참여의 촉발제로 간주하는 이 같은 아이디어는 결코 새로운 것은 아니다. 해프닝, 플럭서스의 지침, 70년대 퍼포먼스 미술, 요셉 보이스의 “모든 사람이 예술가다”라는 선언을 생각해 보라. 이들 각각은 부리요가 관계미학을 변호하는 수사와 매우 비슷하게 민주주의, 해방과 관련한 수사를 동반하곤 한다.[note title=”27″back] 보이스는 관계미학에서 그렇게 자주 언급되지 않는다. 다만 한 경우에, 특히 ‘사회적 조각’과 관계미학 사이의 어떤 연결도 잘라버리기 위해 특별히 언급된다(30).[/note] 관람객을 능동화하려는 이 같은 열망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하는 사례는 얼마든지 있다. 발터 벤야민Walter Benjamin의 「생산자로서의 작가」(1934), 롤랑 바르트Roland Barthes의 「작가의 죽음」과 「독자의 탄생」(1968) 그리고 이 맥락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움베르토 에코Umberto Eco의 『열린 책』(1962) 같은 것들이 그것이다. 에코는 자신이 모더니즘 문학, 음악, 미술에서 우연적이며 열린 특성이라고 감지한 것들과 관련해 쓴 글에서 제임스 조이스James Joyce와 루치아노 베리오Luciano Berio, 알렉산더 칼더Alexander Calder에 대한 자신의 논의를 다음과 같이 요약하는데, 그 관점은 부리요의 낙관론을 떠올릴 수밖에 없도록 한다.
‘움직이는 작업’의 시학(어느 정도는 ‘열린’ 작업의 시학)은 예술가와 관객 사이의 새로운 순환관계, 새로운 미적 지각의 기제, 동시대 사회에서 예술적 산물이 지니는 달라진 위상을 활성화한다. 그것은 예술사의 새로운 장을 열뿐 아니라 사회학과 교육학에서 새로운 시작을 알린다. 그것은 새로운 소통 상황을 조직함으로써 새로운 실천적 문제들을 제기한다. 간단히 말해 그것은 예술작품을 관조하는 것과 활용하는 것 사이의 새로운 관계를 설정한다.[note title=”28″back] Umberto Eco, “The Poetics of the Open Work” (1962), in Eco, The Open Work (Boston: Harvard University Press, 1989), 22–23.[/note]
에코가 사용가치를 중시하고 ‘소통 상황’을 개발한 것에서 티라바니자 및 길릭과 유사한 점을 발견할 수 있음은 분명하다. 그러나 에코의 주장은 모든 예술작업이 잠재적으로 ‘열려 있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예술작품의 독해 가능성은 무한정일 수 있기 때문이다. 동시대 미술과 음악, 문학이 이뤄낸 성과는 단지 이 사실을 전면으로 부각시킨 것뿐이다.[note title=”29″back] 에코는 메를로-퐁티의 『지각현상학』을 인용한다. “어떤 사물이 그 종합이 결코 완료되지 않은 채 어떻게 우리에게 진정으로 스스로를 내보일 수 있을까? 내가 그것에 대해 갖고 있는 지각이나 견해 중 그 아무것도 그것을 소진시킬 수 없고 그 지평이 영원히 열려있거늘, 내가 어떻게 자기 자신의 존재를 작동시키는 개인에 대해 갖고 있듯 세계에 대한 경험을 얻어낼 수 있을까? (…) 이 같은 모호성은 존재의 본성이나 의식의 본성 속에서 불완전함을 재현하지 않는다. 그것이 바로 그것의 정의다”(Eco, “The Poetics of the Open Work,” 17).[/note] 부리요는 이러한 주장들을 특정 유형의 작업(말 그대로 상호작용을 요구하는 작업)에 적용함으로써 잘못 해석했다. 그리고 이로 인해 이 주장의 방향을 수용 관련 논점보다 예술가의 의도 쪽으로 되돌아가게 만들었다.[note title=”30″back] 이 같은 접근방식은 작품의 의미가 그것의 의미가 열려있다는 사실과 동의어가 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끝이 열린’ 독해가능성을 배제해버린다고 할 수 있다.[/note] 또 다른 주요 지점에서 그의 입장은 에코의 입장과 다르다. 에코는 예술작품을 파편화된 현대문화 속에 위치한 우리의 실존 조건에 대한 성찰이라고 보았다. 반면 부리요는 예술작품이 이 같은 조건을 산출한다고 본다. 관계미술의 상호작용은 따라서 수동적이며 비관여적이라고 추정되는 오브제에 대한 순수한 시각적 관조보다 우월하다. 그 이유는 예술작품이 긍정적인 인간관계를 산출할 수 있는 ‘사회 형태’이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작품은 자동적으로 정치적 함의를 지니며, 해방적 효과를 갖는다.
미적 판단
알튀세르Althusser가 1969년에 쓴 에세이 「이데올로기와 이데올로기 국가기구」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은 인간관계를 산출하는 사회 형태에 대한 이 같은 기술이 그리 낯설지는 않을 것이다. 부리요가 관계미학을 방어하는 논리는 문화─‘이데올로기 국가기구’로서의─가 사회를 반영하지 않고 생산한다는 알튀세르의 생각에 힘입은 바 크다. 1970년대 페미니스트 미술가들과 영화비평가들은 알튀세르의 이 에세이로부터 예술에서 좀 더 섬세한 정치표현을 시도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얻어냈다. 루시 리파드Lucy Lippard가 언급했듯이, 1960년대 후반의 많은 예술이 민주적인 헌신과 봉사의 열망에 고무되었던 것은 내용이 아닌 형태에서였다. 다시 말해 알튀세르의 에세이가 지닌 통찰은 제도를 피해가면서 그것을 비판하려는 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는 인식을 드러내 보여주었다.[note title=”31″back] 나는 여기서 미술시장을 만족시키거나 그것과 결탁하기를 거부함으로써 자신의 정치성을 표현하던 수많은 개념미술, 비디오, 퍼포먼스, 설치, 장소-특정적 미술을 염두에 두고 있다. 그러나 그것들은 내용 차원에서는 자기-참조적인 채로 남아있었다. Lucy Lippard, Six Years: The Dematerialization of the Art Object 1966–1972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6), vii–xxii을 볼 것.[/note] 예술작품의 의미가 그것을 구성하는 틀(이것이 미술관이든 잡지든)에 종속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는 충분치 않았다. 관람자 편에서 일어나는 이미지와의 동일시 또한 마찬가지로 중요하다고 간주되었다. 로잘린 도이치Rosalyn Deutsche는 그녀의 책 『축출: 미술과 공간정치Evictions: Art and Spatial Politics』(1996)에서 한스 하케Hans Haacke를 신디 셔먼Cindy Sherman이나 바바라 쿠르거Barbara Kruger, 세리 레빈Sherrie Levine 같은 그 이후 세대의 미술가들과 비교하면서 이 같은 전환을 명쾌하게 요약한 바 있다. 그녀는 한스 하케의 작업이 “관람자들을 이미지에 이미 각인된 내용을 발견하거나 관계를 해독하게끔 초대했지만, 이 이미지들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관람자들 자신이 수행하는 역할과 투자에 대해 살펴보라고 요청하지는 않았다.[note title=”32″back] Rosalyn Deutsche, Evictions: Art and Spatial Politics (Cambridge, Mass.: MIT Press, 1996), 295–96.[/note] 대조적으로 이후 세대의 미술가들은 “이미지 자체를 사회적 관계로 취급했고, 관람자를 오브제에 의해 구성된 주체로, 예전에는 관람자와 분리되어 있다고 주장되었던 바로 그 오브제에 의해 구성된 주체로 간주했다.”[note title=”33″back] 위의 책, 296.[/note]
나는 나중에 도이치가 제기한 자기 확인의 문제로 되돌아갈 것이다. 그 전에 알아둘 필요가 있는 사실은, 이미지를 사회적 관계로 간주하는 입장과 부리요의 주장, 즉 예술작품의 구조가 사회적 관계를 생산한다는 주장이 한 발짝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는 것이다. 하지만 관계미술작품의 구조가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작품의 끝이 열려 있다는 바로 그 주장 때문이다.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는 것은 관계미술 작품이 처음부터 말 그대로 관객의 현전을 요청하는 형태 곧 설치미술로부터 유래한 것이라는 점 때문이다. ‘퍼블릭 비전Public Vision’ 세대의 미술가들이 문제없이 자신들의 성과─대부분 사진 작업─를 정통 미술사에 포섭시키는 데 성공했던 반면, 설치미술은 자주 또 다른 포스트모던 스펙터클 형태의 하나 정도로 폄하되어왔다. 몇몇 비평가들 특히 로잘린드 크라우스(Rosalind Krauss)에게 설치미술의 다양한 매체 활용은 매체-특정적 전통으로부터 스스로를 분리해 내려는 것처럼 보였다. 다시 말해 설치미술은 그에 비추어 자기 성찰을 실행할 내적 관습 같은 것을 갖고 있지 않고, 우리가 그것의 성공과 실패를 평할 때 지침으로 삼을 기준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설치미술의 매체가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 없이는, 설치미술 작품은 자기 성찰적 비판성이라는 성배를 획득할 수 없다.[note title=”34″back] Rosalind Krauss, A Voyage on the North Sea (London: Thames and Hudson, 1999), 56. 다른 곳에서 크라우스는 1960년대 후반 이래 미술 실천이 ‘특정적’이 된 것은 마르셀 브로타스의 작업에서 가장 잘 확인할 수 있듯 어떤 미적 매체보다는 ‘개념적이자 동시에 건축적인 장소’에 대해서라고 제시한 바 있다 (Krauss, “Performing Art,” London Review of Books, November 12, 1998, 18). 나는 자기-성찰적 비판성이라는 지점과 관련하여 일정 정도 크라우스에 동의하면서도, 동시대 설치미술을 성공적으로 작동시키고 있는 여타 방식들에 대해 그녀가 지지를 표하지 않으려 하는 점과 관련해서는 불편함을 느낀다.[/note] 나는 다른 곳에서 관람자의 현전이 설치미술의 매체를 상상해볼 수 있는 하나의 방식 아닐까 제안했던 적이 있다. 그러나 부리요는 이 같은 주장을 복잡하게 만들었다.[note title=”35″back] 곧 나올 예정인 나의 책 Installation Art and the Viewer (London: Tate Publishing, 2005)의 결론 부분을 보라.[/note] 그는 끝이 열린 참여미술 작업을 평가하기 위해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기준은 미적인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것이며, 심지어 윤리적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즉 우리가 판단해야 하는 것은 관계미술 작품에 의해 산출된 ‘관계’라는 것이다.
부리요는, 관계미술 작업과 대면했을 때, 다음과 같은 질문을 제기할 것을 제안한다. “이 작업은 나로 하여금 대화로 진입하게 만드는가? 나는 그 작업이 규정하는 공간 속에서 존재할 수 있는가, 있다면 어떻게 가능한가?”(RA, 109). 그는 이 질문들을 어떤 미적 산물과 대면해서도 제기해야 할 ‘공존의 기준criteria of co-existence’(RA, 109)이라고 언급한다. 어떤 작품과 대면해서든지 이론적으로 우리는 그 작업이 어떤 종류의 사회적 모델을 생산하는지를 물어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나는 몬드리안의 회화를 구성하는 원리들에 따라 구축된 세계 속에서 살 수 있을까? 혹은 어떤 ‘사회 형태’가 초현실주의 오브제에 의해 산출되는가? 라고 질문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부리요의 ‘구조’ 개념이 야기하는 문제는 그것이 작업의 표면상의 주제, 혹은 내용과 불규칙한 관계를 맺는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우리는 초현실주의 오브제가 철 지난 물품들을 재활용한 점을 높게 평가해야 하나 아니면 그들의 이미지 그리고 불안을 야기하는 병치효과가 그들을 만들어낸 제작자의 무의식적인 불안과 욕망을 탐사한 지점을 높이 평가해야 하나? 이들 질문은, 맥락 내지 관람자의 실제 관여에 심하게 의존하는 관계미학의 혼성적인 설치/퍼포먼스와 관련해서는, 훨씬 더 답변이 어려워진다. 예를 들어 티라바니자가 음식을 조리할 때, 부리요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누구를 위해 요리하는가가 중요한가 아니면 그가 그 음식들을 공짜로 제공한 것이 중요한가? 길릭의 게시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질문이 가능하다. 부리요는 게시판에 핀으로 고정된 개별 쪽지들의 텍스트나 이미지들에 대해 논의하지 않는다. 또한 이 쪽지 조각들의 형식적 배열에 대해서도 논의하지 않는다. 단지 재료의 민주화나 구성방식의 유연성에 대해서만 이야기한다. (소유자는 자유롭게 이 다양한 요소들을 어떤 때건 개인적 취향과 당시 사건들에 따라 변형할 수 있다.) 부리요에게는 구조가 주제다. 그리고 이 점에서 그는 스스로 인정하는 것보다 훨씬 더 형식주의자다.[note title=”36″back] 이 점은 부리요가 그의 작업을 관계미학의 결정적인 선구적 작업으로 간주했던 펠릭스 곤잘레스-토레스(Felix Gonzales-Torres)에 대한 부리요의 논의에서 드러난다. 1996년 그가 에이즈로 죽기 전 곤잘레스-토레스는 관람객들이 마음대로 사용하도록 한 사탕 더미나 종이 더미를 활용하여 미니멀리스트 조각을 정서적으로 재작업한 작품으로 인정을 받았다. 이 같은 작업을 통해 곤잘레스-토레스는 에이즈 위기(사탕 더미의 무게는 1991년 사망한 그의 파트너 로스 Ross의 체중에 맞춰졌다), 도시폭동(〈무제 [전미총기협회NRA]〉 [1991]에서 다룬 권총 관련 법), 동성애(〈완벽한 연인들 Perfect Lovers〉 [1991]) 같은 정치적 함의를 지닌 논점들에 대한 미묘한 암시를 제공했다. 그러나 부리요는 자신의 ‘구조’─말 그대로의 관람객에 대한 후의─를 선호하여 곤잘레스-토레스의 작업의 이러한 측면들을 무시했다.[/note] 관계미술 작업들은, 예술가의 의도나 그것들이 작동하는 확장된 맥락에 대한 고려 양쪽 모두로부터 분리되어, 길릭의 핀보드처럼 단지 “일상의 이종성에 대한 끊임없이 변하는 초상”이 된다. 그리고 작업들이 이 초상과 맺는 관계는 탐색되지 않는다.[note title=”37″back] Eric Troncy, “London Calling,” Flash Art (Summer 1992), 89.[/note] 달리 말하면 관계미술 작업들은 맥락을 따른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도 작업들이 그 맥락과 내부적으로 겹쳐지는 대목에 대해서는 질문하지 않는다. 길릭의 핀보드는 구조적으로 민주적인 것으로 포용된다. 하지만 단지 그것을 소유한 사람들만 이 같은 배열들과 상호작용할 수 있다. 우리로서는 그룹 머티리얼Group Material이 1980년대에 제기했던 질문을 물을 수밖에 없다. “누가 공중인가? 문화는 어떻게 만들어지며, 누구를 위한 것인가?”
나는 관계미술 작업들이, 예를 들어 핀보드 작업을 국제 테러리즘에 관해 언급하게 하거나 혹은 난민들에게 커리를 무료 급식하는 식으로, 더 큰 사회적 양심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나는 단지, 관계미술 작업의 ‘구조’를 구성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어떻게 결정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 구조는 작업의 표면상의 주제와 분리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작업의 맥락으로 스며들 수 있는 것인지를 묻고 있는 것이다. 부리요는 미적 판단을 예술작품에 의해 생산되는 관계에 대한 윤리정치적인 판단과 등치시켰다. 그러나 우리가 이들 관계를 측정 또는 비교할 방법은 무엇인가? ‘관계미학’에서 관계의 질은 결코 탐색의 대상도, 질문의 대상도 되지 않는다. 부리요가 “만남이 그것을 구성하는 개인들보다 더 중요하다”고 주장할 때, 나는 이러한 질문이 그에게는 불필요하다는 것을 감지한다. ‘대화’를 허락하는 모든 관계가 자동적으로 민주적이며 따라서 좋은 것이라고 가정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 맥락에서 ‘민주주의’가 진정으로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만일 관계미술이 인간관계를 생산한다면 그다음에 논리적으로 등장하는 질문은 어떤 유형의 관계가 산출되며, 누구를 위해 또 무슨 이유로 산출되느냐 하는 것이다.
적대Antagonism
로잘린 도이치는 공공영역이 민주적일 수 있는 경우는 그 영역에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배제 행위가 고려대상이 되고 논쟁 대상이 될 때라고 주장한 바 있다. “갈등, 분리, 불안정은 따라서 민주적인 공공영역을 망쳐버리는 것이 아니다. 그것들은 그 영역의 존립조건들이다.” 그녀는 글의 도입부를 1985년에 출간된 에르네스토 라클라우Ernesto Laclau와 샹탈 무페Chantal Mouffe의 『헤게모니와 사회주의 전략: 급진 민주주의 정치를 향하여Hegemony and Socialist Strategy: Towards a Radical Democratic Politics』에서 이끌어 냈다. 라클라우와 무페의 이 책은, 저자들이 1970년대 마르크스주의 이론화의 교착상태라고 감지한 것을 추적하여, 포스트구조주의의 시각에서 좌파 정치이론을 재고한 첫 번째 책이다. 이들의 텍스트는 그람시의 헤게모니 이론과 라캉의 분열되고 탈중심화된 주체성 이해를 통해 마르크스를 재독해한 것이다. 라클라우와 무페가 개진한 여러 아이디어들은 우리로 하여금 관계미학의 정치성과 관련한 부리요의 주장을 좀 더 비판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해준다.
이들 아이디어 중의 첫 번째 것은 적대 개념이다. 라클라우와 무페에 따르면 제대로 기능하는 민주주의 사회는 적대가 모두 사라져 버린 사회가 아니다. 차라리 그 사회는 새로운 정치적 전선들이 끊임없이 그려지고 논쟁을 일으키는 사회다. 달리 말해 민주주의 사회는 갈등 관계가 지워져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유지되는 사회다. 적대 없이는 오로지 권위주의 질서의 강제된 합의 곧 토론과 논쟁의 총체적 억압만이 존재하게 된다. 이는 민주주의에 해롭다. 하지만 여기서 바로 강조해야 할 중요한 사실은 라클라우와 무페가 이해한 적대 개념이 정치적 교착상태를 비관적으로 수용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다시 말해 적대는 “정치의 장으로부터 유토피아를 축출해내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반대로 그들은 유토피아 개념이 없이는 급진적인 상상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유지한다. 과제는 총체주의에 빠져들지 않으면서 상상 속의 이상과 사회적 실정성에 대한 실용적 관리 사이의 긴장 속에서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다.
적대에 대한 이러한 이해는 라클라우와 무페의 주체성 이론에 뿌리를 두고 있다. 라캉을 따라 이들은 주체성이 그 자체로 투명하고, 합리적이며, 순수하게 현전하는 것이 아니라, 치유가 불가능할 정도로 탈중심화되어 있고 불완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note title=”38″back] 라캉에게 주체는 행위주체의 의식 감각과 등가물이 아니다. “라캉의 주체는 무의식의 주체다. (…) 그/그녀가 언어 세계 속에 진입한 결과로 불가피하게 분리되고, 거세되어, 분열된 주체(Dylan Evans, An Introductory Dictionary of Lacanian Psychoanalysis [London: Routledge, 1996], 195–96).[/note] 그러나 분명 탈중심화된 주체 개념과 정치적 행위주체라는 관념 사이에는 갈등이 존재한다. ‘탈중심화’는 통합된 주체의 결여를 함축한다. 반면 ‘행위주체’라는 용어는 충분히 현전하는 자율적인 정치적 의지와 자기결정의 주체를 내포한다. 라클라우는 이러한 갈등이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주체는 완전히 탈중심화(아마도 이 경우는 정신병자일 것이다)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완전히 통합(즉 절대적 주체)되어 있는 것도 아니다. 라캉을 따라 라클라우는 우리가 구조적인 정체성을 확보하고 있지 못하며, 따라서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동일시 과정에 의존한다고 주장한다.[note title=”39″back] “(…) 주체는 부분적으로 자기-규정적이다. 그러나 이 자기-규정성은 이미 주체인 바의 표현이 아니라 대신에 주체의 존재 결핍의 결과다. 자기-규정성은 오로지 정체확인 과정을 통해서만 계속 진행될 수 있다. (Ernesto Laclau, New Reflections on the Revolution of Our Time (1990), Deconstruction and Pragmatism, ed. Chantal Mouffe [London: Routledge, 1996], 55에서 인용.)[/note] 주체성이란 바로 이런 동일시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필연코 불완전한 실체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적대는 그 같은 불완전한 실체들 사이에서 출현하는 관계다. 라클라우는 이를 완전한 실체들 사이에서 출현하는 관계, 예를 들어 모순(A와 A가 아닌 것)이나 ‘실제로 다름’(A와 B)과 대비시킨다. 우리는 모두 상호 모순되는 신념들(예를 들면 별점을 즐겨 보는 유물론자나 크리스마스 카드를 보내는 정신분석가의 경우처럼)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신념들이 적대를 낳지는 않는다. ‘실제로 다름’(A와 B) 또한 적대와 같은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완전한 정체성에 관심을 두기 때문이다. 그것은 마치 자동차 사고나 “테러에 대한 전쟁”과 같은 충돌을 야기한다. 라클라우와 무페의 주장에 따르면 적대의 경우 “우리는 상이한 상황에 직면한다. ‘타자’의 존재는 내가 총체적으로 나 자신이 되는 것을 방해한다. 관계는 완전한 총체성으로부터가 아니라 그 총체성의 구성 불가능성으로부터 생겨난다.”[note title=”40″back] Ernesto Laclau and Chantal Mouffe, Hegemony and Socialist Strategy (London: Verso, 1985), 125.[/note] 달리 말하면 내가 아닌 것의 현전이 나의 정체성을 변덕스럽고 취약한 것으로 만들며, 타자가 제기하는 위협이 나 자신의 자아 감각을 어딘가 의문스러운 것으로 변질시켜 버린다. 사회적 차원에서 전개될 때, 적대는 스스로를 완전체로 구성해낼 수 있는 사회의 능력의 한계인 것처럼 보일 수 있다. 사회적인 것의(그리고 정체성의) 경계에 있는 무엇이 있든 간에, 사회적인 것을 정의하려는 시도는 또한 그러한 시도의 완전한 실현을 이루어 내려는 야망을 파괴한다. “다원적 민주주의의 존재 가능성의 조건인 갈등과 적대가 동시에 다원적 민주주의의 궁극적 완성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조건을 구성한다.”[note title=”41″back] Mouffe, “Introduction,” in Deconstruction and Pragmatism, 11.[/note]
부리요의 관계미학이 수립한 관계는 본질적으로 민주주의적이지 않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 이 이론을 곱씹어 보려 한다. 이 관계들은 너무도 쉽게, 주체성은 완전한 전체이고 공동체는 내재적 함께함이라는 이상 안에 머물기 때문이다. 티라바니자의 요리 작업에는 분명히 토론과 대화가 있다. 그러나 내재적인 마찰 같은 것은 없다. 왜냐하면 상황이 부리요가 불렀듯 ‘소우주적’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그 상황은 성원들이 서로를 동일시하는 어떤 공동체를 산출하는데, 그 이유는 성원들에게 어떤 공통점이 있다는 것이다. 303 갤러리에서 열린 티라바니자의 첫 번째 개인전에 대한 글들 중에서 내가 보기에 제대로 된 유일한 해석은 『아트 인 아메리카Art in America』에 실린 제리 살츠의 비평이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303 갤러리에서 나는 심심치 않게 낯선 사람들과 만나거나 그들과 같이 앉아 있곤 했다. 뭐 괜찮았다. 갤러리는 서로 무언가를 나누고, 즐겁게 농담하며, 솔직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장소로 변화되었다. 나는 놀랄 만큼 연속해서 딜러들과 함께 음식을 같이할 기회를 가졌다. 한 번은 폴라 쿠퍼Paula Cooper와 식사를 했는데, 그녀는 매우 길고 복잡한 전문적 가십의 일부와 관련해 자신이 경험한 것을 이야기했다. 다른 날에는 리사 스펠만Lisa Spellman과 식사를 했다. 그녀는 동료 딜러가 그녀의 전속 미술가 중 한 명에게 구애를 했지만 결국은 실패한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그야말로 우스꽝스러운 세부까지 내게 말해 주었다. 한 주 뒤에는 데이빗 츠뷔너David Zwirner를 만나 음식을 같이 했다. 나는 길가에서 그와 마주쳤는데, 그는 내게 “뭐 오늘 잘되는 일이 없네요, 리크리트한테 가보죠”라고 말했다. 우리는 그렇게 했고, 그는 내게 뉴욕 미술계에 신나는 일이 사라져 버린 것에 대해 이야기했다. 또 다른 시간에 나는 개빈 브라운Gavin Brown과 식사를 했다. 미술가이자 딜러인 그는 소호의 몰락에 대해 이야기했다. 갤러리들이 너무 뻔한 작품들을 전시해 왔다는 것을 느꼈을 때. 그로서는 그 몰락을 반길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전시 기간 중 후반에 나는 누군지 모르는 여인과 함께한 적이 있는데, 미묘한 추파를 던지는 것을 느꼈다. 또 다른 시간에 나는 브루클린에 사는 한 젊은 미술가와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는 자신이 보고 있는 전시에 대해 제대로 된 통찰을 갖고 있었다.[note title=”42″back] Saltz, “A Short History of Rirkrit Tiravanija,” 107.[/note]
이 해석에서 느껴지는 격식에 매이지 않는 수다스러움은 이 같은 작업에 대해 좀 더 알고자 하는 사람들이 어떤 종류의 문제에 직면했는가를 보여준다. 이 리뷰가 우리에게 말해 주는 것은 티라바니자의 개입이 좋게 여겨지는 이유가 그것이 일군의 미술 딜러들이나 비슷한 성향의 미술애호가들 사이에 만남을 주선하기 때문이며, 그것이 늦은 밤의 바 분위기를 느끼게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모든 사람이 미술에 관심이 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으며, 그 결과는 미술계 가십이나 전시 리뷰 그리고 추파다. 그러한 소통은 일정 한도까지는 별문제가 없다. 그러나 그것이 그 자체로 또 저절로 ‘민주주의’를 상징하는 표징이 될 수는 없다. 공정하게 말한다면 나는 부리요가 이 같은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는 이 문제를 자신이 관장하는 작가들과 관련해서는 제기하지 않는다. “사람들을 연결하고, 상호작용을 통한 소통의 경험을 창출하는 것… 하지만 무엇을 위해서? 이 ‘무엇을 위해서’라는 것을 잊어버린다면, 안됐지만 당신은 노키아 예술이나 하고 있게 될 것이다. 사람들 사이에서 관계를 만들어내지만 단지 그 자체를 위한 것일 뿐이고 그러한 관계들의 정치적 측면은 결코 건드리는 법이 없는 예술 말이다”[note title=”43″back] Bourriaud의 “Public Relations: Bennett Simpson Talks with Nicolas Bourriaud,” 48에서 인용.[/note]라고 그는 이야기한다. 나는 티라바니자의 미술이 적어도 부리요에 의해 제시된 바대로는 소통의 정치적 측면을 다루는 데는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할 것이다. 비록 그의 프로젝트 중 어떤 측면이 언뜻 보기에는 불협화의 방식으로 소통의 정치적 측면을 건드리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말이다. 티라바니자의 쾰른 프로젝트 〈무제(내일은 또 다른 날)〉에 대한 해석으로 되돌아가 보기로 하자. 나는 이미 그 설치 작업이 “모든 사람들에게 더불어 함께하는 인상적인 경험”을 제공했다는 큐레이터 우도 키텔만Udo Kittelman의 평을 인용한 바 있다. 그는 계속한다. “일군의 사람들이 음식을 준비하고, 이야기하거나, 목욕을 하고, 침대에 눕는다. 미술-생활-공간이 파괴되지나 않을까 하는 우려는 현실화되지 않는다. (…) 미술공간은 자신의 제도적 기능을 잃어버리고 결국 자유로운 사회 공간으로 변화된다.”[note title=”44″back] Udo Kittelmann, “Preface,” in Rirkrit Tiravanija, n.p.[/note] 『쾰른 시 저널Kolnischer Stadt-Anzeiger』도 이 작업이 “모두를 위한 일종의 ‘망명지’”를 제공했다고 같은 의견을 보였다.[note title=”45″back] Kölnischer Stadt-Anzeiger, Rirkrit Tiravanija, n.p.에서 인용.[/note] 그러나 여기서 누가 ‘모두’인가? 아마도 이것이 소우주일 것이다. 그러나 유토피아나 마찬가지로 소우주도 여전히 그 바탕에서는 그것의 실현을 방해하거나 저지하는 사람들을 배제하고 있다. (만일 티라바니자의 공간에 진짜 ‘망명지’를 원하는 사람들이 쳐들어온다면 어떤 사태가 발생할 것인가를 생각해보는 것은 솔깃한 일이다.)[note title=”46″back] 살츠는 멋들어지게 편향된 방식으로 이 질문에 대해 골똘히 사색에 잠긴다. “(…) 이론적으로는 누구든 미술 갤러리에 올 수 있다. 어떻게 올 수 없단 말인가? 하지만 왠지 미술계는 이방인을 축출해 버리는 보이지 않는 효소를 은닉하고 있는 듯하다. 만일 다음번에 티라바니자가 갤러리에 부엌을 만들었을 때 일군의 노숙자들이 매일 점심을 먹으려 나타난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만일 어떤 노숙인 남자가 입장료를 모아서는 미술관에 들어와 티라바니자의 침대에서 하루 종일 혹은 매일 잠을 잔다면 워커아트센터는 어떻게 할 것인가? (…) 티라바니자는 조용히 자신의 방식으로 이 같은 질문들을 전면에 노출시키고는, 미술계와 여타 모든 것들을 분리하는 문 위의 자물쇠(소위 말하는 수많은 정치적 미술에 의해 너무도 효율적으로 꼭꼭 빗장 질러진 채로 남겨져있는)를 억지로 여는 것이다.” 살츠가 언급한 ‘보이지 않는 효소’가 살츠에게 정확히 티라바니자의 작업이 지닌 한계 그리고 그 작업들이 공공공간이라는 논점을 대하는 적대를 지우는 접근방식과 관련하여 경고를 발하게 되는 것이다. (Saltz, “A Short History of Rirkrit Tiravanija,” 106)[/note] 그의 설치는 부리요의 관계미술 작업에 의해 생산된 관계 개념, 곧 근본적으로 조화로운 관계개념을 반영한다. 왜냐하면 그 작업들은 뭔가 공통점이 있는 관람 주체들로 이루어진 공동체에 제시된 것이기 때문이다.[note title=”47″back] 장-뤽 낭시(Jean-Luc Nancy)가 『무위의 공동체 The Inoperative Community』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1991)에서 교감으로서의 공동체라는 마르크스주의의 사고를 비판한 것은 관계미학에 대한 대항모델을 찾던 내게 결정적이었다. 1990년대 중반 이래 낭시의 텍스트는 동시대 미술 관련 저술가들에게 나날이 더욱 중요한 참고점이 되었다. 로잘린 도이치의 Evictions, 파멜라 리Pamela M. Lee의 Object to Be Destroyed: The Work of Gordon Matta-Clark (Cambridge, Mass.: MIT Press, 2000) 4장; 조지 베이커George Baker의 “Relations and Counter-Relations: An Open Letter to Nicolas Bourriaud,” in Zusammenhänge herstellen/Contextualise, ed. Yilmaz Dziewior (Cologne: Dumont, 2002); 그리고 제시카 모건 Jessica Morgan의 Common Wealth (London: Tate Publishing, 2003)가 그것이다.[/note] 이 때문에 티라바니자의 작업은 단지 대화를 독백(상황주의자들이 스펙터클과 등치시킨 일방적 소통)보다 옹호한다는 가장 느슨한 의미에서만 정치적인 것이 된다. 이 대화의 내용은 본질적으로 민주적이지 않다. 그 까닭은 모든 질문이 “이것이 예술인가”라는 진부하고 시시한 논점으로 귀결되기 때문이다.[note title=”48″back] 프랑크푸르트 알게마이네 자이퉁은 다음과 같이 보도했다. “어떤 주제도 주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예술적 맥락은 자동적으로 모든 논의들을 예술의 기능에 관한 질문들로 이끈다.” Christophe Blase, Frankfurter Allgemeine Zeitung, December 19, 1996, Rirkrit Tiravanija, n.p.에서 인용. 그는 계속해서 말한다. “이 담론이 그냥 소박한 수준에서 읽힐 것인지 혹은 맥락을 이해한 수준에서 읽힐 것인지는 우연에 속하며, 해당 참여자에 달려있다. 어쨌든 간에 소통 일반 그리고 특정하게는 예술에 대한 논의가 발생한다는 사실은 최소 (공통) 분모로서 긍정적 가치를 갖는다.”[/note] 끝이 열린 작업과 관람자의 해방을 주워섬기는 티라바니자의 현란한 언사에도 불구하고, 그의 작업 구조는 사전에 결과물을 억제하고 작업을 오락과 구분하기 위해 갤러리 안에 있다는 점에 의존한다. 티라바니자의 소우주는 공공문화의 전환이라는 관념을 포기하고, 소우주의 범위를 갤러리에 다니는 사람들로 서로를 동일시하는 사적 집단의 즐거움에 한정한다.[note title=”49″back] 본질적으로 유토피아(사회의 완성)와 10명(혹은 20명, 혹은 참여자의 수가 얼마이건) 정도의 정신적 육체적 능력에 대한 개인적 관계의 완성인 소우주 사이에는 차이가 없다. 양자는 조화로운 질서를 방해하거나 혹은 위협하는 것들을 배척하는 것에 기반해 있다. 이는 토마스 모어(Thomas More)의 유토피아에 대한 묘사 전체를 관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바이다. 여타 종교들을 비난하는 문제투성이 기독교 광신자를 묘사하면서, 여행자 라파엘(Raphael)은 다음과 같이 자신의 경험을 토로한다. “그가 얼마동안 더 이런 식으로 계속했었더라면, 그는 신성모독이 아니라 평화의 파괴라는 죄목으로 체포되고 고발되었을 것이다. 적절하게도 그는 유죄 판결을 받아 추방되었다. 왜냐하면 가장 오래된 그들의 헌법 원리는 종교적 관용이기 때문이다” (Thomas More, Utopia [London: Penguin Books, 1965], 119).[/note]
대화와 민주주의에 대한 길릭의 입장은 더 애매하다. 언뜻 보면 그가 라클라우와 무페의 적대 테제를 지지하는 것처럼 보인다.
나는 세상이 어떠해야 할지에 대해 좀 더 나은 비전을 구축하고 있는 작가들을 흠모한다. 하지만 내가 관심을 두는 중간-지대나 협상 영역은 항상 이상주의가 불투명하게 되는 시점을 맞곤 한다. 내 작업에는 우리 주위를 둘러싼 환경이 어떻게 더 나아질 수 있는가와 관련한 명확한 처방전들이 많이 있지만 타협, 전략, 붕괴를 시연하는 요소들도 그만큼 많이 있다.[note title=”50″back] Gillick, The Wood Way, 81–82.[/note]
그러나 누군가 길릭의 작업에서 ‘명확한 처방전’을 찾으려 할 경우, 무언가를 발견해낼 가능성은 거의 없다. “나는 흐릿한 아이디어들의 구름 속에서 작업하고 있다”고 그는 말한다. “이것들은 교훈적이기보다는 어딘가 불완전하든가 아니면 유사한 아이디어들이다.”[note title=”51″back] Gillick, Renovation Filter, 20.[/note] 어떤 이상이 타협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려 하지 않으면서, 길릭은 건축에다 참고문헌을 다는 작업(건축과 구체적인 사회 상황의 연루)의 신뢰성을 이용하며 특정 입장의 구체화라는 논점에 대해서는 계속 추상적인 태도를 취한다. 예를 들어 〈토론 플랫폼The Discussion Platforms〉은 어떤 특수한 변화도 지시하지 않고, 그냥 변화 일반─잠재적인 ‘서사’가 출현할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시나리오’─을 들먹일 뿐이다. 길릭의 입장은 파악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그가 옹호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개선을 위한 처방전으로서의 타협과 협상인 것 같다. 논리적으로 이 같은 실용주의는 이상의 포기나 망실에 버금가는 것이다. 그의 작업은 문제의 구체화가 아닌 타협의 시연인 것이다.[note title=”52″back] 심지어 길릭의 소우주에서는 타협에 대한 헌신이 이상이다라고까지 말할 수 있다. 흥미롭지만 성립 불가능한 가설, 궁극적으로 ‘제3의 길’식의 정치 형태보다도 더 민주적이지 못한 소우주.[/note]
이와는 대조적으로 민주주의는 적대라는 라클라우와 무페의 이론은 부리요에 의해 『관계미학』과 『포스트프로덕션』에서 눈에 띄게 무시당한 두 미술가의 작업에서 확인할 수 있다. 스위스 미술가 토마스 허쉬혼Thomas Hirschhorn과 스페인 미술가 산티아고 시에라Santiago Sierra가 그들이다.[note title=”53″back] 하지만 두 작가들은 각각 2003년 팔레 드 도쿄에서 열린 전시에 참여한 바 있다. 허쉬혼은 《글로벌 네비게이션 시스템 GNS》에 시에라는 《하드코어 Haredcor》에. 시에라에 대한 부리요의 언급은 “Est-il bon? Est-il méchant?,” Beaux Arts 228 (May 2003), 41에서 볼 수 있다.[/note] 이들 미술가도 자신의 미술에서 대화와 협상의 역할을 강조하는 ‘관계’를 수립한다. 그러나 그러면서도 이러한 관계가 작업의 내용 속으로 함몰되지 않게 한다. 그들의 퍼포먼스와 설치에 의해 산출된 관계는 소속감보다는 불편함과 불안감을 느끼게 하는 특징이 있다. 왜냐하면 그 작업은 ‘소우주’의 불가능성을 인정하고 대신에 관람자와 참여자, 맥락 사이의 긴장을 유지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긴장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다양한 경제적 배경을 가진 협업자들을 끌어들이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결국 스스로를 다른 사회적 정치적 구조를 포용하는 영역으로 간주하는 동시대 미술의 자기-인식에 도전하게끔 한다.
비동일시와 자율성
산티아고 시에라(1966년생)의 작업은 티라바니자의 작업과 마찬가지로 말 그대로 사람들, 즉 작가와 작업 참여자 그리고 관객들 사이에 관계를 수립하는 일에 관여한다. 그러나 1990년대 후반 이래 산티아고 시에라의 ‘조치action’는, 관계미학과 연관된 작가들이 만들어낸 것보다 좀 더 복잡한 따라서 좀 더 논쟁적인 관계들 주변에서 구성되었다. 시에라는 자신의 몇몇 극단적인 조치로 인해 타블로이드판 신문의 주목을 받는 동시에 적대적인 비평의 대상이 되었다. 〈네 사람에게 새겨진 160센티미터 길이의 문신160cm Line Tattooed on Four People〉(2000), 〈360시간 동안 계속되는 노동을 위해 고용된 사람A Person Paid for 360 Continuous Working Hours〉(2000), 〈자위행위를 위해 고용된 열 사람Ten People Paid to Masturbate〉(2000)이 그것들이다. 이들 일시적 행위들은 무심한 듯 흑백 사진, 짧은 텍스트, 그리고 가끔은 비디오로 기록된다. 이러한 문서화 양식은 1970년대 개념미술과 신체미술─크리스 버든Chris Burden과 마리나 아브라모비치Marina Abramovic를 떠올리게 하는─의 유산인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시에라의 작업은 다른 사람들을 퍼포머로 활용하고 그들에게 보수를 지급하는 것을 강조함으로써 이 전통을 의미심장하게 발전시켜 나간다. 티라바니자가 선물을 찬양한다면, 반면 시에라는 공짜 음식 같은 것은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모든 것, 모든 사람에게는 가격이 매겨져 있다는 것이다. 그의 작업은 사람의 ‘가격’에서 격차를 낳는 사회적 정치적 조건들에 대한 암울한 명상으로 볼 수 있다. 유럽과 미국 전역의 갤러리에서 자주 작품의뢰를 받게 되면서, 시에라는 일종의 인류학적 리얼리즘을 창출한다. 여기서 그가 한 조치의 성과 혹은 전개는 그가 작업하는 장소의 경제적 사회적 현실에 대한 일종의 지표적인 흔적을 만들어낸다.[note title=”54″back] 1996년 시에라는 멕시코로 거주지를 옮겼다. 이후 그의 조치들 대부분은 라틴 아메리카에서 이루어졌다. 조치의 결과 드러나는 ‘리얼리즘’은 대개는 글로벌화가 낳은 야만적인 폐해의 흔적들이다. 물론 모든 사례가 이렇지는 않다. 뮌헨 쿤스트할레에서 시행된 〈6개의 벤치 들어올리기Elevation of Six Benches〉(2001)에서 시에라는 노동자들에게 정해진 기간 동안 미술관 갤러리에 있는 모든 가죽 벤치들을 떠받치고 있게 만들고 보수를 지불했다. 이 프로젝트는 타협의 산물이었다. 쿤스트할레는 시에라가 노동자들이 떠받치게 하기 위해 자신들의 새로운 헤어조크 & 드 뮤론 갤러리의 벽을 뜯어내게 하고 싶지 않아 벤치를 선택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에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업 결과가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했다. “그 이유는 그 작업이 뮌헨의 노동관계의 현실을 드러냈기 때문이다. 뮌헨은 깨끗하고 풍요로운 도시라, 결과적으로 과제를 손쉽게 해결하기 위해 찾아낼 수 있는 사람은 단지 그들의 육체적인 기량을 드러내 보이기를 원한 비정규직 배우나 바디빌더들 뿐이었다.”(Sierra, “A Thousand Words,” Artforum [October 2002], 131)[/note]

시에라의 실천에 대한 이런 식의 해석은 그의 작업에 대한 지배적인 독해, 즉 그의 작업은 마르크스의 노동 교환가치 이론에 대한 허무주의적 반응이라고 보는 독해에 대항하는 것이다. (마르크스는 자본가가 노동자의 노동시간을 그 연후에 발생하는 교환가치, 즉 노동자의 노동에 의해 생산된 상품 형태에 내재한 교환가치보다 더 낮게 평가한다고 주장했다.) 시에라가 자신의 협업자들에게 요구한 과제들은 언제나 쓸모없고, 육체적 부담이 크며, 가끔은 영구적으로 흉터를 남기는 일들이다. 이 과제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심지어 그야말로 굴욕적이거나 무의미한 일이라도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는 준비된 학대를 폭로하기 위해 현재의 상태를 확대 과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시에라는 예술가로서 그의 조치에 대한 보수를 받고, 그가 만들어내는 상황이 지닌 모순을 시인한 최초의 작가다. 이 때문에 그를 폄하하는 사람들은 그가 비관적 견해를 명확히 드러내고 있는 것이라고, 즉 자본주의는 착취하며, 게다가 그 누구도 이 시스템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시에라는 다른 사람들을 고용하여 자신이 보수를 받고 하기로 되어 있는 일을 하라고 돈을 지불한다. 마찬가지로 그 자신은 갤러리와 딜러, 컬렉터에 의해 착취당한다. 시에라 자신도 스스로 의견을 밝힐 때 이 같은 견해와 모순되는 행동을 절대로 하지 않는다.
나는 아무 것도 바꿀 수 없다. 우리의 예술작업으로 무언가를 변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란 없다. 우리가 작업을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술을 만들어 내기 때문이며, 예술은 현실을 뒤따르는 무엇이어야 한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변화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믿음이 없다.[note title=”55″back] Sierra, Santiago Sierra: Works 2002–1990 (Birmingham, England: Ikon Gallery, 2002), 15에서 인용.[/note]
시에라가 현재의 상태와 공모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의 작업이 얼마나 티라바니자의 작업과 다른 것이냐는 질문이 생겨난다. 여기서 유념해볼 만한 것은 1970년대 이래 대립과 변형이라는 과거 아방가르드의 수사가 자주 공모의 전략으로 대체되곤 했다는 사실이다. 문제는 공모가 아니고, 공모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하는 것이다. 티라바니자의 작업이 장조음악으로 경험된다면, 시에라의 작업은 그야말로 확실하게 단조다. 이들의 차이를 좀 더 파고들려면, 관계미학과 헤게모니라는 이중 렌즈를 통해 시에라의 작업을 읽어내야 하며,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은 그러한 시도다.
시에라가 자신의 조치들을 문서로 남긴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미 언급한 바 있다. 이를 통해 시에라는 자신이 하는 조치들의 ‘구조’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도록 분명하게 드러낸다. 멕시코시티에서 2000년에 작업한 〈벽에서 떨어져 다섯 사람이 지탱하고 있는 60도 기울기의 갤러리 벽The Wall of a Gallery Pulled Out, Inclined Sixty Degrees from the Ground and Sustained by Five People〉을 예로 들어보자. 끝이 열린 작업 관념을 고수했던 티라바니자나 길릭과는 달리 시에라는 초청할 참여자 및 이벤트가 발생할 맥락을 선택할 때 처음부터 제한을 둔다. 길릭과 티라바니자에게 있어 ‘맥락’은 핵심어 구실을 한다. 그러나 맥락을 실제로 구성하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거의 고심하지 않는다. (사람들은 그 맥락이 사이버공간처럼 무차별적이고 무한하다는 느낌을 받는다.) 라클라우와 무페는 어떤 맥락이 구성되고 또 바로 그 맥락으로 확인될 수 있으려면, 그 맥락에는 특정한 한계들이 설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적대는 바로 이 같은 한계설정에서 생겨나는 배제로부터 발생한다. 관계미술이 ‘끝이 열린 작업’을 선택하면서 부인하는 것이 바로 이 배제 행위다.[note title=”56″back] 라클라우가 주장하듯이 정치 사회의 구성요소는 바로 이 같은 “근원적 결정불가능성”이자 이 결정불가능성 안에서 취해져야 할 결정이다. Laclau, Emancipation(s) (London: Verso, 1996), 52–53을 보라.[/note] 시에라의 조치는 대조적으로 다른 ‘제도들’(예컨대, 이민, 최저임금, 교통 체증, 불법 노점상, 노숙자 등) 속으로 파고들어가 이러한 맥락들이 강요하는 분할의 측면들에 조명을 비춘다. 결정적인 것은 그러나 시에라가 이런 분할들을 화해된 것으로 (티라바니자가 미술관을 카페나 아파트로 지워버리듯이) 제시하지도 않고, 또 완전히 갈라진 영역들로 제시하지도 않는다는 점이다. 그의 작업이 구현되었다는 사실로 인해 그 분할들은 (완전한 정체성들 사이의 충돌이라는 ‘자동차 사고’ 모델이 아니라) 적대의 영역으로 이동하며, 그러한 분할들 사이의 경계는 불안정할 뿐 아니라 변할 수 있다는 암시를 준다.

시에라는 2001년 베니스 비엔날레를 위해 만든 작업 〈머리를 금발로 염색하도록 고용된 사람들〉에서 불법 노점상들을 초청했다. 그들 대부분은 남부 이태리나 세네갈, 중국, 방글라데시 이민자들이었다. 그들은 12만 리라(60달러)를 받고 자신들의 머리를 금발로 염색했다. 그들의 유일한 참가조건은 머리가 원래 검은색이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 작업에 대한 시에라의 설명은 많은 사람들이 머리를 염색한 이후에 그의 조치가 미친 충격을 기록하지 않고 있지만, 사후 여파 또한 이 작업의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었다.[note title=”57″back] “작업의 진행은 병기고 전시장 안의 창고의 문 안쪽에서 그 해 베니스 비엔날레 개회식이 이루어지는 동안 집단적으로 시행되었다. 원래 이 작전에 참여하기로 예정된 사람의 숫자는 200명이었지만, 결국 마지막에는 133명까지 그 숫자가 줄어들었다. 이는 갈수록 더 많은 이민자들이 들이닥쳤기 때문인데, 이로 인해 얼마나 많은 사람이 홀 안에 이미 들어갔는지를 정확히 세는 것이 어려워졌다. 때문에 입구의 셔터를 내리고 숫자를 대강 세게 되면서 이런 결과가 초래됐다. 들어가지 못하거나 이미 들어간 사람들이 끊임없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로 인해 문 앞에서 많은 문제가 생겨났다”(Sierra, Santiago Sierra, 46에서 인용).[/note] 베니스 비엔날레 기간 동안 거리의 모퉁이를 서성이며 가짜 명품 핸드백을 팔려고 하는 노점상들은 통상 현란한 오프닝으로부터 가장 명확하게 배제되는 사회집단이다. 그러나 2001년에는 새로 염색한 그들의 머리카락이 베니스에 그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문자 그대로 눈에 띄게 드러냈다. 이는 비엔날레 내부에서 행해진 제스처와 짝을 이루었다. 시에라가 자신에게 할당된 예전 병기고 자리의 전시공간을 몇 안 되는 노점상들에게 넘겨주었던 것이다. 노점상들은 그들이 길거리에서 그랬듯이 방수포를 깔고 그 곳을 가짜 펜디Fendi 상표 핸드백을 파는데 사용했다. 시에라의 제스처는 1970년대의 제도비판 양식으로 미술과 상행위 사이의 씁쓸한 유비 관계를 떠올리게 했지만, 궁극적으로는 이를 넘어 나아갔다. 왜냐하면 노점상과 전시가 직접 대면을 하자 상호 소외가 일어났기 때문이다. 거리에서는 물건을 팔려고 지나가는 행인들을 다짜고짜 외쳐 부르던 노점상들이 그러는 대신 주눅 들어 있었다. 그래서 그들과 나 자신의 만남은 훈훈한 것이 되었는데, 나중에야 깨달은 것이지만 그 훈훈함은 나 자신이 비엔날레의 ‘내부자’로서 느끼는 불안한 마음이 풀어지면서 생겨난 것이었다. 이 사람들은 분명 배우들이겠지? 그들이 여기로 몰래 숨어들어온 것은 일종의 농담? 시에라의 조치는 서로가 서로를 비동일시하는 순간을 전면에 드러냄으로써 미술관객의 정체감을 뒤흔든다. 정체감의 토대는 정확히, 노골적인 상행위를 베일로 가리는 것에 있을 뿐 아니라 무언의 인종적 계급적 배제에도 있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시에라의 작업이 두 시스템 사이를 조화롭게 화해시킨 것이 아니라 그들 사이의 긴장을 지속시켰다는 점이다.
시에라는 2003년 베니스 비엔날레에도 다시 나와 스페인 관에서 주요한 퍼포먼스/설치 작업을 했다. 〈공간을 막는 벽Wall Enclosing a Space〉은 콘크리트 블록으로 이 건물 내부를 바닥에서 천장까지 봉인해 버렸다. 건물에 들어가려는 관람객들 앞에는 대충 쌓았지만 난공불락의 벽이 막고 서 있어서 갤러리로 접근할 수가 없었다. 스페인 여권을 가진 방문객들은 건물 뒤를 통해 공간에 들어갈 수 있게 안내를 받는다. 그곳에서는 두 명의 이민국 직원이 여권을 검사한다. 그러나 스페인 국적이 아닌 모든 사람들은 건물에 들어가는 것이 금지된다. 건물 내부에는 전년도 전시를 하고 남은 벽들에서 일어난 회색 페인트 껍질들 말고는 아무것도 없다. 이 작업은 부리요의 의미에서 ‘관계적’이다. 그러나 이 작업은 공공 공간처럼 우리의 모든 상호작용도 사회적 법적 배제로 갈가리 찢어져 있음을 드러냈으며, 이를 통해 관계란 유동적이고 제약에 묶이지 않는다는 생각을 문제 삼는다.[note title=”58″back] 라클라우와 무페가 결론적으로 이야기했듯이 정치는 어떤 “사회적인 것의 본질”을 상정하는 데에 근거를 두어서는 안 된다. 반대로 모든 ‘본질’의 모호함과 우발성에 대한 확신 그리고 사회 분할과 적대의 구성적 성격에 기초해야 한다. Laclau and Mouffe, Hegemony, 193을 보라.[/note]

토마스 허쉬혼(1957년생)의 작업도 종종 비슷한 논점들을 다룬다. 그의 실천은 통상 조각 전통에 기여한 것으로 해석된다. 다시 말해 그의 작업은 관객들을 카드보드, 청테이프, 은박지 같은 값싸고 변질되기 쉬운 재료들로 결합된 발견된 이미지, 비디오, 복사물들 속에 파묻히게 하는 방식으로 기념비, 기념관, 제단을 다시 발명해 낸다고 이야기된다. 갤러리 밖에 위치할 경우 작업이 파손되거나 도난당하곤 한다는 점이 이따금 언급되곤 하는 것 외에, 그의 미술에 관한 저술에서 관람객의 역할이 심각하게 고려되는 경우는 거의 드물다.[note title=”59″back] 이 같은 접근방식의 가장 확실한 사례는 벤자민 부클로(Benjamin H. D. Buchloh), “Cargo and Cult: The Displays of Thomas Hirschhorn,” Artforum (November 2001)이다. 허쉬혼의 조각은 주변부 지역에 자리를 잡기 때문에 가끔 내용물이 도둑을 맞곤 했다. 특히 2000년 글래스고에서 전시가 열리기 전 도둑맞은 일은 잘 알려져 있다.[/note] 허쉬혼은 자신이 정치적 미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미술을 정치적으로 만든다는 주장으로 유명하다. 의미심장하게도 이 같은 정치적 헌신은 공간 속의 관객을 말 그대로 능동화하는 방식을 취하지 않는다.
나는 관람객에게 내가 하는 작업과 상호작용을 하라는 권유나 의무를 부과하고 싶지 않다. 공중을 능동적으로 만드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작업을 대면한 관람객이 그 작업에 참여하고 연루될 수 있지만 행위자로서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닌 딱 그 정도로만, 나 자신을 투여하고 관여하는 것이다.[note title=”60″back] Hirschhorn, interview with Okwui Enwezor, in Thomas Hirschhorn: Jumbo Spoons and Big Cake (Chicago: Art Institute of Chicago, 2000), 27.[/note]
허쉬혼의 작업은 동시대 미술이 자신의 관객을 상상하는 방식에서 일어난 중요한 전환을 드러낸다. 그 전환은 예술의 자율성에 대한 그의 주장과 맞물려 있다. 관계미학을 지탱하는 전제 중 하나는 예술은 특권적이거나 독립적인 영역이 아니며 따라서 ‘삶’과 융합되어야 한다는 사고, 곧 역사적 아방가르드에 의해 도입되어 이후 계속 되풀이 되어 온 사고이다. 예술이 오락, 레저, 비즈니스와 같은 일상의 삶 속으로 너무도 전면적으로 포섭되어 버린 오늘날, 허쉬혼과 같은 예술가가 다시금 예술 행위의 자율성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허쉬혼은 자신의 작업을 ‘끝이 열려 있다’거나 관객에 의한 완성이 요구되는 것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의 실천이 내포하는 정치는 대신 그 작업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에서 파생되기 때문이다.
예술을 정치적으로 만든다는 것은 위협하지 않는 재료, 지배하지 않는 구성방식, 유혹하지 않는 장치를 선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술을 정치적으로 만든다는 것은 소위 말하는 ‘정치적 예술’과는 달리 이데올로기에 복종하지 않는 것 또는 시스템을 비난하지 않는 것이다. 그것은 전력을 다하여 ‘질’의 원리에 맞서는 작업이다.”[note title=”61″back] 위의 책, 29. 허쉬혼은 여기서 클레멘트 그린버그와 마이클 프리드Michael Fried 그리고 여타 비평가들이 미적 판단의 기준으로 옹호된 질이라는 아이디어를 언급하고 있는 것이다. 나는 ‘질’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때 (“관계미학에서의 관계의 질”에서처럼) 허쉬혼의 암시적인 언급방식과는 거리를 두고자 한다.[/note]
민주주의의 수사는 허쉬혼의 작업 구석구석에 배어있다. 그러나 그 수사가 관람객을 말 그대로 능동화하려는 데에서 드러나지는 않는다. 차라리 그것은 그의 ‘제단’에서와 같이 구성방식, 재료, 입지를 고려하는 결정들에서 나타난다. 그 제단은 도시 근교의 주변적인 입지들에 위치해 있거나 우연한 장소에 놓인 꽃이나 인형 같은 임시방편의 기념물들을 따라서 모방한다. 이들 작업에서─양자 모두 2001년에 제작된 설치작업 〈극-자아Pole-Self〉, 〈빨래방Laundrette〉에서와 같이─발견된 이미지, 텍스트, 광고물, 복사물들은 소비의 따분함과 정치적 군사적인 잔혹행위를 문맥화하기 위해 병치된다.
허쉬혼의 관심사 중 많은 것들이 11회 도큐멘타에서 이루어진 작업 〈바타유 모뉴멘트Bataille Monument〉(2002)에 나타난다. 도큐멘타 주 전시장에서 수마일 떨어진 카셀 외곽 노르드슈타트에서 제작된 이 모뉴멘트는 커다란 임시 가건물로 이루어진 3개의 설치물, 지역에 사는 가족이 운영하는 바, 한 그루 나무로 만들어진 조각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이들 모두는 두 개의 저소득 주택단지에 의해 둘러싸인 풀밭 위에 세워져 있었다. 가건물들은 허쉬혼의 특유의 재료들, 값싼 목재, 호일, 플라스틱 판, 청테이프로 구축되었다. 첫 번째 건물은 바타유 관련 5가지 주제, 곧 단어, 이미지, 예술, 섹스, 스포츠를 중심으로 수집된 책과 비디오 도서관이다. 여러 개의 낡아 빠진 소파들, TV, 비디오가 덧붙여 제공되며, 전체 설치는 허쉬혼이 스스로 ‘팬’이라고 밝힌 그 철학자 바타유와 친숙해 질 수 있도록 디자인되었다. 두 개의 다른 가건물은 TV 스튜디오와 바타유의 삶과 작업에 대한 정보를 담은 설치작업으로 건축되었다. 바타유 모뉴멘트를 보려면 방문객들은 이 작업의 또 다른 국면에도 참여해야 한다. 즉 도큐멘타 방문객들을 이 장소까지 태워오고 또 태워가기로 계약된 터키계 택시회사의 택시에 의무적으로 탑승해야 하는 것이다. 이 경우 관람객들은 타고 온 택시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모뉴멘트〉에서 발이 묶이게 되며, 그동안 그들은 불가피하게 바를 이용해야 한다.
허쉬혼은, 〈모뉴멘트〉를 인종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도큐멘타의 주요 관객일 수 없는 커뮤니티의 한가운데 배치함으로써, 예술 여행객들의 유입과 지역 주민들 간의 기묘한 관계개선을 시도했다. 이 프로젝트는, 지역 사람들을 그가 ‘동물원 효과’라고 부른 것에 종속시키기보다 방문객들이 스스로를 불청객으로 느끼게 만든다. 게다가 국제 미술계의 지적 허세의 견지에서 볼 때 좀 더 일탈적인 것은, 허쉬혼의 〈모뉴멘트〉가 지역 주민들을 진지하게 바타유의 잠재적인 독자로 간주했다는 점이다. 이 같은 제스처는 방문객들에게 허쉬혼의 제스처가 부적절하고 가르치려 하는 태도를 가진 것이라는 비난을 포함한 다양한 정서적인 반응을 야기했다. 이 같은 불편함은 미술계가 자체 구축한 정체성이 너무도 쉽게 깨질 수 있다는 것을 드러낸다. 〈바타유 모뉴멘트〉의 내용, 구성, 입지에서 작용하는 이 같은 동일시와 탈통일시 기제와 관련한 복합적인 유희는 급진적이고 파열적으로 사고를 촉발한다. 다시 말해 ‘동물원 효과’는 쌍방향으로 작동한다는 것이다. 〈바타유 모뉴멘트〉는 도큐멘타 안내서가 주장하듯이 “공동의 참여”에 대한 성찰을 제공하기보다, 공동체의 정체성이나 예술과 철학의 ‘팬’이라는 것이 의미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기존의 사고를 뒤흔든다(따라서 해방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바타유 모뉴멘트〉 같은 작업은 충격효과를 해당 작업의 구체적인 맥락에 의존한다. 그러나 이론적으로 그것은 비슷한 상황의 다른 곳에서도 다시 상연될 수 있다. 의미심장하게도 관람객은 더 이상 말 그대로의 참여(국수를 먹는다든가 조각을 현실화한다든가)를 요구받지 않는다. 단지 풍부한 사고를 지닌 성찰적인 방문객이기를 요청받을 뿐이다.
“나는 상호작용적인 작업을 원치 않는다. 나는 능동적인 작업을 원한다. 내게는, 예술작업이 야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행위는 사유하는 행위다. 앤디 워홀의 〈커다란 전기의자Big Electric Chair〉(1967)는 나로 하여금 생각을 하게 만든다. 그러나 그것은 미술관 벽에 걸린 회화다. 능동적인 작업은 우선 나부터 솔선수범을 하라고 요구한다.”[note title=”62″back] Thomas Hirschhorn, in Common Wealth, ed. Morgan, 63.[/note]
허쉬혼이 자신의 작업─비록 협업으로 제작되었지만 그의 예술은 단일 예술가의 비전의 산물이다─에서 주장하는 독립적인 태도는 예술의 자율성을 일정 정도 재수용한다는 것을 함축한다. 마찬가지로 관람객은 더 이상 미술가의 상호작용에 대한 요구를 충족시키라고 강요받지 않으며, 독립적인 사유의 주체로서 전제된다. 이 사유의 주체가 정치 행동의 선행 조건이다. 다시 말해 “성찰 능력을 갖고 비판적 사유를 하는 것이 능동적인 것이며,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활력 있게 사는 것이다.”[note title=”63″back] 위의 책, 62.[/note] 〈바타유 모뉴멘트〉는 설치와 퍼포먼스 미술이 이제 예술과 삶의 경계를 무너뜨리라는 역사적 아방가르드의 요청으로부터 유의미한 거리를 취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관계적 적대
토마스 허쉬혼과 산티아고 시에라의 작업에 대해 내가 관심을 갖는 까닭은, 이 작업들이 부리요가 제안한 것과는 달리 ‘관계’에 대해 좀 더 거칠고 일탈적인 접근방식을 취하기 때문만 아니라 그것들이 ‘새로운 장르 공공미술new genre public art’의 지원 아래 1980년대 이래 출현했던 사회문제에 관여하는 미술socially engaged public art 프로젝트들에 대해 거리를 취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나 시에라와 허쉬혼의 작업이 좀 더 나은 민주주의 표출한다는 점이 그것들을 좀 더 나은 예술로 만드는가? 많은 비평가들의 경우 답변은 명확하다. 물론 그렇다! 이다. 그러나 이 같은 질문이 제기된다는 것 자체가 동시대 미술비평에 널리 퍼진 추세의 징후를 보여준다. 오늘날 정치적, 도덕적, 윤리적 판단이 40년 전에는 생각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미적 판단의 진공상태를 채우고 있다. 이는 부분적으로는 포스트모더니즘이 미적 판단이라는 개념 자체를 공격했기 때문이며, 또 부분적으로는 동시대 미술이 관람객과의 말 그대로의 상호작용을 점점 더 구체화된 방식으로 추구해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관람객의 탄생’ (그리고 이 탄생과 함께 온 해방의 황홀한 약속)이 더 높은 기준에 대한 호소를 멈추게 하지는 못했으니, 그 기준은 그저 모습만 달리 해서 돌아왔을 뿐이다.

이것은 여기서 적절히 다루어지기는 힘든 논점이다. 나는 단지 부리요가 ‘관계미학’의 전범이라고 간주하는 작업이 정치성을 가진 것으로 이해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이 명제를 진지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을 뿐이다. 실상 오늘날 우리 앞에는 수많은 매체들을 가로질러 관객참여와 능동적 관람을 시도해 온 오랜 예술 작업의 전통이 놓여있다. 1920년대 독일 실험연극으로부터 뉴웨이브 영화와 1960년대 누보로망에 이르는, 미니멀 조각으로부터 1970년대 포스트-미니멀 설치미술에 이르는, 그리고 보이스의 사회적 조각으로부터 1980년대 사회문제에 관여하는 퍼포먼스 미술에 이르기까지의 전통이 바로 그것이다. 관객을 능동화하는 것이 바로 민주적인 행위라는 말만으로는 더 이상 충분치 않다. 왜냐하면 모든 예술작업 심지어는 가장 ‘끝이 열린’ 작업도 관객이 그 작업과 더불어 겪어낼 참여의 깊이를 미리 규정해버리기 때문이다.[note title=”64″back] 내게는 신문이 독자들로부터 (독자편지 란을 통해) 의견을 얻어내려 애쓰고 그로써 그/그녀를 협업자로까지 상승시킨다는 이유로 신문을 상찬한 발터 벤야민이 떠오른다. “독자는 항상 필자가 될 준비가 되어있다”라고 그는 말한다. “즉 기술(記述)자 뿐 아니라 처방하는 자 (…) 그는 저자에로 접근한다.” (Benjamin, “The Author as Producer,” in Benjamin, Reflections [New York: Harcourt Brace Jovanovich, Inc., 1978], 225) 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신문은 편집자를 보유하고 있으며, 독자편지 란은 편집자의 소관 아래 있는 다른 수많은 저자들의 면 중 하나일 뿐이다.[/note] 허쉬혼은 그 같은 해방의 위장이 더 이상 필요치 않다고 주장한다. 다시 말해 모든 예술은, 그것이 실감을 주건 아니건 우리의 사고를 지배적이며 선재하는 합의로부터 거리를 두게 하는 가운데 가치를 전유하고 재할당하는 비판적인 힘으로 작용할 수 있다. 오늘날 우리 앞에 있는 과제는 동시대 미술이 관객에게 어떻게 접근하는가를 분석하고 그 미술이 관객들 사이에서 산출하는 관계의 질을 평가하는 것이다. 즉 작업이 전제하는 주체의 위치나 작업이 옹호하는 민주주의 개념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작품을 경험할 때 어떻게 표명되는지를 분석하고 평가해야 하는 것이다.
내가 제시한 바대로라면 허쉬혼과 시에라의 작업은 관람객을 직접적으로 능동화하거나 혹은 관객을 말 그대로 작품에 참여시키는 일에 더 이상 묶여 있지 않다. 이는 이 작업이 클레멘트 그린버그가 옹호한 것과 같은 고급 모더니즘으로의 귀환을 의미한다는 말이 아니다. 차라리 사회적인 것과 미적인 것을 좀 더 복합적으로 겹치게 하는 작업으로의 귀환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이런 모델에서 적대가 의존하는 화해 불가능성의 핵심은 상호 배타적인 영역들로 인식된 예술과 사회 사이의 긴장 속에 반영된다. 시에라와 허쉬혼의 작업이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자기-성찰적인 긴장 말이다.[note title=”65″back] “사회적인 것은 부정성에 의해─즉 적대에 의해─관통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투명한 즉 완전한 현전 상태에 도달하지 못한다. 그리고 그것의 정체성이 지닌 객관성은 영원히 전복된 상태에 있다. 바로 이 지점으로부터 객관성과 부정성 간의 불가능한 관계가 사회적인 것의 구성요소가 된다(Laclau and Mouffe, Hegemony, 129).[/note]
이렇게 볼 때 시에라의 작업에서 그렇게 자주 발견할 수 있는 차단 혹은 봉쇄의 모티브는 테오도르 아도르노Theodor Adorno가 옹호한 모더니즘적 거부로의 회귀라기보다는 사회적인 것과 미적인 것을 융합하려고 시도한 한 세기가 지난 뒤 양자의 경계선들을 인정하는 표현이다.[note title=”66″back] 시에라의 작업에서 차단 혹은 봉쇄는 〈한국의 부산시립미술관 입구를 막도록 보수가 지불된 68명의 사람들 68 People Paid to Block the Entrance to Pusan’s Museum of Contemporary Art, Korea〉(2000) 혹은 〈멕시코시티 타마야 미술관의 방에 서있도록 보수가 지불된 465명의 사람들 465 People Paid to Stand in a Room at the Museo Rufino Tamaya, Mexico City〉(1999)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끊임없이 재등장하는 모티브다.[/note] 베를린 쿤스트-베르케에서 열린 시에라의 전시에서 관객들이 대면한 것은 임시로 만든 일련의 판지 상자들이었는데, 이 상자들 각각에는 독일로 망명하려는 체첸인 난민들이 숨겨져 있었다.[note title=”67″back] 〈판지 상자 안에 머물러 있도록 보수가 지불된, 보수가 지불될 수 없는 노동자들 Workers Who Cannot Be Paid, Remunerated to Remain Inside Cardboard Boxes〉, Kunst-Werke, Berlin, (September 2000). 6명의 노동자들이 6주간 동안 하루 4시간씩 상자 안에 숨어있었다.[/note] 이 상자들은 토니 스미스Tony Smith가 만든 6×6 피트 크기의 유명한 조각 〈주사위Die〉(1962)에 대한 아르테 포베라Arte Povera 식 해석이었는데, 스미스의 조각에 대한 마이클 프리드의 유명한 설명에 따르면 그것은 “다른 사람이 말없이 현전”[note title=”68″back] Fried, “Art and Objecthood,” Artforum (Summer 1967), Minimal Art, ed. Gregory Battcock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5), 128에 재수록.[/note]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관람자에게 행사한다. 시에라의 작업에서 이 말없는 현전은 말 그대로였다. 왜냐하면 불법 이민자를 고용하여 임금을 주는 것은 독일법을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난민들의 신분을 갤러리는 공표할 수 없었다. 그들의 침묵은 판지 상자 아래서 그들이 문자 그대로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과장되고 팽팽해졌다. 그 작업들에서 시에라는 미니멀리즘의 현상학적인 신체는 정확히 그것이 다른 사람들과 맺는 관계─혹은 관계의 결핍─의 질을 통해 정치화된다고 주장하는 듯하다. 즉 시에라의 조치에 등장하는 참여자들을 목격할 때─그들이 벽을 마주보고 있거나 상자 속에 앉아 있거나 선 모양 문신을 하거나─우리의 반응은 관계미학의 ‘함께 함’과 매우 다르다. 시에라의 작업은 우리 앞의 난감한 상황을 수습하는 초험적인 인간적 공감의 경험을 제공하지 않는다. 그의 작업은 “이것은 내가 아니다”라는 신랄한 인종적 경제적 비동일시의 경험을 제공한다. 이 같은 마찰의 지속, 그 난감함과 불편함 때문에 우리는 정신이 번쩍 들어 시에라의 작업이 산출하는 관계적 적대를 주목하게 된다.
허쉬혼과 시에라의 작업은 부리요의 관계미학, 티라바니자의 소우주 공동체, 그리고 길릭의 시나리오 형식주의의 주장과 대립한다. 티라바니자와 길릭이 채택한 기분-좋아라는 입장은 그들을 국제 아트 씬 도처에서 발견할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해준다. 그리고 몇몇 큐레이터들이 계속 반복해서 그들을 선택하는 까닭을 설명해준다. 이들 큐레이터들은 자신들이 선택한 작가들을 홍보함으로써 유명해졌으며, 그로써 스스로 당연하게 세계 각지를 순방하는 스타가 되었다. 이 같이 아늑한 분위기 속에서 미술은 스스로를 지켜낼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그리고 그것은 보상적이며 자기만족적인 오락 속으로 무너져 내린다. 허쉬혼과 시에라의 작업이 더 나은 것은 단순히 더 나은 정치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 아니다(비록 이들 양자 모두 오늘날 블록버스터 미술 순회전의 가장 눈에 자주 띄는 작가가 되었을지라도). 그들의 작업은 미술로서 할 수 있는 것의 한계가 있음을 인정한다. (허쉬혼은 “나는 활동가도, 교사도, 사회사업가도 아니다”라고 말한다.) 또한 미술과 사회 사이의 전이 관계에 대한 모든 손쉬운 주장들을 엄밀한 검토의 대상으로 삼는다. 그들의 실천을 뒷받침하는 주체성 모델은 조화로운 공동체에 사는 허구적인 온전한 주체가 아니라, 끊임없는 흐름에 따라 부분적 동일시를 오락가락하는 분열된 주체다. 관계미학이 공동체란 함께 하는 것이라면서 그 전제조건으로 통합된 주체를 요구한다면, 허쉬혼과 시에라는 오늘날의 분열되고 불완전한 주체에게 좀 더 적절한 모드의 예술적 경험을 제공한다. 이러한 관계적 적대는 사회적 조화에 근거하지 않고, 이 같은 조화 비슷한 것을 유지하기 위해 억압되는 것들을 드러내는 데 근거를 둘 것이다. 그것은 따라서 우리가 세계와 그리고 타인과 맺는 관계를 다시 사유하는 데 필요한 더 구체적이고 논쟁적인 토대를 제공할 것이다.
**
해당 글은 경기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웹진 《똑똑TalkTalk 커뮤니티와 아트》에 수록된 바 있으며 재단과 번역자의 동의를 얻어 부분 수정 후 재게재함을 밝힙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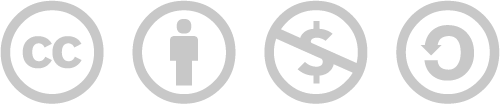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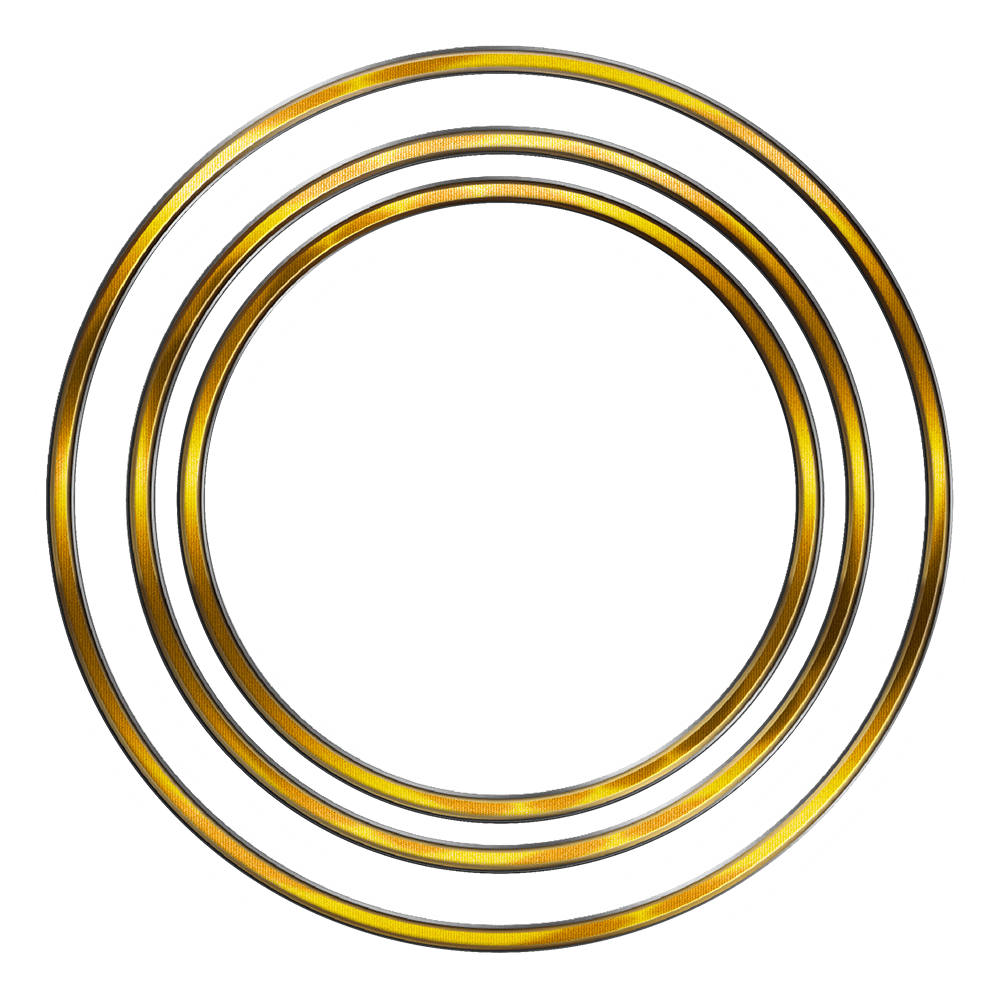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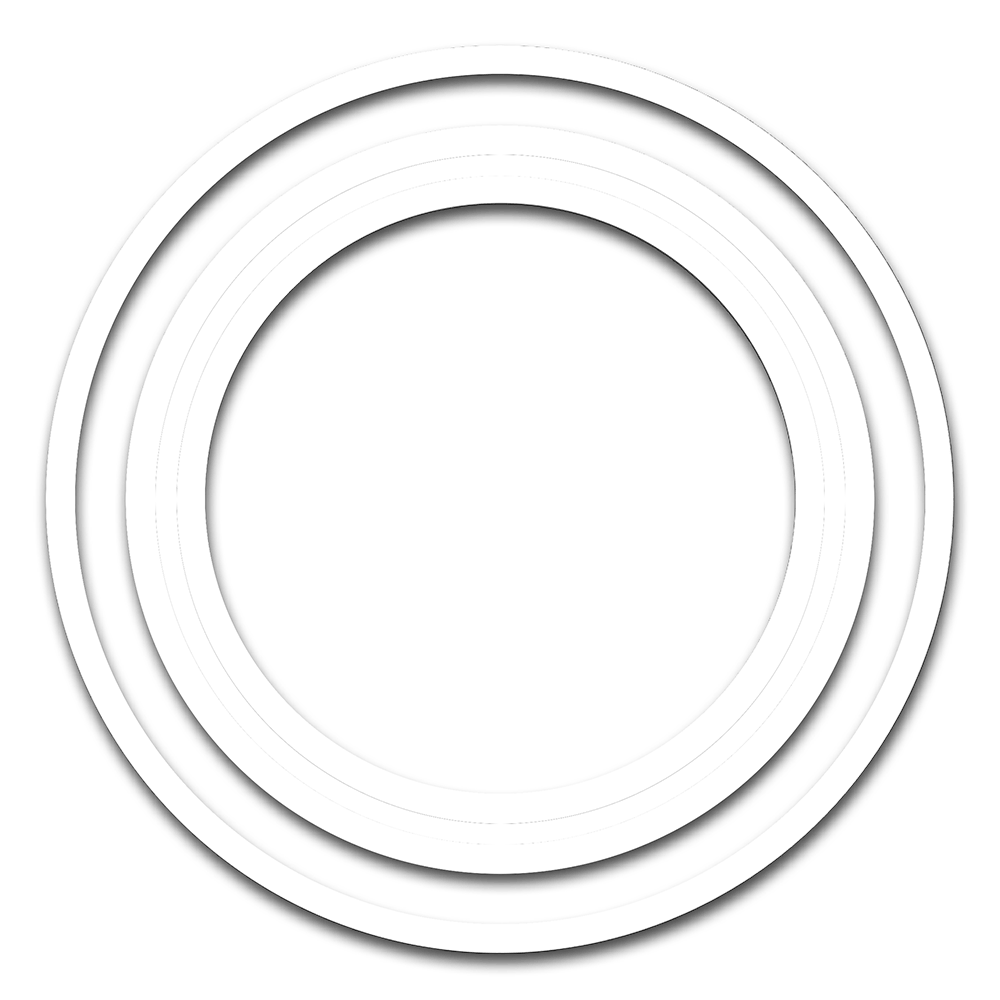
 close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