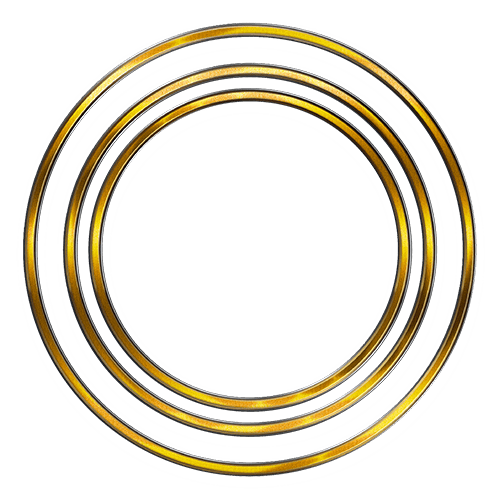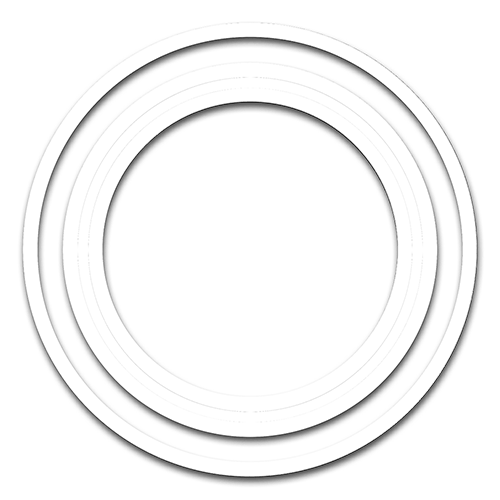우리가 진입한 시대(DVD, VOD, LCD, LED, 스마트폰, 태블릿 PC, 스트리밍, 영상 파일의 시대)를 포스트-시네마토그래픽 시대라고 말할 수 있겠다. 이 시대에서 영화는 우리의 삶과 사고, 행동에 내재되는 한편, 관객들이 이미지와 사운드, 즉 시네마와 맞닥뜨리는 전통적인 장소는 느리지만 지속적으로 구식이 되고 있다.[note title=”1″back] 이 주장에 관한 더 확장된 논의는 다음 글에서 볼 수 있다. Patricia Pisters: The Matrix of Visual Culture. Working with Deleuze in Film Studies. Stanford,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2003; Malte Hagener: “Where Is Cinema (Today)? The Cinema in the Age of Media Immanence“. In: Cinema & Cie. (special number “Relocation” edited by Francesco Casetti), no. 11, Fall 2008: 15-22; Francesco Casetti: “The Relocation of Cinema”. In: NECSUS – European Journal for Media Studies, no. 2 (autumn 2012): http://www.necsus-ejms.org/the-relocation-of-cinema/ (20.9.2013)[/note] 그 전통적 의미에서의 시네마가 사라지고 있다면, 시네필리아[note title=”2″back] [옮긴이] 시네필과 시네필리아, 시네아스트 : ‘phile’과 ‘philia’의 의미에 따라, 시네필(cinephile)은 영화를 사랑하는 사람, 시네필리아(cinephilia)는 영화에 대한 사랑 혹은 열정적인 관심을 가리킨다. 시네아스트(cineast)는 영화를 만드는 시네필을 뜻한다.[/note]에게는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 시네마필리아를 특징 짓는 것은 향수에 젖어 특정한 공간이나 장소(관객석), 혹은 (돈을 낸 관객 앞의 반사되는 표면 위에 35mm 필름을 영사하는 것과 같이) 무빙 이미지를 보여주는 특정한 시설과 방법에 얽매이기보다, 영화 그리고 시청각적 제재audiovisual material를 경험하는 방식에 대한 특정한 태도라는 점을 제안하려 한다. 그리고 시네필리아의 고전적 시기(1950년대와 60년대)에 대한 개요를 약술한 후, 포스트-시네마토그래픽 시대에 ‘시네필리아’가 겪어온 변모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 개략하려 한다. 시네필리아는 언제나 의미의 고정성과 안정성을 초과하는 실천이며, 특유한 양식으로 세계와 세계의 이미지를 전유하는 능동적 방법이다. 그러므로 시네필리아의 과거를 들여다보고 21세기 시네필리아가 어떤 형태일 법한지 개요를 그려볼 것이다.[note title=”3″back] 시네필리아의 변형에 대한 최근 연구는 다음 글에서 볼 수 있다. Malte Hagener, Marijke de Valck (eds): Cinephilia: Movies, Love and Memory. Amsterdam: Amsterdam University Press 2005; Jonathan Rosenbaum, Adrian Martin (eds): Movie Mutations: The Changing Face of World Cinema. London: BFI 2003; Scott Balcerzak, Jason Sperb (eds): Cinephilia in the Age of Digital Reproduction: Film, Pleasure and Digital Culture. London, New York: Wallflower 2009.[/note]
1. 시네필리아 1.0 – 시네마테크, 카이에, 누벨바그
‘고전적’ 시네필리아는 사회적, 문화적으로 자리 잡은 하나의 실천이다. 이는 영화에 대한 특정한 태도를 보이며 1950년대 파리에서 처음 번영하였다. 앙투안 드 베크Antoine De Baecque는 시네필리아라는 그의 문화적 역사에서, [시네필리아라는] 실천을 ‘하나의 시선a view, un regard‘으로 본다. 그것은 영화를 보고 영화에 관해 말하는 방식이며, 담론을 펼쳐 영화에 맥락context을 제공하는 어떤 태도다.[note title=”4″back] Antoine de Baecque: La cinéphilie. Invention d’un regard, histoire d’une culture, 1944-1968. Paris: Fayard 2003: 11. [“La cinéphilie, considérée comme une manière de voir les films, d’en parler, puis de diffuser ce discours, est ainsi devenue pour moi une nécessité, la vraie manière de considérer le cinéma dans son contexte.”][/note] 카이에 뒤 시네마Cahiers du Cinéma 편집진들이 모이는 시네마테크 프랑세즈의 상영회에서나, 맥마혼MacMahon과 같은 파리의 다른 영화관에서는, 취향문화가 발전하여, 영화가 하나의 예술 형식이자 경험에 대한 특정한 태도로서 진지하게 받아들여졌다. 시네필리아는 영화 잡지의 지지를 받아, 위치와 장소에 결부되었다. 영화관 자체는 습관에 의해 각 개인이 점유한 좌석이었으며, 카페와 편집 사무실은 만남의 장소이자 토론의 각축장이었다. 이러한 형태들은 상대적으로 경직된 집단 구조를 낳았으며, 그 구조들은 대체로, 이성애주의적이고, 가부장적이며, 위계적이라 할 수 있다. 하루에도 몇 편이고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는 것은 누벨바그 후기 주역들이 다니지 않았던 영화 학교를 대신하는 일이었던 한편, 영화에 관해 글을 쓰는 것은 초반에 영화 만들기를 대체했다. 사실, 대중 안에서 특정한 입장을 세우고 옹호하는 일은 영화를 만드는 다른 수단으로 이해되었다. 실제로 트뤼포, 고다르, 리베트, 로메르, 샤브롤이 비평가에서 영화감독, 시네필에서 시네아스트로 옮겨가는 일은 그리 어렵지 않았다.
고전적 시네필리아의 주요한 측면은 영화에 대한 특유하고 독창적인 관점에 있다. 그 관점은 영화관을 방문하는 개인적 스타일과 밀접하게 관련한다. 사실상 영화를 보는 것의 공간적 측면뿐 아니라 시간적 측면도 영화 경험의 필수적인 부분이 되었다. 이는 그 자체로 장 두셰Jean douchet에 관해 말해준다. 그는 누벨바그 지지자였으며, 카이에 뒤 시네마의 주요 필진이었다. 1970년대에는 영화학교 IDHEC(Institut des hautes études cinématographiques)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기도 했다. 두셰는 영화관에 가는 일을 숭배적이며 제의적인 경험이라고 묘사한다. 그러한 경험 속에서 모든 행위는 의미를 가지며, 우연한 것은 없다.
“나는 우측 계단과 통로를 통해 관객석 안으로 들어가야만 한다. 그리고 스크린 오른편에 앉는데 주로 다리를 펼 수 있는 통로 쪽 좌석을 선호한다. 이는 그저 신체의 편안함이나 시야의 문제가 아니라 나를 위해 구성해 온 광경인 것이다. 오랜 시간 동안 시네마테크에서, 나는 앞줄 중간에 앉아서 내 앞의 누구도 나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했으며, 영화가 상영되는 내내 홀로 그 영화에 완전히 빠져들 수 있게끔 하였다. 심지어 지금까지도, 누군가와 영화관에 함께 가는 것은 상상하기 힘든 일이다. 그렇게 하는 것은 내 감정을 방해한다. 그런데 수년간 많은 영화를 보면서, 나는 조금 뒤쪽으로 물러나 더 오른쪽에 앉게 되었다. 스크린 쪽을 향하는 나의 축을 찾은 것이다. 이와 함께 세심히 주의를 기울여 영화를 관람하는 나의 몸을 조정하고, 세 가지 기본적인 자세를 취한다. 몸을 바닥으로 뻗는 것, 발을 앞 좌석에 걸치는 것, 마지막으로, 내가 좋아하지만 제일 취하기 어려운 자세인, 몸을 접어서 무릎을 앞 좌석 뒤편에 기대는 것.”[note title=”5″back] Jean Douchet: “La fabrique du régard”. In: Vertigo, no 10, 1993: 34. 티모시 바나드(Timothy Barnard)가 번역하고 크리스찬 키슬리(Christian Keathley)가 언급하였다. Christian Keathley: Cinephilia and History, or The Wind in the Trees. Bloomington, IN: Indiana University Press 2006: 6f.[/note]
장 두셰가 선호하는 자세는 전설적 지위를 획득했다. 그렇지 않았다면 어떻게 토마스 엘새서Thomas Elsaesser와 같은 영국인 시네필이 파리로 오기 전에 이미 런던에서 장 두셰의 그런 자세에 관해 들을 수 있었겠는가? 앨새서는 수업에서 이렇게 고백한다. “장 두셰가 매일 밤 파리의 시네마테크인 팔레 드 샤이오Palais de Chaillot의 둘째 줄에서 취했던, 바로 그 치명적 자세에 관한 이야기는, 내가 1967년 파리에서 공부하기 전에도 이미 파다하게 퍼진 소문이었어. 그리고 나는 그 자세를 직접 보았지.”[note title=”6″back]Thomas Elsaesser: “Cinephilia or The Uses of Disentchantment“. In: Marijke de Valck, Malte Hagener (Hrsg.): Cinephilia: Movies, Love, and Memory. Amsterdam: Amsterdam University Press 2005: 27-43, here 29.[/note] 영화가 상영되는 공간 및 시간, 그리고 영화관에 가는 특정한 경험적 측면에 대한 관심을 무척 세부적인 부분까지 고수하는 일과 결부하는 것은 시네필리아의 이러한 형태에서 중심이 된다.
영화를 상영하는 것은 매번 단독 사건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어떤 시간에, 어떤 사본으로, 어떤 극장에서, 어떤 관객석에서, 누구와 함께, 어떠한 상황에서 보았는지와 같은 장소와 시간, 즉 영화 보기의 특정성은 텍스트가 기호학적으로 만들어내는 의미를 초과한다. 영화의 의미는 텍스트의 단서에 의해서 구성될 뿐만 아니라, 전달되고 확산되는 양상, 그리고 영화film와 관중spectator 사이, 그리고 관객audience과 영상projection 사이의 강도와 상호작용이라는 양상에 의해 구성된다. 그리고 이러한 강도와 상호작용은 개인의 특정 성향에 좌우되는 만큼 미적 대상으로서의 영화에 좌우된다. 헤라클레이토스의 말을 바꾸어 말하면, ‘그 누구도 동일한 영화에 발을 두 번 담글 수 없다’.
그런데, 만약 영화 경험이 그토록 단독적이라면, 영화 경험을 교류하게 하는 상호주관성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 시네필리아를 이해하기 위한 열쇠는 주관성과 객관성을 연결하는 역량에 있다. 주관적 실천을 근본적으로 변형하여 상호 주관적 경험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시네필리아는 철저히 자아를 중심에 놓는 한편 공유되는 가치 판단을 찾는 것을 시사한다. 그리고 이는 정체성을 열어 다른 이에게로 향하게 한다. 시네필리아의 편협한 유아론唯我論에서의 자아 긍정은, 타자의 눈 앞에서 증명해야 하는 관념들을 (입말과 글말을 통해) 외부로 끄집어내는 일에 맞닥뜨린다. 1960년대에 프랑스 식 시네필리아는 급진적 개인성과 감식안(또는 자신을 다른 이와 구별시키는 사회적 표식으로서의 취향 문화) 사이의 장에서 발전하였다. 이른바 ‘시네마테크 사태’라고 불리던 사건이 1968년 봄과 여름에 실패했던 혁명의 리허설에 불과하다는 것으로 판가름 났을 때, 앙투안 드 베크는 그해를 [프랑스 식 시네필리아가] 끝이 난 것으로 여겼다. 1968년 2월, 시네마테크의 수장 앙리 랑글루아가 프랑스 문화부 장관 앙드레 말로에 의해 물러났던 사건으로 인해 예술가와 지식인, 시네필의 대중 집회가 일어났고, 이는 랑글루아가 복권할 때까지 계속되었다. 그것은 국가 조직에 대해 승리한 사건이었지만 그로부터 3개월 뒤인 1968년 5월에는 그 승리를 다시 맛볼 수 없었다.
그 이후 1970년대에는, 학문적 영화 연구가 자리 잡았으며, 그것은 리비도적 애착을 뿌리 깊은 불신으로 대체하였다. 그러한 불신은 장-루이 보드리의 장치 이론과 로라 멀비의 남성적 응시에 대한 논문으로부터 아마도 가장 중요한 형태를 얻어 표현되었다.[note title=”7″back] Laura Mulvey: “Visual Pleasure and Narrative Cinema”. In: Screen, vol. 16, no. 3 (autumn 1975): 6-18; Jean-Louis Baudry: “Ideological Effects of the Basic Cinematographic Apparatus”. In: Film Quarterly, vol. 28, no. 2 (1974): 39-47 and Jean-Louis Baudry: “The Apparatus: Metapsychological Approaches to the Impression of Reality in the Cinema”. In: Camera Obscura, no. 1, Fall 1976: 104-128.[/note] 보드리와 멀비의 이론은 시네마를 하나의 장치apparatus와 기제dispositif로 보고 지배적인 우선적 구조들에 대해 논쟁하는 대신, 단독 영화의 중요성에 대해 반대했다. 보드리의 주장에 따르면, 어떤 영화가 보여지든, 시네마의 공간적, 장치적 배열은 권력과 지배력을 가진 강력한 기계 장치의 일부이며, 관중은 상징 이전의 행복과 총체성을 찾아서 이에 스스로를 선뜻 종속시킨다. 한편, 멀비는, 기술적 매체일 뿐만 아니라 스토리텔링 기계로서의 시네마에 내재한 이질적 응시 구조를, 여성에 대한 오래된 사회적 차별과 관련짓는다. 누군가는 이렇게 시네마에 관한 강력하게 부정적이고 디스토피아적인 관념이 좌절된 사랑을 표현한다고 볼 수도 있다. 그리하여 그것은, 1960년대 후반에 많은 이가 희망했던, 급진적인 정치와 사회 변화에 대한 기회를 놓쳐버린 것에 대한, 즉, 1968년의 (인지된) 실패에 대한 반응으로 보일 수도 있다. 어떠한 경우이든 시네필리아는 1990년대 중후반 이전까지 정치적이거나 문화적인 잉여 가치를 약속하는 용어가 아니었다. 그 말은, 고작, (당시 극복해야만 했던) 시네마에 대한 낭만적이고 비정치적 태도에 대한 포기 각서로 쓰였다.
시네필리아는 이론적 실천 혹은 그 반대로, 현실적으로 적용된 이론으로 보일 수도 있다. 포토제니photogénie의 경우에서처럼, 영화 영사의 독특한 경험은 반복될 수 없다는 점에서 중요했다. [포토제니를 주장한 이들에게] 영화는 안정적인 텍스트이거나 재생산 가능한 가공품이 아니라, 특별한 사건이다. 만약 우리가 이러한 생각을 받아들인다면, 영화는 더이상 연예 산업의 상품이나 사회적 소통의 매체가 아니라 돌발적인 만남과 삶의 우연적인 것들을 기록한 일대기의 일부가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시네마는 에너지가 해방되어 개인을 영화와 연결시키는 장소다. 그리하여 시네마는 개인을 그 이상의 담론들과 정서에 결합시키고 엮는다. 이러한 의미에서, 시네필리아는 시네마가 초월-주관적trans-subjective[note title=”8″back] [옮긴이] 직접적 경험이나 즉각적 지식의 영역을 넘어서는 현실과 관련되는 상태.[/note]이며 개인들 사이의 경계에 대해 의문시하고, 이를 해체하고 재배열할 수 있는 매체라고 본다. 또한 시네필리아는 시네마가 드러내고 논의하는 주관화의 모든 과정이 반영성reflexivity을 지닌 표현 수단으로서 받아들여질 때, 그 과정에서의 절차성processuality[note title=”9″back] [옮긴이] 이 글의 맥락상, 절차성은 주관 반영 과정의 조건과 성질을 뜻한다.[/note]과 불안정성, 나아가, 그 모순적 본질과 필연적인 실패를 암시한다.
그리하여 시네필리아는 감정에 관한 역설적 구조처럼 보일 수 있다. 급진적으로 주관적이면서도, 소통과 이해를 갈구하는 특정한 기질을 띠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시네필리아는 시네마[note title=”10″back] [옮긴이] 하게너는 ‘시네마(cinema)’란 말을 매체만이 아니라 장소를 지칭하는 말로도 사용한다. 그에 대응하는 한국어가 없어, 처음에는 각 쓰임에 따라 ‘시네마’, ‘영화관’으로 나누어 번역하였다. 하지만 매체로서의 ‘시네마’와 그것이 상영되는 장소의 관계성에 대한 저자의 논점에 부합하기 위하여, 매체로서든 장소로서든 ‘cinema’를 ‘시네마’로 통일하였다.[/note]에서 어떤 이가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가지고 혼자 있는 동시에 낯선 이들의 무리 안에 자리하는 기이한 관람 환경에 상응한다. 그리고 그 무리는 함께 웃고 울며 감정을 나누면서 일시적으로 공동체가 된다.
2. 시네마와 포스트-시네마토그래픽의 내재성
시네마가 물질적, 텍스트적, 경제적, 문화적 안정성의 많은 부분을 잃었다는 점은 지금 시점에 폭넓게 인정되는 바다. 시네마의 그러한 안정성은 경계가 모호하고 어디에나 있는 편재성으로 대체되었다. 전통적 지형 안에서의 시네마는 문화적 유의미함을 잃었다. 반면에 정서적 거처, 일시적 구조, 서사적 조직체라는 특수한 형태로서의 영화는 무빙이미지 문화에 대한 암묵적 규범이 되었다. 프란체스코 카세티Francesco Casetti가 주장하듯이, 매개체로서의 시네마는 더이상 특정한 장치와 얽혀 있지 않다. 그것은 차라리 어느 경험에 대한 기억과 어떤 문화적 관념에 결부된다. 카세티는 그 어떤 문화적 관념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시네마에 대한 우리 경험의 형태를 규정하는 특성은 (…) 기계적으로 재생산되고, 스크린에 투사되는, 움직이는 이미지와의 관계이다. 그 특성은 감각적 강렬함intensity이며, 대체로 시각적인 것과 긴밀하게 결부된다. 그리고 세계와의 거리가 압축된 것이며, 실재적인 것만큼 구체적인 환상적 경험 세계를 여는 것이기도 하다. 마지막으로 집단적 참여라는 감각이다. 이러한 것들은 다른 환경들이 시네마토그래피적으로 나타나거나 이해되도록 허락하는 [시네마의] 특질들이다. 하지만 이러한 특성이 오직 이론적으로만 알려진 것은 아니다. 우리는 우리의 습관으로부터 그러한 특성들을 끌어내기도 한다. 영화관은 여전히 존재하며, 우리는 계속 시네마에 참여한다. 우리는 그때마다, 동일한 기본적 요소들을 경험하고 동일한 행동 양식에 관여한다. 본질적으로, 우리는 시네마가 우리에게 주는 것은 무엇인지, 시네마가 우리에게 무엇을 요청하는지 모든 단계마다 확증하는 통합된 경험에 의지할 수 있다.”[note title=”11″back] Francesco Casetti: “The Relocation of Cinema”. In: NECSUS – European Journal of Media Studies, no. 2 (autumn 2012); 웹사이트 참고 http://www.necsus-ejms.org/the-relocation-of-cinema(2013.9.5.)[/note]
이러한 관찰 다음으로 따르는 것은, 시네마가 일상적 삶의 구조에 침투한다는 점이다. 그러한 침투는 (실재/복제, 기표/기의, 기호/지시, 조건/징후[를 이야기하는 것과 같이]) 전통적 방식으로 실재와 시네마의 관계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이 무의미할 정도로 발생한다. 한편에 매체에 의해 훼손되지 않은 실재가 있고, 다른 편에 이 세계를 묘사하거나 재현하는 매체가 있다고, 우리는 더이상 주장할 수 없다. 우리는 매체의 내재성이라는 시대를 살아간다. 그 시대에는, 편재하고 매체화mediatised[note title=”12″back] [옮긴이] 매체화(mediatization): ‘미디어화’라는 말로도 쓰인다. 보통 매체 연구에서 쓰이는 이 말은, 매체가 정치적・사회적 소통 및 실천에 영향을 끼치고, 담론의 형태와 틀을 구성하는 것을 가리킨다.[/note]된 표현과 경험을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초월적 지평이 없다.
내재성이란 용어는 질 들뢰즈의 철학을 상기시킨다. 들뢰즈의 철학은 주관성과 객관성, 지각 대상percept과 지각자perceiver, 내부와 외부라는 이진법적 논리로부터 벗어나기를 시도한다. 들뢰즈와 가타리가 말한 바와 같이, 내재성의 평면plane은 우리가 사유를 시작할 수 있는 절대적 토대를 형성하는데, 거기에서 하나의 내재성은 초월성과 대립하기보다 그것 자체에 이르기까지 내재한다. 하나의 내재성은 초월성과 대립하지 않지만 내재성은 그 자체에 내재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매체는 내재성의 평면을 형성한다고 말할 수 있다. 그것 바깥이나 그 너머로 사유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기 때문이다. 우리의 경험(우리의 기억과 주관성, 우리의 지각과 정서, 우리 자신과 세계에 대한 이미지)은 항상 이미 매체화되어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네마 안에 있다. 그 안에서 자아와 세계에 대한 감각은 영화와 관련된 체계, 그리고 일반적으로 매체와 관련된 체계에 이끌린다. 바로 이러한 점 때문에, 들뢰즈는 영화에 관한 자신의 책을 ‘이미지에 관한 자연적 역사’라고 일컬었다. 그러한 역사 속에서, 시네마는 우리 모두가 서식하는 (두 번째) 자연이자 삶이 되었다.
만약 이것이 참이라면, 시청각적 세계에 관한 근본적인 의심이란 있을 수 없다. 시청각적 세계는 너무도 침투성이 강하고 편재하는 상태로 우리 세계 내부에 있는 것이다. 이는 세계의 바깥 위치는 없으며, 매체화된 이미지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장소도 없기 때문이다. 패트리샤 피스터스Patricia Pisters는 들뢰즈의 말을 바꾸어 다음과 같이 말한다. “우리는 지금 메타시네마적 경험 세계에 살아간다. 그 세계는 시청각성이라는 내재적 개념화를 요청한다. 그곳에서 새로운 카메라 의식이 우리의 지각 속으로 진입한다.”[note title=”13″back] Patricia Pisters, The Matrix of Visual Culture: Working with Deleuze in Film Theory. Stanford,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2003: 16.[/note] 이는 우리로 하여금 존재론(세계 내 주체 바깥의 무언가)을 인식론(모든 것은 지각하는 주체 안에 위치한다)과 대치하도록 하는 고전적인 철학적 대립을 넘어서도록 한다. 그 대신, 이러한 위치는 우리 안에 있는 매체화된 이미지의 내재성과 이러한 이미지 안에 있는 우리의 내재성을 수긍한다. 그리하여 지각 행위와 지각하는 주체라는 구분은 허물어진다. 내재성의 평면이 초월성과 내재성 사이의 전통적 대립을 넘어서는 영역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이는 시네필이 언제나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시네마는 독자적으로 떨어진 세계가 아니다. 재현이나 단지 실재의 그림자로서, 삶으로부터 분리된 것이 아니다. 그것은 동일한 실체의 부분이다. 그것은 삶과 영화를 분명하게 구분하기 위해 의미를 만들어내지 않는다. 결국, 매체의 내재적 실재는 시네필리아를 따라잡는다(혹은 시네필리아가 매체의 내재적 실재를 따라잡는다). 적어도 이는 시네마라는 개념이 부활하는 이유가 될 수 있다.
3. 영화를 전용하는 예술 : 절도, 숭배, 혹은 기쁨에 겨운 무시?
전통적으로, 영화는 표현의 진지한 형식으로 인식되기 위해 문학, 회화, 조각, 음악으로부터 예술의 핵심을 차용했다. 하지만 이러한 관계는 급진적으로 재설정되었다(완전히 뒤집어진 것은 아니지만). 지난 20년간의 현대예술은 영화와 시네마를 원천 제재source material로 전용해왔다. 시각 예술가들은 영화가 시각 이미지의 저장소일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루어야 할 세계의 핵심 측면이라는 점을 깨달았다. 이는 시네마의 내재성에 대한 추가적 논의를 제기한다. 설치 미술 작품에서 영화를 복원한 것은, 1980년대 이후의 여러 고전적 예시로부터 발견된다. 그렇다고 그 목록이 완전하다는 말은 아니다. 마티아스 뮐러가 1950년대 할리우드 멜로드라마를 재작업한 것, 더글라스 고든이 알프레드 히치콕, 존 포드, 헨리 킹 등의 고전 영화에 대해 다룬 것, 스티브 맥퀸이 버스터 키튼과 다른 감독들을 오마주한 것, 피에르 위그가 영화의 시간적 측면을 탐구한 것, 모니카 본비치니가 시네마 내부의 권력, 공간, 젠더에 관해 다룬 것. 이러한 설치 작품 중 상당수는 시네필적 실천과 예술 전통 사이의 경계 위를 걷는다. 하지만 이들 모두는 20세기 영화 정전이 (우리의 두 번째 자연이 된) 이미지, 캐릭터, 상황, 서사를 담은 문화적 저장고를 제공한 방식에 대한 이해를 공유한다.
시네필적 실천이 문화적 생산의 주류에 진입한 방식을 예시하기 위해, 나는 하나의 특정 작품에 대해 논하려 한다. 나는 크리스찬 마클레이의 블록버스터 설치 작품 〈시계〉를 상기시키는 것이 특별히 혁신적이지는 않다는 점을 알고 있다. 그 작품은 2010년부터 예술제를 통하여 세계적으로 유명해졌다. 베니스 비엔날레에서 큰 상을 받았으며, 전시하는 곳마다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그 작품은 상찬과 비판을 거의 비슷한 정도로 받았다. 나는 이 작품을 상찬하거나 비판하는 것에는 관심 없다. 가치를 폄하하는 사람이 되거나 열광하는 사람이 되려는 것도 아니다.[note title=”14″back] 다음 예시를 보라. Thom Andersen: “Random Notes on a Projection of The Clock by Christian Marclay“. In: Cinemascope, issue 48; 웹사이트 참고 http://cinema-scope.com/wordpress/web-archive-2/issue-48/random-notes-on-a-projection/(2011.5.12.); Zadie Smith: “Killing Orson Welles at Midnight”. In: The New York Review of Books, 28.4.2011; 웹사이트 참고 http://www.nybooks.com/articles/archives/2011/apr/28/killing-orson-welles-midnight/(2011.5.12.); Bert Rebhandl: “Raum-Zeit-Kontinuum. 24 Stunden sind alle Tage. Christina Marclays Filminstallation ‚The Clock’”. In: Cargo, no. 11, September 2011, 32-35.[/note] 내가 제안하려는 바는 영화적 제재에 대한 어떤 관계를 주시하는 것이다. 그 작품이 영화적 제재를 고려하게 하거나 요구하기 때문이다. 마클레이의 작품은 (주로) 상업 장편 영화의 쇼트들을 몽타주 방식으로 작업한 것이다. 그 작품은 단순하면서도 매우 효과적인, 실시간real time이라는 전제를 기반으로 한다. 실시간은 모두 시네마로 전치된다. 시간을 다루는 영화들, 시계를 보여주거나 디제시스적 시간[note title=”15″back] [옮긴이] ‘디제시스’는 영화와 같은 서사 매체에서 서술된 사건이 일어나는 허구 세계를 뜻한다.[/note]의 다른 표식을 보여주는 영화들의 일부 영상들로 상영이 구성된다. 이러한 단서들은 아주 먼 배경에 있는 시계탑처럼 미묘하거나 숨어있다. 혹은 누군가 시각을 언급할 때 나타나는 손목시계 인서트 숏처럼 개방적이거나 직접적일 수 있다. 디제시스 내부 시간은 항상 디제시스 외부 시간에 정확히 상응한다. 그래서 오후 2시 37분을 보여주는 쇼트는 정확히 오후 2시 37분에 설치 작품에서 보인다. 꽤 논리적으로, 그 설치 작품의 상영시간은 24시간이고, 그리하여 영화는 일하고 잠자고, 먹고 즐기는 일상을 재생산하는 두 번째 자연이 된다. 그 작품은 그 자신을 영구히 갱신하기도 한다. 새로운 날이 항상 옛날을 이어가기 때문이다. 딱 삶과도 같이, ‘시계’는 결코 멈추지 않는다. 그것에는 거부할 수 없는 끌어당김이 있다. 하지만 그것은 그전에 것과 똑같이 존재하는 매일의 따분함을 보여주기도 한다.
〈시계〉는 미술 제도 안의 설치 작품으로서 독점적으로 전시되며 단 한 번도 시네마나 영화제에서 상영되지 않았다. 누군가는 그 작품이 DVD나 온라인 스트리밍 영상으로 판매되었을 것이라 상상할 수 있겠지만. 마클레이는 의식적으로 작품을 특정한 맥락으로 통제하고 제한한다(그 작품은 원칙적으로 끝없이 재생산 가능한 것이다). LA 카운티 미술관이 그 작품의 복제품에 거의 50만 달러에 가까운 돈을 내었다는 사실은 잘 알려지긴 했다. 부풀려진 가격에 대한 분노와 그것에 기인한 독점에 대한 이해가 뒤섞여 나타났다. 화랑과 미술관, 예술제에서의 제한적인 전시 이외에, 오직 6개의 복제판만이 전세계 미술관에 존재한다(그 중에는 뉴욕 현대미술관MoMA, 테이트 모던, 퐁피두 센터와 같은 중대한 기관들이 있다).[note title=”16″back]Daniel Zalewski: ”The Hours. How Christian Marclay created the ultimate digital mosaic“. In: The New Yorker, 12 March 2012. 웹사이트 참고 http://www.newyorker.com/reporting/2012/03/12/120312fa_fact_zalewski (2013.5.9.)[/note] 다소 역설적으로 미술 시장의 논리를 지시하는 (재생산 가능한) 작품에 대한 이런 인위적 제약은 영화적 사건의 유일함을 전경화하는 관중의 기질을 함의하고 요구하는데, 그러한 영화적 사건이 디지털 시대에는 사라진 것처럼 보인다.
아무도 〈시계〉의 DVD를 사거나 다른 방법으로 그것에 접근할 수는 없기 때문에, 작품을 보기 위해서는 특정 장소나 시간에 의존하게 된다. 재미있게도, 대부분의 리뷰들은 그 작품과 마주치는 맥락을 언급한다. 걸어서 이동하는 것, 기다리고 고대하는 것, 입장 시간과 퇴장 시간, 피로와의 싸움, 또 다른 맥락의 요인들. 과거에 이것은 시네필리아의 일부분이었다. 그때 사람들은 어떤 영화나 회고전을 보기 위해 먼 거리를 이동해야 했다. 시네필 세대들은 상영 전의 긴장감과 기대감을 경험했다. 그것은 그 특정한 작품과 마주칠 기회가 좀체 찾아오지 않으리라는 점을 알기 때문이었으며, 이러한 이해는 그 경험을 특유한 것으로 만든다. 그 결과, 시네필은 영화의 모든 소리와 이미지를 흡수하려고 시도하는 태도를 보이게 된다. 그 사건의 유일함을 의식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이다. 〈시계〉는 그와 유사한 사고방식을 지지한다. 그 작품은 구경하기가 힘들고, 그 전체마저도 한 번에 감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분명 그 작품은 모더니즘 미학에서 잘 알려진 두 개의 주요 요소를 사용한다. 그것은 시네필리아에 매우 중요한, 특히 근대적 실천으로서 보일 수도 있는 것들이다. 바로 분열과 몽타주다. 시네필리아는 플롯을 이성적으로 이해하거나 등장인물을 논리적으로 재구성하는 것에는 크게 관심이 없다. 차라리 시네필리아는 세부 요소와 병치들을 사용하여 그 작품을 비집어 열어 그것이 새로운 유의성有意性과 의미를 향할 수 있도록 한다. 마클레이 자신이 선뜻 인정하듯, 그는 전체 영화를 거의 보지 않는다. 오히려 늦은 밤 외국 호텔 방에서 TV 채널을 돌리다가 예기치 않게 발견한 연관성과 대조에 관심을 가진다. 장 엡스타인이 포토제니와 클로즈업에 관해 생각하면서 세부 요소를 강조했던 것처럼[note title=”17″back] 다음의 논문 선집을 보라. Sarah Keller, Jason N. Paul (eds): Jean Epstein: Critical Essays and New Translations. Amsterdam: Amsterdam University Press 2012.[/note], 초현실주의자들이 영화를 보고 나와 새롭고도 예상치 못한 연관성들을 구축하는 것처럼[note title=”18″back]다음의 논문 선집을 보라. Paul Hammond (ed.): The Shadow and Its Shadow: Surrealist Writings on Cinema. London: British Film Institute 1978.[/note], 〈시계〉는 이러한 실천에 동반하는 특유한 시간적 논리를 분명히 보여준다.
좀 더 다른 방식으로, 하지만 (고전적) 시네필리아와 유사하게 관련하여, 〈시계〉는 배우와 영화를 재인식하는 방식으로 작품을 받아들이는 것을 지지한다. 이러한 점에서 그 작품은 바로 만족감이라는 구조에 직접 기반한다. 작품의 관람자에게 지속적으로 [작품 속의] 영화 제목과 배우들을 추측하도록 요청하기 때문이다. (앤디 워홀이나 더글라스 고든의 작품과 달리) 파편들이 언제나 짧은 시간 동안만 보이기에, 그러한 [추측] 게임은 매우 재미난 일이다. 오랜 시간 그 작품을 보고 있다 보면, 여러 다른 질문이 떠오르게 된다. 때때로 누군가는 1분이 채 안되는 시간에 몇십 년 전에 찍은 영화들에서 동일한 배우를 보게 된다. 그리고 때로 누군가는 끝없이 반복되는 날 속에서 노쇠함과 쇠퇴함이 전경화되는 측면들을 보게 된다. 혹은 누군가가 점심을 먹기 위해 그 작품을 떠나는 시점에 또 다른 누군가는 그 작품에서 음식과 관련된 작품을 보게 될 때, 그 누군가의 삶과 그 설치 작품의 관계가 초점화된다. 이런 점에서 마클레이의 작품은 시간성과 주관성의 다른 형태들을 복잡하게 반영한다. 그 시간성과 주관성은 세계 내부에 있으며, 그 세계는 영화와 매체의 내재성을 간직하고 있다. [이렇게 마클레이의 작품이 시간성과 주관성을 반영하는 것은] 시간(일상적 루틴, 플롯 구성의 논리, 인간 삶의 다른 시기들)이 매체로부터 떨어져서 생각될 수 없기 때문이다. 시간은, 당연하게도, 아주 오랫동안 영화 연구의 중요 관심사였다. 앙드레 바쟁에서부터 질 들뢰즈까지. 장 엡스타인에서 메리 앤 도앤까지. 하지만 여기서 시간은 설치 작품의 특정성과 예술 제도의 특이성 뿐 아니라 접근성과 이용 가능성의 새로운 형태와 짝지어진다. 이는 전혀 새로운 질문들을 제기한다.
물론, 째깍이는 시계들, 시간의 거침없는 맹습은 메멘토 모리memento mori[note title=”19″back][옮긴이] 죽음을 기억하게 하는 것.[/note]로 보일 수 있다. 우리의 필멸성에 대한 냉혹한 상기. 〈시계〉에서는 내가 시간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더 이상 분명치 않다. 나는 주체로서 내 삶의 주인인가? 아니면 나에게 시간이 지나가는 것을 보여주고, 내가 시네마에서 보냈던 많은 시간과 날들을 상기시키고, 지금 내가 영화 파편들로 이루어진 설치 작품에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점을 상기시키는 이 작품에 나는 종속되어 있는가? 이런 의미에서, 시계 문자판의 기괴한 반복이 끊임없이 그 자신을 스크린에 드러내 보이면서, 주체-객체 관계는 의문시되며 재배열된다. 시네마에서의 영화와 달리, 그것은 처음과 끝을 더이상 가지지 않는다. 그것은 그저 삶의 흐름으로서 계속된다.
4. 시네필리아와 영화 비평의 정치학
마지막으로, (겉보기에는) 무제한적 접근의 시대에 영화 분석의 정치적 영향과 시네필리아의 미래에 대한 의문에 주목하기 위해서, 한 논쟁적 예시가 도움이 되겠다. 〈237호실 Room 237〉 (로드니 애셔Rodney Ascher, 2012, 미국)은 다큐멘터리 작품으로, 스탠리 큐브릭의 〈샤이닝〉에 대한 5가지 해석을 제시한다.[note title=”20″back] [옮긴이] 이 작품은 〈샤이닝〉을 해석한 비평가들의 해석들을 언급한다. 애셔가 다섯 가지를 해석한 것이 아니다.[/note] 그 해석은 이해할 수 있는 것부터(그 영화는 아메리카 원주민 학살에 대한 알레고리다), 유쾌하고 별난 것까지(가짜 달 착륙을 만든 것에 대해 큐브릭이 아내에게 사과하는 것) 이른다. 그 작품이 혹자가 시네필적 추론이라고 말할 법한, 비평적이고 이론적인 추론의 결과로 만들어진 부조리한 해석을 제시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비평가들은 그 작품이 어떠한 입장도 취하고 있지 않다면서 비난했다. 조나단 로젠바움Jonathan Rosenbaum은 이렇게 말했다. “[〈샤이닝〉을 해석한] 다섯 비평가들과는 달리, 애셔는 자신이 틀릴 위험을 감수하지 않는다. 비평가처럼 행동하거나, 제기된 주장이나 입장에 관한 상대적 비교판단을 형성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불가피하게 비평 그 자체를 훼손하게 된다. 그 비평들 모두가 불량하고 부조리한 행위처럼 보이게끔 한 것이다.”[note title=”21″back]Jonathan Rosenbaum: “Room 237 (and a Few Other Encounters) at the Toronto International Film Festival, 2012”, 웹사이트 참고 http://www.jonathanrosenbaum.net/2018/01/room-237-and-a-few-other-encounters-at-the-toronto-international-film-festival-2012/[/note] 유명 비평 블로거 기리시 샴부Girish Shambu 또한 이 주장을 지지한다. “〈237호실〉의 비평에 대한 묘사에는 적어도 두 가지 문제가 있다. 첫째, 그것은 기괴하고 괴팍하며 미친 것으로 이해되는 행위다. (…) 둘째, 이것이 더 중요한데, 여기서 [이 영화가 묘사하는 대로의] 영화 비평은 대체로 비-정치적이며 밀폐된 행위이다. 그것은 [자기] 내부로 향하면서 자폐적 공간을 만든다. 그것은 인지 퍼즐의 공간, 천재 영화감독에 의해 잘 숨겨진 단서에 기반하여 풀어내야 하는 퍼즐의 공간이다.”[note title=”22″back] Girish Shambu: “On ‘Room 237’, Criticism and Theory”, 웹사이트 참고 http://girishshambu.blogspot.de/2012/10/on-room-237-criticism-and-theory.html[/note] 로젠바움과 샴부 두 사람은 이 영화가 수용 가능한 비평적 행위와 부적절하다고 생각되는 실천을 구별하지 못한다고 비판하는 것이다. 반면에 나는 그 영화가 애초에 비평 그 자체에 대해서는 신경도 쓰지 않았다고 주장하려 한다.

이 영화에 대한 데이비드 보드웰David Bordwell의 평가가 도움이 될 것 같다. 그는 이 영화를 해석과 의미 부여에 대한 그의 이전 고찰에 연관시킨다.[note title=”23″back] David Bordwell: Making Meaning: Inference and Rhetoric in the Interpretation of Cinema.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1989.[/note] 〈237호실〉에 관한 글 서두에서, 보드웰은 이 영화가 시네필리아에 관한 다큐멘터리와 비디오그래픽 영화 에세이 사이에서 서성이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시네필리아에 관한 다큐멘터리는 병리학적 외피 안에 있으며(안젤라 크리스트리엡과 스테판 키작의 작품 〈시네마니아〉를 생각해보라), 비디오그래픽 영화 에세이는 캐서린 그랜트의 비메오 채널 ‘오디오비쥬얼시Audiovisualcy’[note title=”24″back] David Bordwell: “All Play and No Work? Room 237”. In Observations on Film Art, 7 April 2013, 웹사이트 참고 http://www.davidbordwell.net/blog/2013/04/07/all-play-and-no-work-room-237/[/note]에서 발견되는 것과 비슷하다. 보드웰을 전적으로 따르고 싶진 않지만, 그래도 나는 그가 옳다고 믿는다. 그는 해석 행위를, 명백함과 터무니없음 사이에서 어느 쪽으로 저울의 추가 기울어지는지에 관한 문제라고 묘사한다. 그 행위는, 상호주관적으로 전이 가능한 가치 판단에 대한 적절한 범주로서, 현저성과 일관성, 적합성과 작가적 의도에 대하여 이루어진다. 나는 그 영화의 정치적 진공 상태(적어도 첫 관람에서는 그렇게 판단된다)에 대한 주장들을 이해하지만, 그 영화가 궁극적으로 다른 곳으로 향하려 한다고 생각한다.
〈237호실〉은 빽빽하게 채워지고 복잡한 오디오비주얼 몽타주를 통해, 무제한적 접근과 디지털 도구들의 시대에서 우리가 영화를 통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보여준다. 비록 그 영화의 대부분이 그 부조리 안에서 기괴하게 나타난다. 하지만 이 영화는 아주 의식적으로 그 작품을 둘러싼 환경과 맥락을 강조함으로써 시작한다. 거기서 다섯 명의 주인공들은 어디서, 어떻게, 누구와 함께 그 영화를 처음 봤는지 말한다. 그런 다음 영화는 〈샤이닝〉에 관한 다섯 개의 해석을 제시한다. 〈237호실〉은 절대 주인공들의 얼굴을 보여주지 않는다. [그 대신] 사운드트랙 위에 있는 목소리들을 지속적인 몽타주 방식으로 들려준다. 한편 시각적인 것들은 연속되는 (꽤 복잡한) 해설을 제공한다. 이는 시각과 소리 사이의 일반적 위계를 뒤집는 것이다. 이렇게 청각과 시각으로 구분하는 것은, 입말로 제시되는 해석들과 시각적인 자취들을 동시적으로 처리하기를 관객에게 요청한다. 여기서 시각적 자취들은 영화감독에 대하여 주장하고 논평하는 개인적 표현으로 나타난다.
양식적으로, 〈237호실〉은 기술에 대한 바로크적 배열을 제시한다. 프리즈 프레임, 슬로우모션, 디지털 애니메이션화 된 평면도, 재편집과 컴퓨터 애니메이션과 같은 것들. 소비자의 입장에서 지금 누구나 손쉽게 쓸 수 있는 디지털 도구를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237호실〉은 이 영화의 주인공인 비평가들이 매혹되었다고 하는 이미지들을 〈샤이닝〉 이외의 다른 큐브릭 작품들에서 찾는다. 한 비평가가 놀라웠다고 하는 순간에는 톰 크루즈가 불신으로 가득 찬 채 응시하는 모습을(〈아이즈 와이드 셧〉), 어느 비평가가 보이스오버로 어떤 책의 충격에 관해 말하는 순간에는 라이언 오닐이 책을 읽는 모습을(〈배리 린든〉) 보여준다. 잭 니콜슨이 특히나 우스꽝스러운 요구에 얼굴을 찡그리는 모습(〈샤이닝〉)이 나타날 때도 보이스오버가 우리 귀에 들린다. 이는 마치 〈237호실〉이 큐브릭의 우주로부터 무엇이든지 시각화할 수 있다는 신호를 계속해서 보내는 것과 같다. 그것은 반어적인 방식으로 주인공들의 해석에 있는 봉쇄적 본질을 강조하는 것이기도 하다. 여기서 나는 앞서 언급한 이 영화에 대한 비판에서 벗어나고 있다. 그것은 이미지의 자취에 대한 계속되는 논평이, 때로는 광대하면서도 명백하게, 때로는 미묘하면서도 반어적인 방식으로, 목소리를 동반하기 때문이다. 사실상, 〈237호실〉이 제시하는 이미지의 광포함은, 하룬 파로키나 크리스 마커와 같은 수필적 숙고보다는, 마클레이의 끊임없는 시계 몽타주를 연상시킨다. 입장을 취하는 것에 실패했다는 이유로 〈237호실〉을 꾸짖는 대신, 누군가는 이미지들의 빠른 연속이 문제적이라고 볼 수 있다. 끊임없는 시각적 흐름이 보는 이로 하여금 이미지와 소리 사이의 복잡한 관계를 고찰하기 힘들게 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37호실〉이 〈샤이닝〉에 대한 매혹을 매우 개인적인 것인 동시에 상호주관적 이해로 향하는 것으로 틀 짓는 방식은, 다른 시네필적 실천과 부합한다.
결론
시간적으로, 그리고 공간적으로 자리잡은 실천으로서 시네필리아는, 개별적이면서 집단적인 관객성 사이의 간격에 다리를 놓는다. 그러한 시네필리아는 죽지 않았다. 디지털 네트워크의 현재적 조건 아래에서 뚜렷하게 변형되었을 뿐이다. 시네필이 되기 위해서는 파리에 살아야만 했던(적어도 방문해야 했던) 과거와 달리(런던과 뉴욕, 베를린, 베니스, 로마나 다른 도시들은 한참 뒤쳐져 있었다), 오늘날의 시네필은 더욱 폭넓은 범위의 영화들을 볼 수 있다. 그리고 그들은 더욱 폭넓은 범위로 비평과 논평, 전문화된 정보를 받아들인다. 영화에 관한 특정한 주제와 집단을 둘러싸고 모여서 건강하고 적극적인 공동체를 보여주는 웹사이트나 온라인상의 장소들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네필리아의 포스트-시네마토그래픽적 상태를 그저 웹사이트나 포털 사이트, 플랫폼의 문제로 축소하는 것은 다소 순진한 생각이 될 것이다. 그 대신 내가 제안하려는 바는, 디지털이란 조건에 의해 가능해지는 작업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다. 21세기 이미지 문화를 특징화하는 관념과 도구, 역량을 고려해야 하는 것이다. 오늘날 시네필리아의 변형과 참신함을 모조리 도표화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하지만 이러한 예시들은 시네필리아가 발전할 법한, 어떤 가능한 길을 희망적으로 보여준다.
시네필리아는 영화가 과거에 제공했던 이질적 시간성과 정서적 기록을 재구성하고, 그것의 용도를 변경하는 역량으로 특징화된다. 하지만 시네필리아는 디지털의 현재와 미래 속에서 점차 더 열리고 있다. 새로운 디지털 기술과 유통 방식, 전반적으로 달라진 현장의 지형을 가로지르며, 애착하는 대상과 수용하는 방식은 모두 탄력적이고 유연해진다. 우리가 마클레이의 〈시계〉와 같은 거대 설치 작품을 좋아하든지 말든지 간에, 우리가 〈237호실〉의 무표정한 부조리성을 즐기든지 말든지 간에, 시네필리아는 하나의 전용 방식으로 보일 수 있다. 지배적 독해를 묵살하고 복잡한 오디오비주얼 작품으로 향하는 기이한 노선을 제시하는 것이다. 〈237호실〉의 경우가 알려주듯, 이러한 실천은 그 자체로 진보적이거나 계몽적이지는 않다. 다만 적어도 시네필리아는 개별적 맥락과 상황 안에서 영화를 전용하고 사용하는 데 쓰일 수 있는 도구와 관점을 제공한다. 시네필리아의 유의미함은 그러한 잠재성을 제시할 때 발견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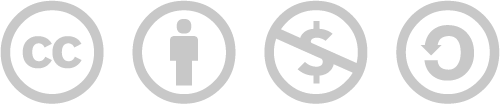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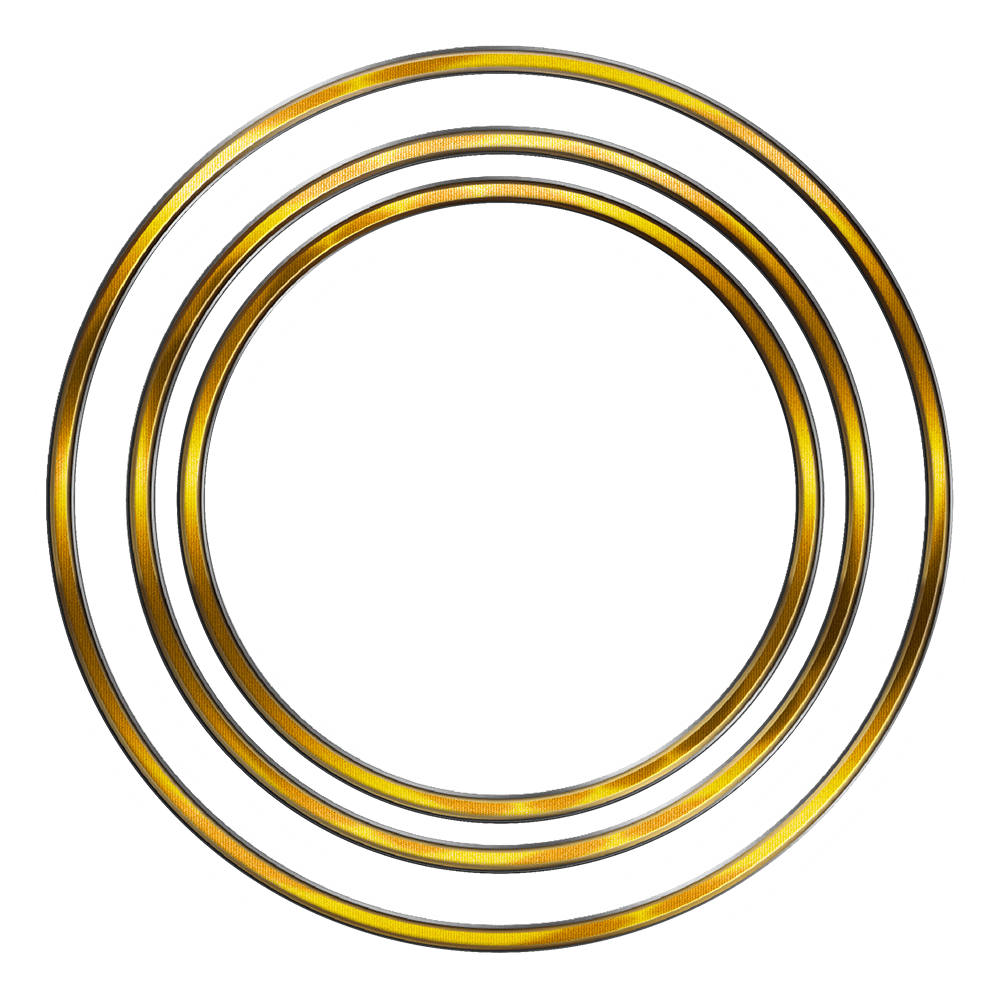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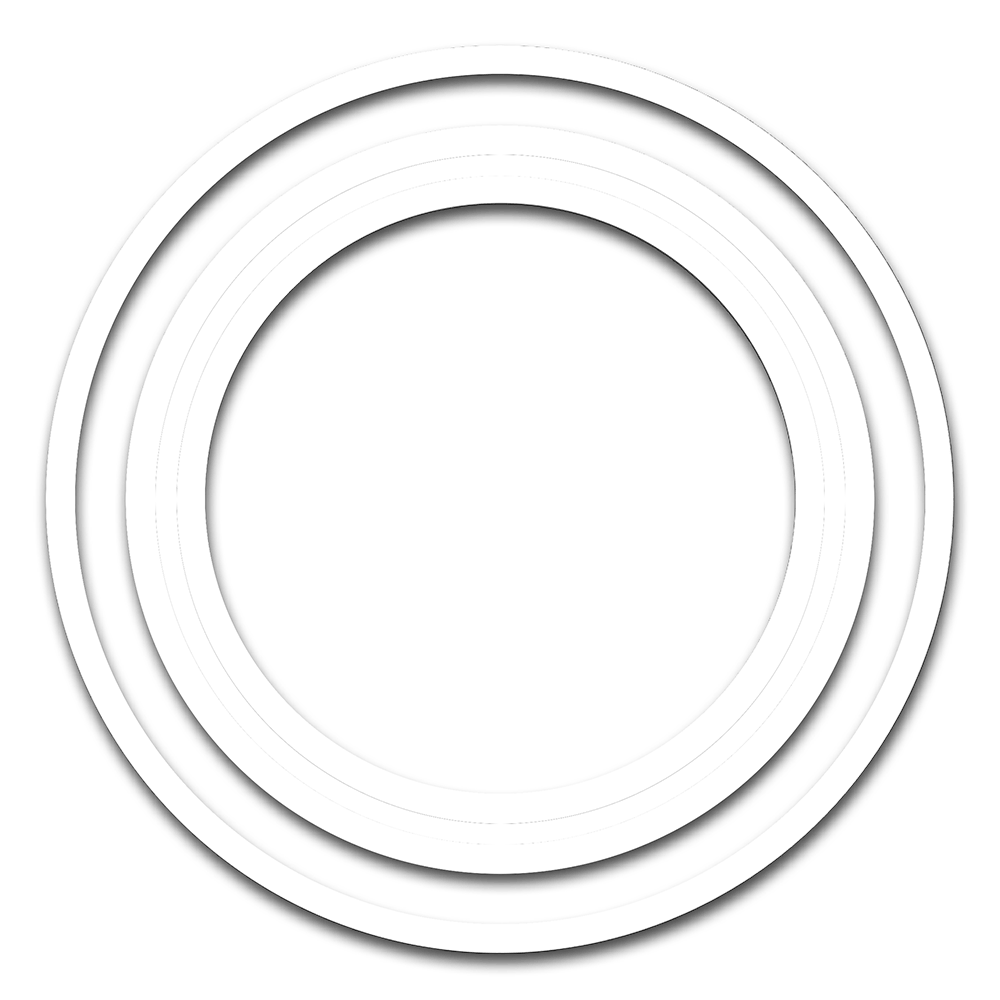
 close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