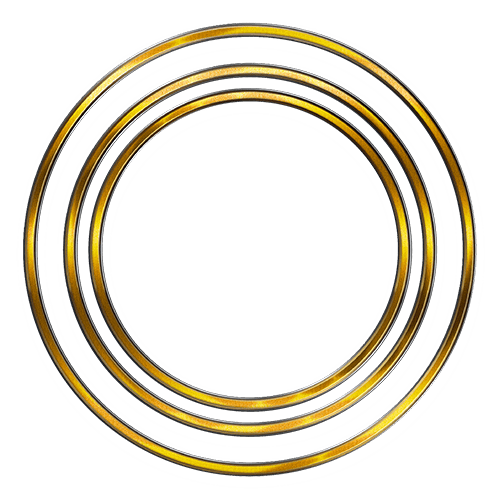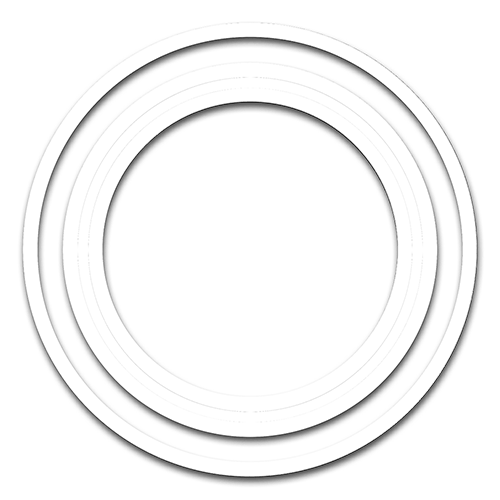비판이론은 1980년대와 90년대 문화전쟁 시기 동안 심하게 두들겨 맞았지만, 2000년대 들어 사태는 더 나빠졌다. 긍정에 대한 요구는 조지 부시 치하에서 거의 전면적이었으며, 그리하여 오늘날 비판의 공간은 심지어 대학과 미술관에도 거의 남아나지 않은 상태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보수논객들에 시달린 나머지, 시민 참여를 위한 비판적 사고의 중요성을 더 이상 강조하지 않는다. 그리고 대부분의 큐레이터들은 기업의 지원에 의존하는 탓에, 비판적 논쟁, 즉 선진 예술이 대중적으로 수용되는 과정에서 한때는 필수적이라고 여겨졌던 논쟁을 더 이상 장려하지 않는다. 실로 비평이, 그것에 아무런 관심도 없는 미술계 안에서 완전히 고리타분한 것이 되어 버렸다는 사실은 그야말로 자명해 보인다. 하지만 그러니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아름다움을 찬양하는 것? 정동affect을 긍정하는 것? ‘감성the sensible의 재분배’를 희망하는 것? ‘일반 지성the general intellect‘을 신뢰하는 것?[note title=”1″back] [옮긴이] 여기서 ‘정동’과 ‘감성의 재분배’, ‘일반 지성’에 대한 언급은 각각 들뢰즈(Gilles Deleuze), 랑시에르(Jacques Rancière), 네그리(Antonio Negri)와 연관된 것으로 보인다.[/note] 비판-이후의 상황은, 우리를 구속해온 (역사적, 이론적, 정치적) 입장들로부터 우리를 풀어주는 듯 싶지만, 대부분 경우 그 상황은 다원주의와 거의 관련이 없는 상대주의를 조장해왔을 뿐이다.[note title=”2″back] 이 중 많은 것들이 새롭지 않다. 10년 전에 이 지면에 게재되었던 좌담회 “The Present Conditions of Art Criticism”(October no. 100, Spring 2002)을 보라. 이 좌담회에서 다루었던 문제는 아직도 근본적이다. 부르주아지는 한때 계급적 자신감에 넘쳐 비평의 시련을 감당하려 한 적이 있었다. 비평은 부르주아지가 이상으로 삼은 공론장에서 의견을 주고받는 데 핵심이라고 여겨졌던 것이다. 그렇지만 이는 이미 오래전의 일이다. 나의 설명은 여기서 큰 그림을 다루면서 시작한다. 따라서 ‘비판(critique)’, ‘비평(criticism)’, ‘비판이론(critical theory)’, ‘비판적 예술(critical art)’ 사이를 오가며 논의할 것이다. 하지만 다음 단락부터는 특히 비판이론과 비판적 예술에 주목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건축 논쟁에서는 “비판-이후”라는 용어가 미술에서와는 다른 수가(數價)를 지닌다. 거기서 이 말이 쓰일 때는 피터 아이젠만(Peter Eisenman) 같은 건축가의 이론적 성찰을 따라 선을 그으려는 것이고, 또 “디자인 지성”의 실용주의가 갱신되었다고 선언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결과는 그다지 달라 보이지 않는다.[/note]
어쩌다가 비판은 이토록 대대적으로 퇴출당하는 지경에 이른 것일까? 지난 몇 년 동안 쏟아진 비난은 비평가의 처신에 관한 것이 대부분이었다. 첫째로는, 판단에 대한 거부가 있었다. 이는 비판적 평가에 도덕적 권리가 있다는 생각을 거부하는 것이다. 그다음에는, 권위에 대한 거부가 있었다. 이는 비평가에게 정치적 특권, 즉 타자를 대신해서 추상적으로 말할 수 있는 특권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거리에 대한 회의가 있었다. 이는 검토하겠다고 하는 상황 자체로부터 비평가가 문화적으로 분리되어 있음을 회의하는 것이다. 80여 년 전에 벤야민은 “비평은 올바른 거리두기의 문제”라고 말했다. “비평은 관점과 전망들이 인정되는 세계, 자신의 입장을 채택하는 것이 아직 가능한 세계에서 안정을 누린다. 하지만 이제는 매사가 인간 사회를 너무나 다급하게 짓누르며 압박한다.”[note title=”3″back] Walter Benjamin, “One-Way Street” (1928), in Selected Writings, Volume 1: 1913~1926, ed. Michael W. Jennings, et al.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1996), 476. 다른 부정적인 연관은, 여기서 다루기는 너무 복잡한, 비평과 원한(ressentiment) 사이의 연관이다.[/note] 그렇다면 오늘날 이 같은 압박은 얼마나 더 다급해진 것일까?
그렇지만 모든 비판이 올바른 거리두기에 의존하는 것은 아니다. 브레히트의 소격은 이런 의미로 올바르지는 않다. 게다가 상징적 전용détournement이나 극단적 모사 기법을 통해 비판이 내재적으로 생겨나는 개입주의적 예술 모델(다다로부터 현재까지에 이르는) 또한 존재한다.[note title=”4″back]해체를 변주한 여러 다른 모델들은 말할 것도 없다. 극단적 모사에 대해서는 나의 “Dada Mime,” October no. 105, Summer 2003를 보라.[/note] (주로 좌익으로부터 유래한) 오래된 다른 비난들도 있는데, 이는 결국 두 가지로 귀착된다. 비판을 추동하는 것은 권력 의지라는 것, 따라서 비판은 그것이 주장하는 진리에 대해 성찰적이지 않다는 것이 그것이다. 빈번하게 두 가지 두려움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고발을 낳곤 한다. 비평가가 자신이 대변하는 집단이나 계층을 대체하는 ‘이데올로기의 후원자’가 되어버리는 것(벤야민이「생산자로서의 작가」(1934)라는 글에서 제시한 유명한 경고)에 대한 염려가 하나라면, 다른 하나는 비판이론을 과학적 진리라고 여기면서 ‘자생적 이데올로기’와 대립시키는 것(알튀세르가 마르크스를 재독해할 때 취한 미심쩍은 입장)에 대한 염려다. 이러한 두려움들이 잘못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것이 비판을 싸잡아서 내다버릴 이유가 될까?
최근의 공격들, 특히 재현비판과 주체비판에 대한 공격은 연좌제를 통해 작동했다. 재현비판은 자체의 진리를 지나치게 확신했다기보다, 진리-가치 자체를 약화시켰으며, 그리하여 정치적 허무주의와 도덕적 무관심을 고취했다는 것이다.[note title=”5″back] 실상 이러한 허무주의는 좌익보다는 우익의 특성이다. 2004년 부시 행정부의 일원(칼 로브 Karl Rove라고 알려진)이 자인했던 내용을 상기해보자. “우리는 이제 제국입니다. 우리가 행동하면 우리의 현실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 현실을 분별 있게 연구하는 가운데 우리는 또 한 번 행동하고 그러면서 다른 새로운 현실을 만들어냅니다. 이 새로운 현실도 연구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태가 정리되는 방식입니다.” Ron Suskind, “Faith, Certainty, and the Presidency of George W. Bush,” New York Times Magazine (October 27, 2004) 참고. 혹은 과학의 “사회적 구축”이라는 개념이 어떻게 지구온난화라는 사실을 논박하기 위해 활용되는지에 대해 생각해보라. Bruno Latour, “Why Has Critique Run Out of Steam? From Matters of Fact to Matters of Concern,” Critical Inquiry 30 (Winter 2004) 참고.[/note] 주체비판 또한 의도치 않은 결과들 때문에 고발당했다. 즉 주체비판은 우리의 정체성이 본성상 구성된 것임을 입증했는데, 이것이 주체-위치들의 소비주의를 사주했다는 것이다(예를 들어 “베네통”으로 재포장된 다문화주의). 많은 이들에게 이 두 산물은 간단히 포스트모더니즘으로 간주되고, 그 결과 전면적인 비난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이는 포스트모더니즘을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의 기계적인 표현으로 환원시키는 희화화다(다시 말해, 신자유주의가 경제에서 규제를 철폐하듯이, 포스트모더니즘은 문화에서 현실을 제거한다는 것이다).[note title=”6″back] 가끔은 이 연결이 직접적이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예를 들면, 뤽 볼탕스키(Luc Boltanski)와 이브 치아펠로(Eve Chiapello)는 분야별로 나뉜 작업현장에 대한 “예술적 비판”이 “새로운 자본주의 정신”의 핵심이 되었다고 고발한다. 하지만 이들이 ‘예술적 비판’이라는 표현으로 의미하는 것은 예술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다음 참조. Boltanski and and Chiapello, The New Spirit of Capitalism, trans. Gregory Elliott (London: Verso, 2004).[/note]
비판에 대해 좀 더 날카로운 질문을 제기한 것은 자신의 전공분야인 과학에 초점을 맞추는 부뤼노 라투르Bruno Latour와 동시대미술을 자신이 애호하는 화제로 다루는 자크 랑시에르다. 라투르는 비평가가 계몽된 지식을 가진 척 허세를 부린다고 본다. 비평가는 이런 지식을 갖고 순진한 다른 이들의 물신화된 믿음을 탈신화화한다─그 믿음이 “스스로는 전혀 아무 작용도 하지 않는 물질에다가 그들이 투사한 소망임을”[note title=”7″back] Latour, “Why Has Critique Run Out of Steam?,” p. 237. Also see Latour, “What Is Iconoclash? Or Is There a World Beyond the Image Wars?,” in Iconoclash: Beyond the Image Wars in Science, Religion, and Art, ed. Latour and Peter Weibel (Cambridge, Mass.: MIT Press, 2002), and Latour, We Have Never Been Modern, trans. Catherine Porter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1993)도 참고.[/note] 입증한다. 여기서 비평가의 치명적인 실수는 자신의 믿음, 즉 탈신화화라는 그의 물신에 대해서는 반反물신주의적 응시를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런 실수로 인해 비평가는 누구보다도 순진한 사람들이 된다. 라투르가 도달한 결론은 이렇다.
이 때문에 여러분은 일말의 모순도 느끼지 않은 채 다음과 같이 반물신주의자인 동시에 실증주의자이며 또한 현실주의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1) 여러분이 믿지 않는 모든 것, 대략 종교, 대중문화, 예술, 정치 같은 것들에 대한 반물신주의자이자, (2) 여러분이 신뢰하는 사회학, 경제학, 음모이론, 유전자학, 진화론, 진화심리학, 기호학 등 자신의 선호에 따라 채택한 학문에 대해서는 뻔뻔스러운 실증주의자이며, (3) 여러분이 실제로 아끼는 것─비평 자체는 물론일 테고, 또한 그림, 새 관찰, 셰익스피어, 비비원숭이, 단백질 등등─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건강하고 확고한 현실주의자입니다.[note title=”8″back] Latour, “Why Has Critique Run Out of Steam?,” 241.[/note]
랑시에르도 비판이 탈신화화에 의존하는 바람에 궁지에 몰렸다고 본다. “통상 비판적 예술은 지배 메커니즘에 대한 인식을 형성해서 관객들을 세상을 변혁하려는 의식적인 행위자로 만들려고 하는 종류의 예술이라고 이야기된다”[note title=”9″back] Jacques Ranciere, Aesthetics and Its Discontents, trans. Steven Cochran (Cambridge: Polity, 2009), 46-47.[/note]고 랑시에르는 쓴다. 그러나 인식 자체가 변혁을 일으키는 것은 아닐 뿐더러, “착취당하는 사람들이 착취의 법칙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는 적은 거의 없다”고 말을 잇는다. 더욱이 비판적 예술은 “관객에게 일상의 물건과 행위 이면에 숨어있는 자본주의의 신호를 발견하라고 하지만”, 그런 요청을 통해 비판적 예술이 확인시켜주는 것은 “사물을 기호로 변형시키는” 자본의 작용뿐이다. 라투르의 비평가나 마찬가지로, 랑시에르의 비판적 예술가들도 악순환에 빠져 있다. 그런데 이 두 메타-비평가에게도 그야말로 똑같은 말을 할 수 있다. 라투르는 마르크스와 프로이트의 근원비판적인urcritical 행보를 반복한다. 마르크스와 프로이트의 주장은 다음과 같았다. “근대인은 자신이 계몽되었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여느 원시인만큼이나 물신적이어서 상품뿐만 아니라 자신이 부적절하게 욕망하는 어떤 물건이라도 물신화한다.” 이런 전복적 주장에 이제 라투르는 자신의 견해를 덧붙인다. “반물신주의 비평가들 또한 자신의 방법이나 분야를 소중하게 여기는 물신주의자다.” 이런 만큼 라투르는 그가 잘라내고자 하는 바로 그 비판의 수사적 혼동 속에 머문다고 하겠다.
랑시에르도 프랑크푸르트학파 식 비판에서 작동하고 있는 의심의 해석학[note title=”10″back] [옮긴이] 폴 리꾀르(Paul Ricoeur, 1913~2005)는 해석학자로서 ‘의심의 해석학’과 ‘신뢰의 해석학’ 간의 대립을 자신이 해명해야 할 중요한 과제로 삼았다. 그는 마르크스와 니체, 프로이트를 의심의 해석학에 속하는 사상가들로 간주하고, 의심의 대가들이라 칭한 바 있다.[/note]에 대한 이 같은 도전에 합류한다. 하지만 이 같은 도전은 비판이론 내에서는 친숙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비판이론이 숨은 의미를 찾아내는 작업으로부터 담론(푸코에게서 볼 수 있듯이), 텍스트의 표면이 가진 의미(바르트에게서 볼 수 있듯이) 등의[note title=”11″back] [옮긴이] 두 사람의 입장은 다른 이들의 수중에서 퇴보했다. 푸코의 경우는 실제의 실천을 크게 고려하지 않는 담론적 일반론으로(예를 들어 랑시에르가 늘어놓는 “체제”), 바르트의 경우는 효과와 정동에 대한 찬양으로(이에 대해서는 이후 좀 더 살펴본다) 주저앉아버린 것이다.[/note] ‘가능 조건the conditions of possibility’[note title=”12″back] 칸트는 ‘비판’을 ‘한계 규정(Die Bestimmung der Grenzen)’이라는 의미로 사용하며, 이는 ‘가능 조건’을 따지는 일로 해석될 수 있다.[/note]을 고찰하는 작업으로 이행했던 만큼, 이러한 도전은 비판이론의 이행에 근본적이기도 했다. 게다가 랑시에르는 비판이, 활성화가 필요한 수동적 관객(이것이 랑시에르 판, 탈신화화가 필요한 순진한 신봉자다)을 투사한다고 비난한다. 하지만 그 역시 한갓 인식을 넘어서는 활성화를 요청할 때, 이러한 수동성을 가정한다.[note title=”13″back]Jacques Ranciere, The Emancipated Spectator, trans. Gregory Elliott (London: Verso, 2009) 참고.[/note] 마지막으로 그의 ‘감성의 재분배’는 만병통치약이다. 하지만 “사물을 기호로 전환하는” 자본주의와 맞붙는 경우, 그것은 거의 소망 어린 생각에 지나지 않는 것, 따라서 예술계의 좌익을 위한 새로운 마약일 뿐이다.[note title=”14″back]‘감성의 분배’를 감각되고 표명될 수 있는 그리고 그렇게 안 될 수도 있는 무엇으로 정의할 경우, 그것은 마르크스가 가장 탁월한 시점에서 이데올로기라고 이해한 것─사고의 특정 내용보다는 사고에 한계를 정하는 구조(즉, 어떻게 어떤 생각들은 사유불가능하게 되는지)─과 거의 다르지 않다.[/note]
이 모든 것을 다 말하고 보니, 비판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느끼는 피로감이 이해가 된다. 피로감은 특히 비판이 자동적으로 가치 있는 일로 여겨지면서 자부심에 넘치는 자세로 굳어질 때 심하다. 비판의 도덕적 올바름도 억압적일 수 있으며 우상파괴적 부정성도 파괴적일 수 있음은 확실하다.[note title=”15″back] 이런 관점에서는, 제프 돌벤(Jeff Dolven)이 이 텍스트를 읽고 이메일로 보낸 답변에서 시사하듯, 비판적 반사작용을 유예(猶豫)시켜 보는 것이 유익할 수 있다. “여기서부터 나의 기본적으로 실용주의적인 충동이 작동하기 시작한다. 왜냐하면 나는 무비판적 판형의 미적 경험들을 이해하고 그와 더불어 사는 것이 어디까지 가능한지를 알고 싶기 때문이다. 내가 나의 파티 아이디, 예를 들면 허식부리기? 쾌활? 거리낌 없는 해석? 흉내내기? 같은 것들을 포기하지 않고서도 말이다… 칸트는 미적 경험에서 개념의 유보와 이데올로기의 비결정성을 본 듯한데, 우리도 이것들을 만끽할 수 있을까? 예술작업에 대한 적절한 미적 경험이 이데올로기에 저항하는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신뢰할 수 있을까? 우리는 예술작품이 그런 경험을 간구(干求)한다는 것을 믿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그래야 할 때(이는 종종 일어난다), 우리는 다시금 우리의 보호막을 세울 수 있으며. 우리가 필요에 따라 활용할 수 있는 비판의 자원을 갖추고, 그 자원들을 바로 그 동일한 대상으로 향하게 할 수 있다고 믿어도 될까? 그리고 혹시라도 그 미적 자유를 한정하고 억제하는 비판은 용인되는가? 혹시라도 비판이 우리에게 추방하라고 압박할지 모르는 대상을 미적으로 벌충할 수 있는 가능성은 허용되는 것일까? 이는, 어떤 것을 언제 할 것인가와 관련된 실천적인 문제다.”[/note] 이런 이미지의 비평가에 대비하며 라투르가 제시하는 비평가 상은 이렇다.
비평가란 폭로하는 사람이 아니라 조립하는 사람이다. 비평가는 순진한 신봉자가 딛고 서 있는 발판을 들추어내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이 함께 모여 참여하는 터전을 만들어주는 사람이다. 비평가는 고야가 그린 술 취한 우상파괴자처럼 반물신주의와 실증주의 사이를 되는 대로 오락가락하는 사람이 아니라, 무언가가 만들어졌다면 그것은 연약하므로 소중하고 조심스레 다룰 필요가 있다고 여기는 사람이다.[note title=”16″back] Latour, “Why Has Critique Run Out of Steam?,” 246.[/note]
누가 이런 공감적 비평가에게 따뜻한 마음을 갖지 않을 수 있을까? 그러나 그런 관대함의 윤리 또한 나름의 문제를 야기한다. 즉 그것은 실상 물신주의라는 오래된 문제인데, 왜냐하면 거기서 다시금 대상이 일종의 유사-주체로 다뤄지기 때문이다.[note title=”17″back] 물신화에 대한 나의 비판은 욕망, 쾌 등등에 대한 의심이 아니다. 나의 비판은 마르크스보다는 블레이크 식의 저항인데, 인간이 만들어낸 것(예를 들어 신이나 인터넷)들이 우리 위에 투사되어 자기 맘대로 활개를 치는 식으로나, 그 위치에서 우리에게 봉사도 하지만 그만큼이나 우리를 예속시키기도 할 것 같은 방식으로 작동하는 모든 것에 대한 저항이다.[/no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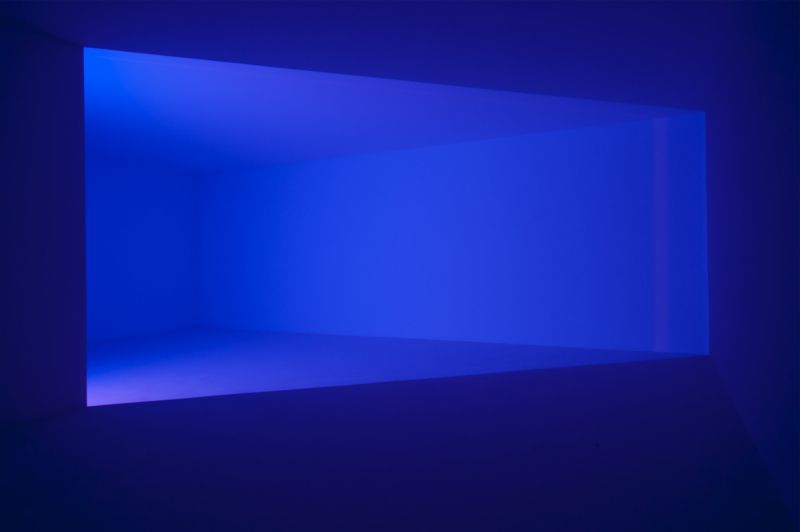
우리는 최근의 미술사에서 이와 똑같은 짓을 하려는 경향을 확인한다. 이미지가 ‘힘’을 갖고 있다거나 행위자이고, 그림이 무언가를 ‘원하거나’ 욕망한다는 등의 말들이 그것이다. 이는 최근의 예술과 건축에서 나타난 유사한 경향, 즉 작업을 주체임subjecthood의 견지에서 제시하는 경향과 상응한다.[note title=”18″back] Isabelle Graw, ed., Art and Subjecthood: The Return of the Human Figure in Semiocapitalism (Berlin: Sternberg Press, 2011) 참고.[/note] 많은 작업자가 능숙한 미니멀리즘 방식으로 현상학적인 경험을 증진하는 데 목표를 둔다. 하지만 이들이 제공하는 것은 거의 정반대인 경우가 많다. 실제와 가상을 뒤섞고 그리고/또는 실제와 감각을 뒤섞는 공간들, 즉 산출된 효과인데도 불구하고 내밀하고 실로 내적인 것처럼 여겨지는 공간들 속에서, ‘경험’은 ‘분위기’로 그리고/또는 ‘정동’으로 돌아온다(미술에서는 제임스 터렐부터 올라프 엘리아슨에 이르는 사례가 있고, 건축에서는 헤어초크와 드 뫼롱Herzog & de Meuron 그리고 필리프 람Philippe Rahm에 이르는 사례가 있다). 따라서 ‘바라보는 자신을 본다’는 현상학적 재귀성은 의도와는 반대 방향에 도달한다. 우리 대신 설치 작업이나 건물이 지각행위를 하는 듯 보이는 것이다. 이 또한 물신화의 한 형태다. 왜냐하면 그것이 생각과 감각을 도맡아서, 이미지와 효과로 가공한 다음, 우리에게 감상과 경탄의 대상으로 되돌려주기 때문이다. 이러니 여기서 요청되는 것은 반물신주의적 비판인 것이다.[note title=”19″back] 미니멀리즘에 쏟아진 비난, 즉 사물성(objecthood)에 대한 관심은 실상 객관성─구조, 공간, 공간 속의 신체 등의 객관성─에 대한 관심이었다. 이 관심이 미니멀리즘에서 나온 작업의 1차 노선을 추동했다. 그러나 이제는 2차 노선이 지배적이 되었다. 이러한 역전에 관해서는 나의 “Painting Unbound,” The Art-Architecture Complex (London: Verso, 2011)을 볼 것.[/note]
이는 좀 더 일반적으로는 ‘냉소적인 이성’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냉소적 이성이란 전부 다 안다고 묵살하면서 우리의 문화생활과 정치생활을 똑같이 맥 빠지게 만드는 이성이다.[note title=”20″back] Peter Sloterdijk, Critique of Cynical Reason, trans. Michael Eldred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1987).[/note] 문제는 진리가 언제나 숨어있다는 것이 아니라(라투르나 랑시에르는 이 점에서 옳았다), 많은 것이 너무 당연해서 왠지 대응을 막아버릴 정도로 지나치게 명백하다는 것이다. “알아요. ‘세금 거부’라는 주문이 부자들에게는 요긴하고 내게는 타격이겠지요. 하지만…” 혹은 “큰 미술관들이 공공문화보다는 금융회사와 더 관련이 깊다는 걸 알지요. 하지만…” 냉소적 이성에서는 인지와 부인(정확히 말하자면 “알아요, 하지만”)이 물신주의적으로 작동하며, 따라서 이 이성도 반물신주의적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물론 이런 비판만으로는 결코 충분하지가 않다. 주어진 것에 반드시 개입해서 어떻게든 방향을 바꾸고 그것을 다른 데로 가져가려고 해야 한다.[note title=”21″back] 이것이야말로 냉소적 이성에 대처하라고 촉구했던 파올로 비르노(Paolo Virno)의 입장이었다. A Grammar of the Multitudes, trans. Isabella Bertoletti, et al. (Los Angeles: Semiotext(e), 2004)를 보라. 주어진 상황─이 경우에는 신자유주의가 규정하는 우리 자신의 상황─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이런 사례로서 더 나은 것을 보려면 Michel Feher, “Self-Appreciation, or the Aspirations of Human Capital,” Public Culture 21, no. 1 (2008)을 볼 것. 최근 미술에서는 좀 더 많은 사례들을 발견할 수 있다.[/note] 하지만 이런 선회를 하려면 먼저 비판부터 해야 한다.
내가 완전히 틀릴 수도 있겠지만 오늘날 꽃 피고 있는 ‘비판적 예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 여기서 어려운 문제는 이 두 단어가 합쳐지(지 않)게 된 경위다. ‘사회적 실천 예술social practice art’에 대한 이야기를 흔히 하지만, 이 규정적 표현이 강조하는 것은 예술이 심지어 일상생활과의 분리를 메우려고 시도할 때(이는 랑시에르가 미적인 것이 언제나 이미 정치적인 것과 서로 결속되어 있다고 선언하는 것과 유사한 마력을 발휘한다)조차도 얼마나 일상의 삶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가 하는 점이다. 사실, 이런 규정적 표현은 두 용어를 함께 묶어 유지하기보다는 특정한 실천을 사회적 효과라는 규준, 아니면 예술적 창의라는 규준으로부터 풀려나게 만드는 경향이 있다. 상호 알리바이가 되는 경향이 있다는 말이다. 한쪽의 압력은 사회학적이라고 무시되고 다른 쪽의 압력은 미학적이라고 무시되는 식이다. 따라서 해결책이라면서 나온 이 입장도 다시금 망가져 버린다.
좀 도식적이지만 이 같은 곤경에 적절할 것으로 여겨지는 대립쌍 하나를 제시하는 것으로 이 글을 끝맺고자 한다. 한편에 그람시와 유사한 행동주의 미술의 입장이 있다. 이 입장은 미학적 자율성이 비판과 자본 사이의 천박한 유착으로 인해 박살 나버린 상태에서 사회적 실천을 위해 활짝 열린 활동의 장場을 바라본다. 다른 한편에는 아도르노와 비슷한 입장, 즉 예술이라는 범주를 고수하는 입장이 있다. 그러나 이 입장은 이제 예술의 자율성이 최소한으로 줄어든 바람에 부정성도 최소한으로만 유지된다는 허망감에 젖어 형식주의의 행보를 밟아나가는 것 말고는 별 도리가 없다고 본다. 어찌 보면 이러한 상보적인 관계는 드보르가 간취했던 다다와 초현실주의의 관계를 생각나게 한다. 드보르는 (서로의 파괴를 담보하는 드보르 식의 변증법으로) 다음과 같이 썼다. “다다이즘은 예술을 실현하지 않음으로써 예술을 없애려 하였고 초현실주의는 예술을 없애지 않음으로써 예술을 실현하고자 했다.”[note title=”22″back] Guy Debord, The Society of the Spectacle (1967), trans. Donald Nicholson-Smith (New York: Zone Books, 1994), 136.[/note] 우리의 현 상황은 훨씬 두려운 방식으로 여전히 1920년대를 떠올리게 하는지도 모른다. 경제적으로는 호경기와 불경기가 공존하는 시대, 정치적으로는 비상사태가 예외가 아니라 평상이 된 시기, 예술적으로는 경제적 위기와 정치적 비상사태에 대응하는 작업(다다에서처럼)이나 이런 혼란을 건설적으로 활용하는 작업(예를 들어 구축주의)도 있지만, 혼란을 피해 질서로의 귀환을 시도하는 작업(1920년대에는 신고전주의 전통의 허접한 형태로 돌아가는 복귀가 있었는데, 이와 비슷한 현재의 현상으로는 모더니즘 회화와 조각의 구식 표현법으로 돌아가는 복귀를 꼽을 수 있을 것이다)도 있는 시대인 것이다.[note title=”23″back] David Geers, “Neo-Modern,” in this issue, and my “Preservation Society,” Artforum (January, 2011) 참고.[/note] 두 시대의 이런 반향에 근거가 있다면, 지금이 비판을 떠나 그다음으로 나아가기에 나쁜 시점임은 확실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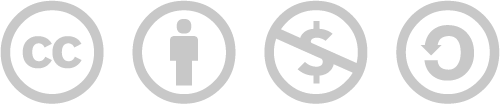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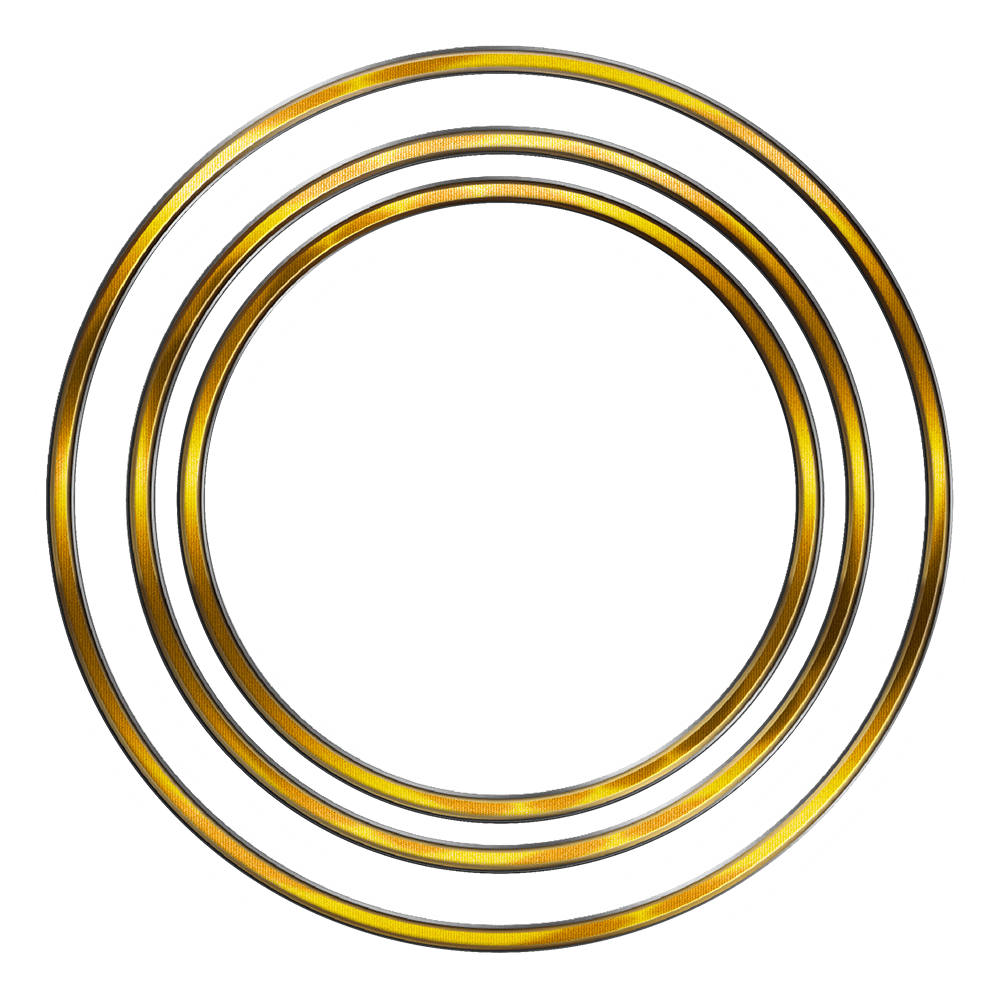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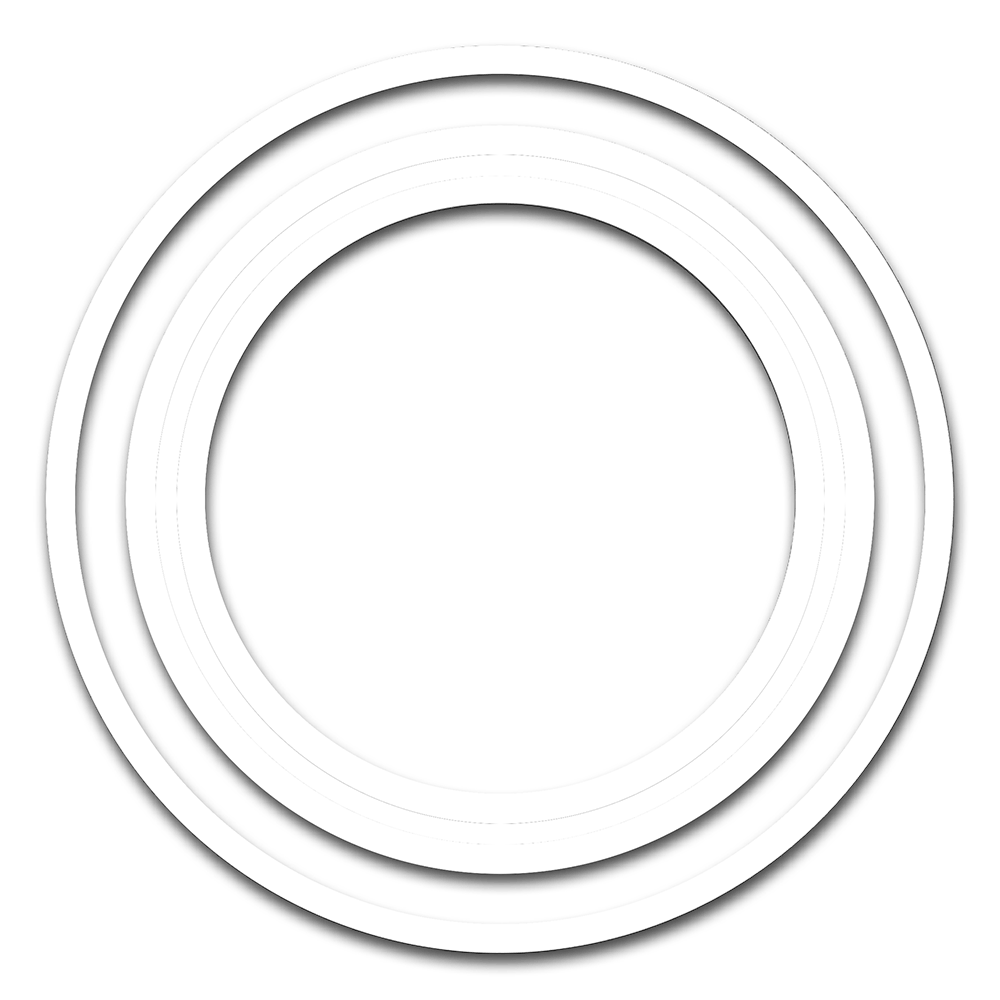
 close
close